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한인 세 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사망자 셋 모두 한국인 '워홀러'였다. '워홀러'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등 외국에 와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사망 사유는 모두 달랐지만,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실태가 이슈화됐다. 영어권 나라 중 캐나다·뉴질랜드·아일랜드 등도 우리나라와 청년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지만, 호주는 비자 발급 절차가 간단해 한국청년들이 특히 많이 오고 있다.나는 지난 2월 초까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멜버른(Melbourne)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소위 '워홀러'라고 불리는 한국인을 만난 적이 없었다. 회사 동료, 프로젝트를 통해 만났던 한국 출신들은 국적이 호주나 뉴질랜드여서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었다. 살던 동네에도 한국인이 거의 없었다. '시티'(City)라고 부르는 시내 중심가에 나갔을 때, 그곳을 동네 주민처럼 다니면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20대 초반 사람들을 보면 '워홀러인가 보다' 하고 추측하는 게 전부였다. 진짜배기 한국인 워홀러가 호주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 기자말호주 워킹홀리데이 세컨드 비자 취득을 위해 워홀러들은 농장 일을 해야 한다. 워홀러들은 딸기 농장에서 종아리 피멍을 감수하며 일했다. 농장 일은 육체노동을 수반하니 몸이 고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워홀러들의 인격 역시 거칠게 다뤄졌다.
"딸기가 물러지면 안 되니까 장갑은 끼지 마세요.""날이 뜨거우면 딸기가 물러지죠. 그럼 작업을 중단합니다. 비가 오면요? 상처 없게 딸기를 딸 수 있으니 종일 작업할 수 있습니다.""아직도 색깔 구분이 안 되세요?""자꾸 이렇게 일하시면 잘려요."딸기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딸기였고, 워커(노동자)는 딸기를 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농장에서 '을'인 워커는 슈퍼바이저(관리자)의 거친 말에 별다른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묵묵히 일해야 했다.
34도 되면 작업 중단... 이유는 '딸기 때문'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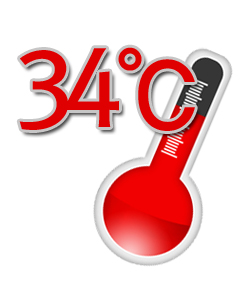
|
| ▲ 뜨거운 날씨에 달궈진 딸기를 손으로 따면 딸기에 상처가 생기기 쉽다. 그래서 섭씨 34도가 넘어가면 워커들은 일을 멈춘다. |
| ⓒ sxc |
관련사진보기 |
우리는 '딸기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 우선순위는 딸기다. 하루는 오전 11시 정도 되자 슈퍼바이저 김민철(가명)씨가 "오늘은 기온이 높습니다, 34℃가 되면 작업 중단합니다"라고 외쳤다.
나는 속으로 '더우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민철씨는 "온도가 높아지면 딸기가 물러집니다! 34℃! 34℃도 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라고 말했다.
기온이 높아져 워커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뜨거운 날씨에 달궈진 딸기를 손으로 따면 딸기에 상처가 생기기 쉽고, 딸기의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였다.
어느새 현장에 온 컨트랙터(하도급 계약자)는 슈퍼바이저에게 "아직도 못 땄나! 빨리 따로고 (워커들) 안 굴리고 뭐했노!"라고 윽박질렀다. 워커들이 다 듣도록 말이다.
낮 1시 반께, 34℃가 되자 김민철씨는 "작업 마칩니다, 하고 있던 로우(줄)만 마치고 나오세요, 나머지는 내일 할게요!"라고 외쳤다. 그날 작업을 마친 후 워커들은 "다음부터는 작업 속도를 높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떨어지는 빗줄기, 워커들은 바빠진다
큰사진보기

|
| ▲ 트롤리를 타고 딸기를 따고 있는 모습. 트롤리 위에 놓은 플라스틱 박스가 트레이다. 검은 부분은 베드, 두 베드 사이를 로우라고 불렀다. |
| ⓒ 이애라 |
관련사진보기 |
비 오는 날은 딸기를 따기 딱 좋은 날씨다. 딸기가 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2014년 새해 첫날, 오전 7시께 작업을 시작했다. 오전부터 검은 구름이 떠 있었다. 정오가 지나자 검은 구름 아래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는 몇 시간 동안 오고 거센 바람도 불었다. 쇠로 된 트롤리(짐수레)가 휘청거렸다. 트롤리에는 지붕이 있었지만, 비바람이 워커들을 피해가진 않았다. 신발은 물론 속옷까지 다 젖은 채 딸기밭을 누볐다.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그만하자거나 언제 끝난다는 말은 없었다. 되레 슈퍼바이저는 미스(miss) 난 딸기를 가져와 "비오니까 잘 안 보이시죠? 봐 드리는 걸로 아세요"라며 트레이에 딸기를 놓고 갔다.
워커들은 날씨 탓에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오후 5시 30분, 약 11시간 만에 일이 끝났다. 온종일 빗속에서 일한 만큼 샤워 경쟁이 더욱 치열했다. 새해 첫날, 우리는 셰어하우스에서 된장국에 제육볶음을 해먹었다. 다들 "따뜻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감기 걸릴 것 같다"라며 열심히 밥을 먹었다. 그래도 다음날 몇몇 워커들은 콜록거렸다.
"빨리빨리! 빨리합시다!"딸기를 따는 일은 손으로 이뤄지다 보니 워커들의 손은 퍼석퍼석했다. 워커들의 손은 무척 거칠었다. 건조한 겨울에도 손이 이렇게까지 될 것 같진 않았다. 여성 워커들 중에는 아주 얇은 비닐 장갑을 사용하는 이도 있었다.
컨트랙터는 슈퍼바이저들에게 "딸기가 상하지 않게 조심해 달라"라고 했고, 슈퍼바이저는 "잘 못하는 사람은 장갑 못 끼게 해"라고 다른 슈퍼바이저에게 소리쳤다. 대화의 종착지는 워커들이다. 워커들은 "장갑 끼면 딸기 상하니까 장갑 빼세요"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아무리 딸기의 상품성을 떨어트리지 않는 것은 워커의 의무라지만, 손까지 상해가면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은 무척 씁쓸했다.
슈퍼바이저들이 습관처럼 반복하는 말이 있다. 그건 바로 "빨리빨리! 빨리합시다!"였다. 딸기농장에 오기 전 청소일을 해봤다는 박희진(가명, 21)씨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빨리빨리'라고 하면 눈치가 보인다, 내가 느린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 그는 "청소일도 몸이 힘들긴 마찬가지지만 농장일은 스트레스까지 더해진다"라며 "차라리 밤을 새더라도 청소일을 택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박희진씨는 농장에서 일한 지 3일 만에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박희진씨와 함께 농장에 왔다가 함께 나가기로 결정한 정희영(가명, 21)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제 막 딸기를 따기 시작하는데 슈퍼바이저가 제가 있던 로우에 바짝 따라오더라고요. 미스 난 딸기를 가져와서는 '미스 내지 말라'라고 말해요. 계속 그러니 스트레스 받지요. 그냥 세컨드 비자 안 받는 걸로 계획을 바꿨어요."워홀러가 농장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세컨드 비자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누군가에게는 비자를 포기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컸던 셈이다.
눈 앞에서 짓밟힌 딸기... "자존심도 밟힌 듯"
여기서 끝이 아니다. 때때로 워커들은 '색맹'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이는 미스에 속하는 딸기의 기준이 슈퍼바이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농장의 딸기는 '풀레드'(적절히 익어 따야 하는 것), '브루징'(손 등에 짓눌린 것), '레인 데미지'(비 맞아서 손상된 것), '탄 것' 등으로 구분되는데 슈퍼바이저마다 판단 기준의 차이가 있었다.
하루는 슈퍼바이저 진지희씨가 실수한 워커들 앞에서 트레이 속 딸기를 집어들며 "아직도 색깔 구분이 안 되세요?"라고 억세게 말했다. 딸기를 잘못 땄다는 이유로 워커들은 색맹이 되는 순간이다.
워커들은 트레이에 딸기가 가득 차면 슈퍼바이저에게 반납하는데, 한 슈퍼바이저는 브루징이 심한 딸기나 덜 익은 딸기들을 바닥에 버리고 발로 밟았다. 워커들은 "내 눈 앞에서 딸기가 밟히면 진짜 기분이 나쁘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 워커는 "농장에서 딸기는 돈이나 다름 없는데, 돈과 자존심이 동시에 짓밟히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털어놨다.
워커들은 슈퍼바이저의 눈치를 보며 일했다. 행여나 녹색 빛이 도는 딸기를 잘못 따면, 슈퍼바이저의 눈을 피해 숨겨서 트레이를 반납했다. 딸기를 딸 때도 속도를 떨어트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움직였다.
슈퍼바이저 김민철씨는 일하는 속도가 비교적 느린 지민씨와 은경씨에게 "위에서 자른다는데 내가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잘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슈퍼바이저 진지희씨도 미스를 낸 이들에게 "자꾸 이렇게 일하시면 잘려요"라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워커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딸기보다 못한 대접받는 워커들셰어하우스에서 농장까지 이동하는 데 쓰이는 15인승 차량. 이 차량의 가격은 약 1만 호주달러(한화 950만 원 가량)라고 했다. 농장 측은 오래된 차를 싸게 사서 워커 수송용으로 썼다.
우리가 농장에서 일하는 동안 두 대의 차가 고장이 났다. 출퇴근용이 아닌 슈퍼바이저 개인 차량까지 동원해 워커들을 태워 날랐지만, 역시나 자리는 모자랐다. 워커들은 좌석에 끼어 앉아 다닐 수밖에 없었다(호주에서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안전벨트 미착용 탑승자는 벌금을 내야 한다).
농장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며 거칠게 말했다. 몇몇 컨트랙터나 슈퍼바이저들은 어린 여성 워커를 '가시나'라고 부르기도 했고, 차에 타라는 말을 "애들 차에 실어"라고 표현했다. 슈퍼바이저가 실수라도 하면 컨트랙터는 워커들이 보는 앞에서 "너 이 XX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만둬! 알았어?"라며 큰소리를 면박을 줬다. 슈퍼바이저도 워커에게는 갑이었지만, 컨트랙터 앞에서는 을이었다. 그 역시 "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우리가 일했던 농장은 인간의 존엄성보다 딸기의 상품 가치가 우선시됐다. 농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거친 말을 들으며 불필요하게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다. 일하는 데 있어 거친 언사는 으레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했던 농장은 그 정도가 과했다. 영어 의사소통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한인 농장을 찾은 워홀러들은 딸기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