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는이야기 다시 읽기(사이다)'는 오마이뉴스 편집기자들이 오마이뉴스에 최근 게재된 '사는이야기' 가운데 한 편을 골라 독자들에게 다시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를 모토로 창간한 오마이뉴스의 특산품인 사는이야기의 매력을 알려드리고, 사는이야기를 잘 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글의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
아들이 죽은 지 10여 년. 팔순 노모는 지금껏 그 일을 두고 남은 자식에게 하소연 한 번 늘어놓은 일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네 큰오빠가 그리 간 뒤로는 무서운 것이 별로 없다." 웬일인지 노모가 아들 이야기를 꺼냈다. "슬픔은 마음 속에 담아두면 절대로 완화시킬 수 없다"며 노모를 걱정하던 딸은 엄마가 '마음 속 슬픔'을 꺼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한 대화 끝에 딸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
오빠의 죽음... 엄마가 울지 않은 이유'는 자식을 잃은 고통을 견뎌온 한 노모의 이야기다. 한경희 시민기자는 이 글에서 "자부심이자 자랑이었던 큰아들"이 신장암으로 고생하다가 "깡마른 몰골로 혹독하게 시련을 겪다 황폐한 모습만을 남긴 채" 떠난 뒤 자신의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준다.
소설처럼 읽히는 이유 '긴장감'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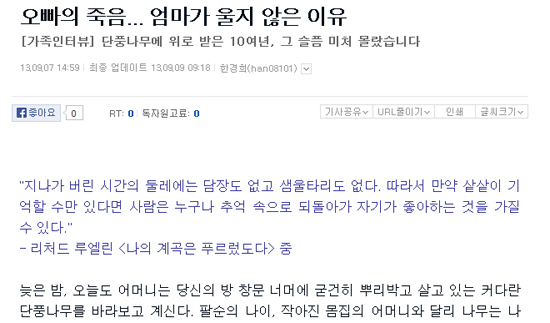
|
| ▲ 지난 9월 7일 게재된 한경희 시민기자의 사는이야기 <오빠의 죽음... 엄마가 울지 않은 이유>. |
| ⓒ 오마이뉴스 |
관련사진보기 |
이 기사는 한 편의 장편(掌篇) 소설 같다. 글은 2013년 8월 어느 날, 필자 부부와 어머니 세 사람이 식탁에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 과거와 현재를 오가다 최근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 어머니의 비밀을 드러내는 짜임새를 취한다.
'오빠가 돌아가신 게 그리 슬프지 않은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담담했던 어머니가 뜻밖에 오빠 이야기를 꺼낸 순간부터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웬일로 오빠에 대해 언급을 하신 걸까'하고 궁금해 하는 글쓴이. 그러나 어머니의 비밀은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오빠 이야기를 할 듯하던 어머니는 정작 운을 떼고 나서는 예전에 한 다른 이야기를 되풀이할 뿐이다.
글쓴이에 따르면 "이 모든 이야기들은 새로운 것들이 전혀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10년 전 오빠의 죽음 이후 사라진 현재의 이야기들 말이다."
"오빠의 죽음 이후 사라진 현재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 비단 글쓴이뿐만이 아니다. 독자 역시 마찬가지다. 무슨 사연인지 궁금한데 어머니는 그저 '현재'는 없고 오로지 '과거' 뿐인 길고 긴 이야기를 늘어놓을 뿐이다. 이 글이 소설처럼 읽히는 이유가 바로 이 대목 때문이다. 비밀이 곧 드러날 듯한데 딴 이야기가 나오니 독자는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 긴장하게 된다. 바로 이 긴장감이 이 글을 흥미진진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좋은 글의 요소 중 하나가 '호기심'이다. 독자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그 궁금증을 계속 끌고간다면 글 읽는 재미는 배가된다. 사는이야기라 하면 대개 하고 싶은 말을 바로 드러내는데 이 글처럼 후반부에 가서야 궁금증이 풀리도록 구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어머니야 그렇다치더라도 글쓴이까지 '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단락이 그렇다.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철없는 젊은이들에 대해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실제 '왕년'에 '한가락' 하지 않은 사람 없고, '예전'이 좋지 않았던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의 기억은 그렇게 과거를 미화시키기도 하고 그것을 빌미로 현재의 세태를 꾸짖기도 한다. 그것은 때로 불합리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2차 대전과 한국전쟁 등 두 번의 전쟁과 일제 치하를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웬일로 오빠에 대해 언급을 하신 걸까'하고 궁금해 했으면 바로 '오빠 이야기'를 물어봐야 하는데 글쓴이는 느닷없이 위의 단락을 넣었다. 더욱이 위의 단락과 내용이 비슷한 단락이 뒤에 또 나온다.
글쓴이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새로운 것들이 전혀 아니"라면서 오빠 이야기를 요구한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이야기들'에 위와 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결국, 어머니의 딴 이야기에 글쓴이도 한몫하는 격이 되어버렸다. 어머니의 딴 이야기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지만 글쓴이의 딴 이야기는 글의 흐름을 방해한다. 아쉬운 대목이다.
윤흥길의 <장마>를 떠올리게 하는 결말
그렇다면 도대체 어머니의 비밀은 무엇이었나. 이제 이 글의 결말을 살펴보자. 길고 긴 이야기 끝에 어머니는 오빠를 잃고 지금까지 어떻게 그리 담담하게 살아올 수 있었는지 털어놓는다. 비밀은 바로 단풍나무에 있었다. 어머니는 "당신의 방 창문 너머에 굳건히 뿌리박고 살고 있는 커다란 단풍나무"를 오빠로 여기고 지금껏 살아온 것이다.
"저건…, 저건 죽은 네 오빠다. 아침에 일어나 나무에 인사하고, 낮에 한참 이야기 나누고, 밤에 자기 전에 또 작별인사를 한단다. 저 나무가 없었으면 난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이 말에 글쓴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읽는 이 역시 마찬가지다. '참척(부모를 놔두고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남)'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다른 생명을 죽은 자식이라 여기며 아픔을 견디는 부모의 이야기에 자연스레 윤흥길의 소설 <장마>가 겹쳐진다. <장마>에 나오는 해당 대목은 이렇다.
점쟁이가 '아들이 올 거라고' 예언한 날. 아들 대신 난데없이 구렁이가 나타난다. 어미는 혼절하고 다들 혼비백산하는데 한집에 같이 살던 사돈이 구렁이에게 다가가 말을 건다."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헌 것일세. 먹지는 못헐망정 눈요구라도 허고 가소. 다아 자네 노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을라고 이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어야 되네. 냄새가 나드라도 너무 섭섭타 생각 말고, 집안일일랑 아모 걱정 말고 머언 걸음 부데 펜안히 가소."<장마>에서 구렁이를 아들이라고 여기듯 이 글에서도 나무를 죽은 아들이라 여긴다.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 이와 같을까. 지푸라기라도 잡듯 죽은 자식을 어떤 형태로든 곁에 두고 싶은 심정 말이다. 겪어보지 않은 이가 어찌 그 고통을 헤아릴 수나 있을까. 글을 통해서나마 어림짐작할 뿐이다.
모처럼 마음 뭉클한 사는이야기 한 편을 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