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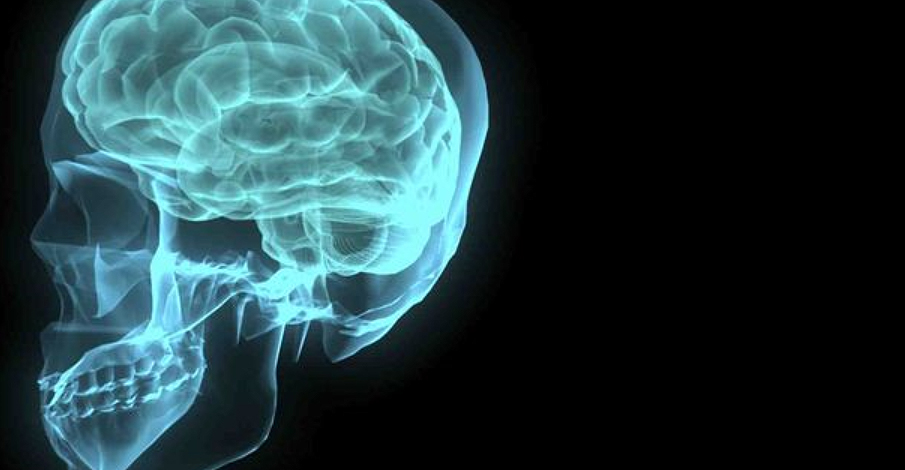
|
| ▲ 해 넘기 전에 친정 부모님 치매 검사를 받게 해야겠다 마음먹었다. |
| ⓒ freeimages.com |
관련사진보기 |
"부모님이 여든 넘으셨다고? 그럼 치매 검사 꼭 받아 봐."지인이 신신당부했다.
"우리 엄마도 정정하셨는데 치매 걸려 식구들이 엄청 고생했잖아? 초기에 약을 먹으면 진행을 완화 시켜서 생활하는 데 거의 불편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매달 병원에 가시잖아?"해 넘기 전에 친정 부모님 치매 검사를 받게 해야겠다 마음먹었다. 친정 언니도 얼마 전, '난청이 치매에 원인이 된다'는 기사를 카톡으로 보내며 부모님 치매를 걱정했다. 언니는 귀가 어두워질수록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일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사회성이 떨어져서 치매가 더 빨리 올 수 있다 설명했다. 틀린 말이 아닌 듯싶었다. 나만 해도 엄마 귀가 점점 어두워지시니 친정에 전화하는 횟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가 게실염으로 3박 4일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퇴원하고 며칠 뒤 염증 수치를 검사하기 위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다행히 결과는 정상이었다. 친정으로 돌아왔더니 아침에 집에서 따라온 여덟 살 막내가 텔레비전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그런 아이 모습을 보자 머리가 더 멍해졌다.
기운을 차리고 언니에게 전화했다. 검사 결과를 알려 주었더니 언니는 수고한 김에 보건소의 치매 검사에 대해서도 알아보란다. 언니는 할 일이 있으면 단숨에 해치워야 하는 성격이다. 이제 그만 막내 데리고 집에 가고 싶었다.
집에 가려면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이나 걸린다. 내 몸 피곤한 거 안 알아준다고 언니를 미워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 입원 때도 언니가 애를 제일 많이 썼다. 입원도 퇴원도 의사 상담도 언니가 도맡아 했기 때문이다. 언니와 통화를 끝내고 보건소로 전화를 걸었다.
"치매 검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아무 때나 오시면 됩니다."예약도 없이 아무 때나? 이 검사 믿을 만한 검사야? 갑자기 의심이 든다. 효과도 없는 검사받으려고 부모님 고생시키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내 의중을 눈치챘는지 담당자는 "병원에서 치매 검사받으려면 정신과 쪽이라 비용이 많이 나와요." 하고 말한다. 전화를 끊었다.
"검사하러 언제 갈까요?""언제 네가 또 오냐? 오늘 가지 뭐."부모님이랑 막내랑 친정에서 출발했다. 택시에서 내려보니 보건소는 건너편이었다. 건널목을 찾아보니, 양쪽 건널목의 중간에 보건소가 있었다. 다리 아픈 엄마를 끌고 건널목까지 갈 엄두가 안 났다. 방법은 무단횡단뿐이다. 걸음이 늦은 엄마와 막내를 데리고 무단횡단하려니 쉽지 않았다.
아버지는 혼자 앞서 가시고 우리 셋이 뒤따라 건넜다. 건너고 보니 보건소 건물은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나왔다. 그런데 이 오르막길이 인도가 따로 없는 차도일 뿐이었다. 미치겠다. 보건소로 들어가는 차와 나오는 차들 때문에 걷기 위험해 보였다. 앞에 걷는 아버지도 뒤 따라 오는 엄마도 위험해 보이긴 마찬가지었다. 차를 피해 길을 오르려니 내 손은 막내의 손목만 잡았을 뿐이었다.
간신히 들어간 보건소 접수대에 치매 검사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 물었다. 3층이란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안 보였다. 청소하는 아주머니께 여쭸다. 엘리베이터 어디있느냐고. 맙소사 없단다. 다리 아픈 엄마를 모시고 2층도 아닌 3층까지 어찌 가나? 난감했다. 진짜 검사고 뭐고 집에 돌아가고 싶어졌다. 어떻게 노인들 많이 찾아오는 보건소에 엘리베이터가 없을까?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왜 왔는지 나에게 물었다.
"치매 검사하려고 왔는데 엄마 다리가 아프셔서 3층까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어요.""그럼 검사실로 전화해서 할머니 다리가 아프니까 선생님에게 내려와 달라고 하세요. 그럼 내려와서 검사해 줘요."접수처에 가서 이야기했다. 접수하는 남자 분 아무 답도 없이 전화기를 들었다. 불만스런 얼굴이었다. '저 양반은 부모도 없이 태어났나?' 검사하는 선생님이 내려왔다. 인사를 하고는 로비 의자에 선생님과 엄마가 앉아서 검사를 시작했다. 나와 아버지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거리는 멀었지만 나는 엄마와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이 며칠이죠?" 엄마가 대답을 못 하셨다. 오늘이 며칠이지? 나도 잘 모르겠다. 뭐 저런 것은 잘 모를 수도 있지. 한참을 생각한 엄마가 입을 뗐다.
"오늘이 며칠이지? 까먹었는데." "어머니, 그러면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이죠?"설마 이건 모르실까? 그런데 엄마는 답을 못 하셨다. 나는 숨을 멈추고 엄마의 답을 기다렸다.
"여름, 여름이지." 간신히 대답하셨다(검사를 했던 시기는 2014년 8월이었다).
"어머니, 우리가 옷을 왜 빨아서입죠?""그거야..."또 대답을 못 하셨다. 난 또 숨을 멈췄다.
"응.... 옷을 안 빨아 입으면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대답이 나오고 난 참았던 숨을 쉬었다. 너무 쉽고 당연한 질문인데 엄마는 빨리 답을 못하고 한참 생각을 하고 답을 했다. 두 분 검사가 끝이 나고 검사를 진행한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두 분이 다 정상이세요. 아버님이 어머님보다 더 좋으세요. 그리고 지금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은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안 좋아지시면 기억력을 또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 년에 한 번씩 검사받길 권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었다. 걱정했던 치매는 넘겼다. 내년에도 잊지 말고 검사를 받아야겠다. 이제 부모님 청력검사를 받을 차례다.
보건소를 나오며 엄마는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