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한눈에
new
'Cha'로 발음되는 곳은 대부분 육지를 통해 차의 무역이 이루어진 곳이며, 실크로드와 지리적으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Te'로 발음되는 곳은 대부분 바다를 통해 차의 무역이
밥 한 그릇에 간장 한 종지만 올린 밥상에 남편이 적어 놓았다는 "왕후(王候)의 밥, 걸인(乞人)의 찬···." 김소운의 수필 '가난한 날의 행복'은 가진 것 없는 살림살이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배고픈 것보다 서러운 것도 없다는데, 슬픔 가운데도 독자를 미소 짓게 한 작가의 재치는 어찌나 여운이 강했던지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읽었는데도 여전히 그 문구를 기억하고 있다.
'먹방'이니 '쿡방'이니 하며 먹을 것이 넘쳐나는 요즘 '왕후의 밥, 걸인의 찬' 운운하면 꼰대 소리 듣기 십상일 것이다. 그러나 김소운의 수필은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게 하고 있어 세대를 넘어 사랑받고 있다. 대만 음식 여행 작가인 장졘팡의 책 <지구 어디쯤, 처음 만난 식탁>은 김소운의 수필과 같은 매력이 있다.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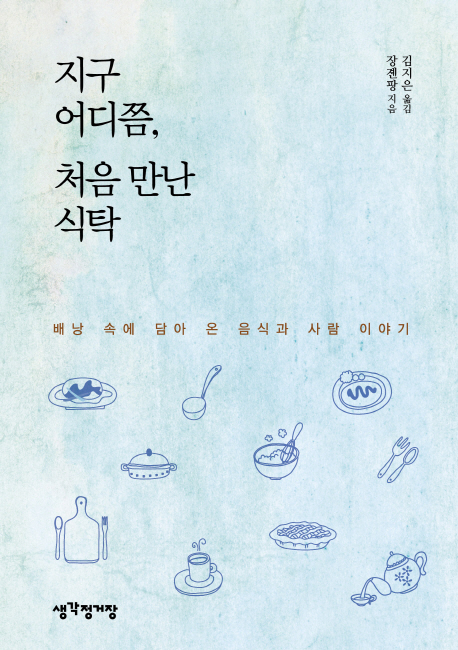
|
| ▲ 지구 어디쯤, 처음 만난 식탁 책표지. 장졘팡 지음, 김지은 옮김. 생각정거장 출판 |
| ⓒ 생각정거장 |
관련사진보기 |
<지구 어디쯤, 처음 만난 식탁>은 맛있는 음식을 선보이는 책이 아니다. 그럼으로 지구촌 구석구석의 먹을거리를 기대하고 책을 펼친다면 아뿔싸!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다 보면 어느새 '미슐렝 쓰리 스타 부럽지 않은 식탁'이 있다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식탁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지만, 식탁이 담아낼 수 없는 풍성한 인생 이야기를 풀어내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식탁 위가 즐거운 이야기로 가득하다면 무엇을 먹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다"라는 말로 저자는 미슐렝 별점과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굳이 음식과 연결시킨다면, '왕후의 밥, 걸인의 찬'이라고 쪽지를 적었던 가난한 작가의 밥상을 닮은 이야기다.
장졘팡은 이 책에서 스페인 내전, 2차 세계대전, 캄보디아 내전, 터키와 쿠르드족간의 충돌, 이라크 전쟁과 같은 상처를 헤집으며 나눈 이야기를 담았다. 풍요와는 거리가 멀고 배고픔과 친숙한 나라에서 종교와 전통, 정치 문제로 갈등 속에 있는 이들을 만나 그들이 건네는 음식에 맛과 색을 입혔다.
천년의 고약한 냄새, 청국장과 닮았다저자가 식탁에서 만난 사람들은 작가보다 더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인생을 털어놓는다. 쿠르드에서 타고난 목청으로 어릴 적부터 노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뎅베제라는 음유시인인 하지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오늘 안경을 쓴 동양 아가씨를 만났지. 그녀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래. 나는 그녀가 영원히 이야기를 잘 만들기를 기원할 거야. 좋은 이야기는 많을 필요 없어. 하나면 족해. 좋은 이야기는 들을수록 더 듣고 싶어지니까. 홍차와 달리 이야기는 우려낼수록 맛이 순해지지." -p.205이야기는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이 책은 저자 장졘팡이 작가라는 위치에서 내려와 듣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도 낯선 사람에게 말이다. 짧은 인연에도 풍성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저자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치 햄릿인 냥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놓고 고민했던 순간을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상대방에게 공감을 표시하는 저자에게서 잘 듣는 것이 잘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며 각국 음식과 문화에서 한국 음식 문화를 떠올린다면 재미있을 것이다. 접시 없이 각자 포크로 긁어 먹는 스페인의 한솥밥 파에야를 보면 제주도의 낭푼밥이 떠오른다. 자투리 재료로 격식 있게 즐기는 프랑스의 파이 키슈는 전주 비빔밥과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1000년의 고약한 냄새라고 비유하는 독일산 치즈는 청국장을 떠올리게 한다.
특별히 치즈에만 남은 고약한 냄새 앞에서 저자가 놀란 마음을 수그리는 모습은 '청국장은 먹어봤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게 한다. 그 모습은 흡사 한국에서 청국장을 처음 대하는 외국인을 닮았다. 냄새가 익숙해지기까지 기다렸다가 심호흡을 하고 한 입 넣었을 텐데,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듯하다.
"치즈를 입안에 넣는 순간, 얼굴 근육이 모조리 뒤틀리고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온몸이 부르르 떨었다. 물 한 병을 벌컥벌컥 들이켜고 싶은 생각만 들었다." -p.65낯선 음식을 입에 넣는다는 것은 낯선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입맛만큼 까다롭고 보수적이고 복고적인 것도 없다. 그러니 저자가 겪은 고통을 이해할 만도 하다. 그런데도 저자는 여행하면서 그런 생경함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재미없는 여행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친해지고 싶다면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음식 나눔은 마음 나눔이자 삶의 고백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차(茶)와 티(Tea)의 차이저자는 차의 세계에서 이라크와 영국은 생각보다 그리 먼 나라가 아니라고 말한다. 두 나라 사람들이 인도나 스리랑카의 홍차를 즐겨 마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라크 차는 찌꺼기가 많고 떪은 맛이 강하지만, 설탕을 살짝 넣으면 되니까 상관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인도네시아에 살 때 많은 설탕을 넣었는지 녹지 않은 설탕이 뜨거운 찻잔 밑바닥에 걸쭉하게 남아 있던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살짝'이 티스푼 하나일지, 큰 숟가락 하나일지 둘일지는 모른다.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니.
그렇더라도 차와 설탕이 있다면 총칼을 들이대던 나라 사람일지라도 함께 즐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 책은 말하고 있다. 이라크인과 영국인이 양탄자 위에서 함께 차를 마시듯 검붉게 우려낸 홍차 한 잔을 놓고 노래하는 쿠르드인. 버터차를 마시는 산의 자손들인 네팔인들. 커피 때문에 차를 한적한 곳으로 밀어낸 한국인들. 모두 함께 즐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특별히 그 역사를 놓고 보면 뿌리가 같은 기호식품이기에 더욱 그렇다.
"'Cha'로 발음되는 곳은 대부분 육지를 통해 차의 무역이 이루어진 곳이며, 실크로드와 지리적으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Te'로 발음되는 곳은 대부분 바다를 통해 차의 무역이 이루어진 곳으로, 해상권을 가진 유럽 국가를 거쳐 차를 수입한 곳이다. 전자가 후자보다 수백 년 먼저 찻잎 무역을 시작했다." -p.188어른들은 세상인심이 흉흉할수록 묻는다. '밥은 먹고 다니느냐'고. 그 말보다 따스한 인사가 있을까? 홍차처럼 따스한, 치즈처럼 눅진한 지구 어디쯤의 이야기들이 따스하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지구 어디쯤, 처음 만난 당신의 식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