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한다. 사람에 따라 생각하기 나름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책이란 그저 늘 함께 해야 하는 것이란 걸 충분히 느끼는 계절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꽂이에서 잡히는 대로 몇 권을 골라봤다. 분위기 잡으려 애쓰며 사진도 찍었다. 함께 보시면 좋겠다.
어차피 책을 읽고 난 느낌은 십인십색일 수밖에 없을 터이니 혹 당신의 독후감과 다르다고 하여 나무라지 마시기 바란다. 여기 소개한 책들을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 속는 셈치고 '따라 읽기'를 한번 해 보시라. 물론 속고 안 속는 것도 당신 몫이다.
[사진으로 읽는 책①] 김경주 여행 산문집 <패스포트>
여행은 길의 기록이다. 내가 아는 한 그렇다. ‘길’은 삶 위에 펼쳐져 있고 삶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첫 시집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를 펴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독자로 거느리며 문단을 놀라게 한 김경주 시인이 얼마 전 여행 산문집을 냈다. '여름 고비에서 겨울 시베리아까지'라는 부제가 붙은 낙엽 빛깔의 여권 무늬의 표지를 가진 책, <패스포트>.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2월까지 고비와 시베리아를 횡단한 여행 기록이 400여 쪽에 걸쳐 그것만으로도 울컥 해지는 사진들과 함께 정리돼 있다. 시인이 붙인 여행의 제목은 '배낭여행자의 인형극'. "여정을 떠나기 전 우리가 배낭에 싸는 짐들은 모두 인형과 같은 것"이고 "여행은 그 인형들을 가지고 길 위에서 펼치는 인형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여행의 출발은 '길'에서 시작된다. 그 길을 걷기도 하고 비행기나 기차를 타기도 한다. 때로는 지프에 40ℓ의 물만 싣고 아홉 시간이 넘도록 비포장길을 달려야 하는 '중독된 길'이기도 하다.
"세상엔 참 많은 종류의 중독이 있다. 그중 나는 길의 중독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분실을 경험해야 한다. 자신의 삶이 스스로에게 철저히 분실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문득 여행을 결심한다. ('길 중독' 중에서)"시인은 "다치는 것이 두렵다면 당신은 지금 여행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충고도 잊지 않는다. 삶에 다치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떠나라 당신!
[사진으로 읽는 책②] 최민식·조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큰사진보기

|
| ▲ 사진작가 최민식의 사진에 조은 시인의 글이 함께 한 책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
| ⓒ 임정훈 |
관련사진보기 |
때로는 한 장의 사진이 열 줄의 글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경우가 있다. 말과 글로 다 못 하는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일 것이다. 사진집을 간간이 사서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인간' 시리즈로 잘 알려진 최민식의 사진을 두고 구시렁거리는 사람들의 생각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아낌없는 찬사이고, 다른 하나는 멸시에 가까운 냉소이다. 나 역시 최민식 선생의 사진들이 모두 좋은(?) 사진인 줄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을 '생각없이' 넘기다가 영혼을 무장해제당한 느낌의 사진 한 장 때문에 울컥하고 말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진집을 들여다보노라면 우리가 사랑한 것들과, 사랑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우물에 비친 그림자처럼 아른아른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사진으로 읽는 책③] <김종삼 전집>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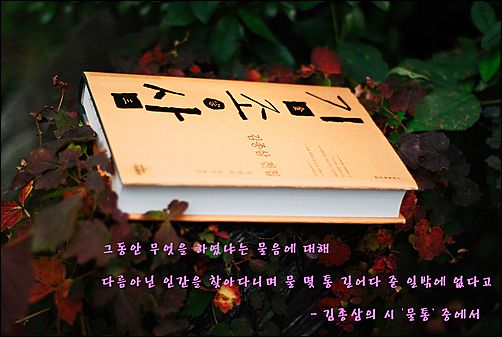
|
| ▲ 김종삼의 시는 매우 느리고 더디게 읽어야 한다. <김종삼전집> |
| ⓒ 임정훈 |
관련사진보기 |
김종삼의 시는 매우 느리고 더디게 읽어야 한다. "물 먹는 소 목덜미에/할머니 손이 얹혀"지듯 그렇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오래오래.
김종삼의 시들은 아무 때나 읽어도 좋다. 하지만 이맘 때 햇살이 좋은 곳에 앉아서 혹은 엎드려 누워서 "밟으면 깨어지는" 낙엽 소리를 들으며 읽으면 더욱 좋다. 시간이 좀 더 허락하거든 "아름다운 레바논 골짜기"에 있다는 '시인학교'에도 들러볼 일이다.
작년 <교수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소평가 돼 재조명해야 할 시인으로 김종삼 시인이 뽑혔다. 지극히 마땅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2005년 나남출판사 판 <김종삼 전집>은 1988년 청하출판사에서 나온 것보다 정밀도가 훨씬 높다.
김종삼 시인도 기행(奇行)으로 많은 일화를 남겼다. 그 가운데 한 토막.
점심을 먹고 난 후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딸은 한참 찾던 끝에 언덕 뒤에서 큰 돌을 가슴에 얹어놓고 잠이 든 아버지를 발견했다. "아버지 왜 그래?"하고 딸이 물었다. 김종삼 시인의 대답은 이랬다. "응,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서!"
[사진으로 읽는 책④]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큰사진보기

|
| ▲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자유롭고 인간적인 '조르바'를 통해 모순과 이중성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을 꼬집는다. <그리스인 조르바> |
| ⓒ 임정훈 |
관련사진보기 |
<희랍인 조르바>. 내가 처음 이 책을 만나던 열일곱 살 무렵 제목은 그랬다. 시간이 흘러 '희랍신화'가 '그리스신화'로 바뀌었듯 '조르바'의 제목도 바뀌었다. 그러나 '조르바'는 변하지도 늙지도 않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물레를 돌리는 데 거추장스럽다고 제 손가락을 도끼로 잘라내는 등 기괴하지만 야생마같은 '조르바'는 자유(인)의 다른 이름이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너무도 자유롭고 인간적인 인물 '조르바'를 통해 모순과 이중성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을 꼬집는다. 그것을 하나씩 발견해가는 재미는 황홀하기까지 하다.
[사진으로 읽는 책⑤] 한강의 산문집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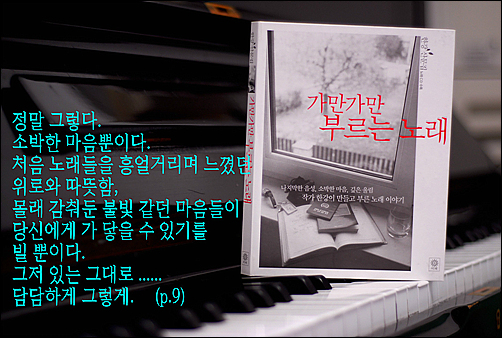
|
| ▲ 무엇보다 이 책의 별미는 책의 뒤표지 안쪽에 들어있는 시디(CD)다.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 |
| ⓒ 임정훈 |
관련사진보기 |
시인이자 소설가인 한강의 산문집. 그런데 그냥 산문집이라고 하면 소개가 부족하다. 노래는 귀로 듣는 것이고 산문은 눈으로 읽는 것이니 말이 좀 안 맞기는 하지만 일단 '노래 산문집'이라고 해 두자.
이 책을 통해 작가 한강의 추억이 담긴 노래와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다. 비슷한 시대(한강은 1970년생)를 살았거나 굳이 동시대를 살지 않았어도 노래의 정서를 공유하는 이들이라면 얼마든지 이 글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책의 별미는 책의 뒤표지 안쪽에 들어있는 '시디(CD)'다. 악기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한강류'라 부를만한 작가 특유의 낮은 음색으로 빚어낸 노래들이 10곡이나 들어 있기 때문이다. 모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노래들인데 두어 번만 들으면 금방 귀와 입에 걸린다.
귀를 기울이면 작가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의 가늘고 잔잔한 숨소리와 떨림까지도 모두 들린다. 누군가 옆에서 속삭여주는 듯하다. 그래서 참 편안하고 좋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혼자서 이 노래들을 들으면 치명적인 외로움이 깊어질 수도 있다는 것!
[사진으로 읽는 책⑥] 허수경 시집 <혼자 가는 먼 집>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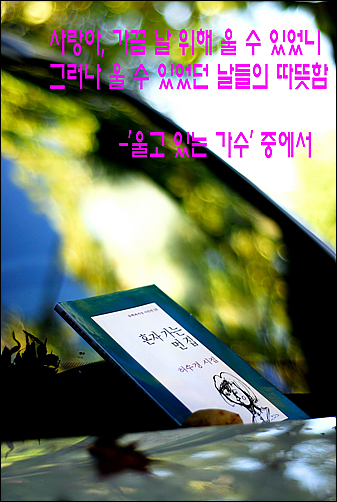
|
| ▲ 젊은 시인이 들려주는 삶의 전언에 놀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혼자 가는 먼 집> |
| ⓒ 임정훈 |
관련사진보기 |
허수경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인 이 책이 나왔을 때(1992년) 문단과 독자들은 함께 놀랐고, 더불어 즐거워했다.
마음의 갈피마다 기타 줄을 튕기며 노래를 채워주는 것 같은 시들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읽어도 읽어도 물리거나 질리지 않는 시들이 이 책에는 가득하다.
당시 아직 서른도 되지 않은 시인이 '모든 악기는 자신의 불우를 다해/노래하는 것"이라며 "모든 노래하는 것들은 불우하고/또 좀 불우해서/불우의 지복을 누릴 터"고 말했을 때, 경악하지 않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불우의 지복"이라니….
이미 삶을 다 살아버리고 깨달은 자의 예언을 들려주는 것 같은 시인의 전언에 사람들은 놀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가수 한영애가 '허스키 보이스'로 불러제끼는 구슬픈 가락이 일품인 앨범 <Behind Time : A Memory Left At An Alley(서울음반, 2003년)>를 듣노라면, 공교롭게도 허수경 시인의 이 책 속 시들이 악상(樂想)처럼 겹쳐서 중얼거려지는 까닭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사진으로 읽는 책⑦] <체 게바라 평전>
큰사진보기

|
| ▲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것은 ‘꿈’으로서의 혁명(가), 꿈꾸는 자로서의 인간이어야 할 것이다. <체 게바라 평전> |
| ⓒ 임정훈 |
관련사진보기 |
"세상 속으로 뜨거운 가을이 오고 있네/나뭇잎들 붉어지며 떨어뜨려야 할 이파리들 떨어뜨리는 걸 보니/자연은 늘 혁명도 잘하는가 싶네!" (안도현 시인의 '서울 사는 친구에게' 중)안도현 시인의 표현대로라면 가을은 혁명의 계절이다. 다가올 다음 세상을 꿈꾸며 준비하는 일을 나뭇잎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은 벌써 시작했다. 혁명이란 현재와는 다른 세상을 꿈꾸는 것이다. 바로 그 꿈을 '희망'이라 부르며 이를 밑천삼아 사람들은 살아간다. 그러므로 꿈을 꾸는 모든 인간은 혁명가다.
체 게바라는 혁명가로서 여전히 '꿈꾸는 자'였다. 최근의 체 게바라 열풍을 두고 혁명(가)이 자본주의의 상품이 돼 버린 세태를 개탄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상품으로서의 혁명(가)이 아니라 '꿈'으로서의 혁명(가), 꿈꾸는 자로서의 인간이어야 할 것이다.
이 가을, '체 게바라 평전'은 꿈이 없는 당신을 꿈꾸는 혁명가로 만들어 줄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