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각각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생태적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온 철학을 간직하고 있다.
양양군은 양양군의 지리적 여건과 특성을 기반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전승되어 온 다양한 양양군만의 음식문화가 있다. 지리적 여건은 북방식물의 남방한계점과 남방식물의 북방한계점에 위치한 덕도 작용하고, 마찬가지로 해양생태도 이와 유사한 조건에서 생산되는 산물들로 하여금 양양의 맛을 구축해왔다.
송이버섯과 온갖 자연산 버섯들이 풍성하게 시장에 넘쳐나는 10월로 접어들면 장터를 기웃거리게 되는데 도루묵이 나왔을까 싶어서다. 본격적인 도루묵 성어기는 얼마간 더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 하지만 이때 어쩌다 시장에서 만나는 도루묵은 가격은 비싸지만 1년을 기다려온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던 맛의 감동을 찾은 기분이랄까. 여하튼 10마리 남짓에 1만원을 훌쩍 넘겨도 선뜻 쟁반에 담긴 그 도루묵을 구입하게 된다.
장날마다 만날 수 없어도 닷새마다 장터 어물전을 기웃거리다 일순간 어물전마다 도루묵이 넘쳐나면 오히려 이때는 또 다른 별미를 찾게 되는 게 사람들의 심리 아닌가 싶다.

▲도루묵성어기를 맞은 도루묵이 강원도 동해안의 항포구와 시장에 넘쳐난다. 안 잡히면 그래서 애가 마르고, 많이 잡히면 또 다시 어부는 속이 탄다. ⓒ 정덕수

▲도루묵 건조성어기를 맞아 가격이 뚝 떨어진 도루묵을 조림이나 찜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말리는 풍경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시기다. ⓒ 정덕수
고기잡이를 업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야속할 일이다. 희소성이 높으면 의당 가격은 높은데 팔 수 있는 상품이 없고, 생산량이 많으면 오히려 찾는 이가 줄어드니 말이다. 허나 이는 어부들만의 처지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를 떠나 생산과 소비란 두 가지의 경제 형태가 존재하는 모든 분야에서 항상 작용되는 법칙이다.
도루묵을 잡는 어부도 동시에 또 다른 상품의 소비자고, 배추나 고추농사를 하는 농부도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일 수밖에 없다. 이번 양양 물치항 도루묵축제장은 그런 입장에서는 각각 다른 처지의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이기도 하다.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있는 물치항 도루묵축제를 찾을 생각이라면 자녀들에게 도루묵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정도는 들려 줄 준비부터 하면 좋겠다.
많은 이들이 도로묵의 유래에 대해 선조의 피난을 곁들여 얘기한다. 그런데 도무지 이 이야기 선조의 의주파천(義州播遷) 또는 의주몽양이나 의주몽진(義州蒙塵)으로 표현되는 사건과 왜 연관 짓는지 모르겠다. 선조25년의 임진왜란 시기 명나라로 망명까지 하고자 했던 부끄러운 역사와 죄 없는 백성과 다름없는 도루묵의 연결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의 서울인 한성에서 개성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가는 과정에서 강원도와 함경도 동해안에서만 잡히는 도루묵을 선조가 맛본다는 얘기는 여건상 불가능에 가깝다. 냉장시설이 된 운송수단도 없던 그 시절, 더구나 선조가 피난길에 나섰던 시기와도 계절상 맞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지 회자되는 얘기는 다음과 같은 억지를 부린다.
"1592년 4월 30일 질풍노도처럼 밀려오는 왜놈들을 피해 선조 임금이 피접길에 올랐다. 그날따라 비가 내려 쌀쌀한 날씨 속에 날이 어둑하게 저물어서야 임진강변에 당도했다. 그러나 급하게 나선 길이라 수라를 올릴 재료를 제대로 챙겨오지 못해 한 어부가 꽁보리밥에 생선을 차려 대접했다. 임금께서는 꽁보리밥에 생선뿐인 식사를 드시고…"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4월 30일이라는 날짜인데 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날짜들은 음력이다. 이를 양력으로 계산하면 1592년 6월 9일이니 추웠다는 다른 표현인 쌀쌀한 날씨도 이치에 어긋난다. 하물며 양력 10월 하순부터 잡히기 시작해 늦어야 해가 바뀐 1월 중순까지가 제철인 도루묵을 6월에 선조의 수라상에 차려냈다는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억지다.
일부 맞는 얘기는 부산포에 왜군이 상륙한 날짜가 음력 4월 13일이고, 그로부터 보름 뒤에 한성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는 역사의 기록과 이 얘기에서 거론되는 4월 30일의 일정 정도다.

▲도루묵축제 설치작품택당 이식 선생께서 간성(지금의 고성군 간성읍)현감으로 있을 때 지은 ‘환목어’란 시가 종이로 만든 도루묵 조형과 함께 도루묵축제장에 설치됐다. ⓒ 정덕수
도루묵을 한자어로는 환목어(還木魚)·환맥어(還麥魚)·도로목어(都路木魚)라고도 하며 목어(木魚) 또는·은어(銀魚)·로 부른다. 이 고기를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도로묵·도루무기·돌목어라 하며 소금에 절여 구어 먹거나 조림과 찌개로도 이용했다.
명태의 새끼인 노가리를 닮은 외관으로 몸길이는 최대 25∼26센티미터 정도 된다. 몸체가 가늘고 길며 측면이 편편한데 알을 밴 암놈은 시기에 따라 배의 형태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평상시는 수심 100∼400m의 해저 모래진흙에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산란기인 초겨울이 되면 물이 얕고 해조류가 무성한 곳으로 모여드는데 이때 어부들이 그물을 내려 잡는다.
일본으로부터 고구마 종자를 사들여 재배를 장려한 조선시대의 정치가며 실학자인 서유구(徐有榘/1764∼1845)가 쓴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서는 "관동의 북쪽 바다에서 잡히는데 비늘이 없는 작은 물고기이다. 길이는 세 치(대략 10cm)가 안 된다. 복부는 불룩하면서 둥글지만 꼬리 근처는 깎여 있다. 입은 크고, 꼬리는 좁고, 등골은 조금 검다. 배와 옆구리는 운모가루를 발라놓은 듯 빛나며 하얘서 토박이들은 '은어銀魚'라고 부른다. 매년 9~10월에 그물을 쳐서 잡는데, 남쪽으로 가서 팔면 이익을 많이 얻는다."고 하였다.
이를 미뤄 서유구 선생께서 도루묵을 머리부터 꼬리까지가 아닌 몸통만 전체 길이로 본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복부는 볼록하면서 둥글지만'이라 한 대목도 암도루묵만을 본 게 아닌가 생각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남쪽으로 가서 팔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양양도호부(지금의 양양군)나 강릉대도호부(지금의 강릉시) 정도로 운송해 팔았으리라 본다.
도루묵으로 불리며 還目魚(환목어)로 불린 흔적은 광평대군 이여의 후손으로 사간원대사간을 지낸 직후 공조참판이 되었던 정조시대의 인물 이의봉(李義鳳)이 편찬한 고금석림(古今釋林)에서 찾을 수 있다. 이의봉은 고금석림 외에도 '산천지(山川志)'와·'나은예어(懶隱囈語)'를 편찬할 정도로 학문적 깊이가 남다른 인물이다.
고금석림에 따르면 '고려의 왕이 동천(東遷)하였을 때 목어를 드신 뒤 맛이 있다 하여 은어로 고쳐 부르라고 하였다. 환도 후 그 맛이 그리워 다시 먹었을 때 맛이 없어 다시 목어로 바꾸라 하여, 도로목[還木]이 되었다'고 밝혀놓은 걸로 민족문화대백과 등에 기록되어 있다.
도로란 말, 즉 본디의 위치로란 말이 도루로 바뀌었고, 현대에 임금이 백성을 버리고 피난을 떠난 것도 부족해 다른 나라로 망명까지 시도하였기에 그를 욕보이고자 억지를 부린 건 아닌가 싶다.
심지어 한국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이 발생하자 가장 먼저 대전으로 줄행랑을 놓은 상태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기만방송을 한다.
"서울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시오. 적은 패주(敗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 국군은 총반격으로 적은 퇴각 중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국군은 적을 압록강까지 추격하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승만이 목어를 먹으며 은어라고 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선조나 이승만 모두 국민을 버리거나 기만한 건 똑 같으며 이와 같은 어이없는 역사가 반복됨도 슬픈 일이다.
택당 이식 선생이 간성현감으로 좌천되어 지금의 고성군 간성읍에 와 있던 시기(1632~1633)에 지은 시로 알려진 환목어(환목어)에서도 임금이 난을 피해와 있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마침 이식 선생의 환목어가 이번 양양 물치 도루묵축제에 전시되어 있다.
還目魚(환목어)
有魚名曰目(유어명왈목) 목어라 부르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海族題品卑(해족제품비) 해산물 가운데서 품질이 낮은 거라.
膏腴不自潤(고유부자윤) 번지르르 기름진 고기도 아닌데다.
形質本非奇(형질본비기) 그 모양새도 볼 만한 게 없었다네.
終然風味淡(종연풍미담) 그래도 씹어보면 그 맛이 담박하여
亦足佐冬釃(역족좌동시) 겨울철 술안주론 그런대로 괜찮았지.
國君昔播越(국군석파월) 전에 임금님이 난리 피해 오시어서
艱荒此海郵(간황차해수) 이 해변에서 고초를 겪으실 때
目也適登盤(목야적등반) 목어가 마침 수라상에 올라와서
頓頓療晩飢(돈돈료만기)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해 드렸지.
勅賜銀魚號(칙사은어호) 그러자 은어라 이름을 하사하고
永充壤奠儀(영춘양전의) 길이 특산물로 바치게 하셨다네.
金輿旣旋反(금여기선반) 난리 끝나 임금님이 서울로 돌아온 뒤
玉饌競珍脂(옥찬경진지) 수라상에 진수성찬 서로들 뽐낼 적에
嗟汝厠其間(차여측기간) 불쌍한 이 고기도 그 사이에 끼었는데
詎敢當一匙(거간당일시) 맛보시는 은총을 한 번도 못 받았네.
削號還爲目(삭호환위목) 이름이 삭탈되어 도로 목어로 떨어져서
斯須忽如遺(사수홀여유) 순식간에 버린 물건 푸대접을 당했다네.
賢愚不在己(현우부재기) 잘나고 못난 것이 자기와는 상관없고
貴賤各乘時(귀천각승시) 귀하고 천한 것은 때에 따라 달라지지.
名稱是外飾(명칭시외식) 이름은 그저 겉치레에 불과한 것
委棄非汝疵(위기비여자) 버림을 받은 것이 그대 탓이 아니라네.
洋洋碧海底(양양벽해저) 넓고 넓은 저 푸른 바다 깊은 곳에
自適乃其宜(자적내기의) 유유자적하는 것이 그대 모습 아니겠나.

▲축제장의 사람들예전처럼 쪼그려 앉아 번개탄 한 장으로 구어 먹던 모습이 아니라, 편하게 앉아 제법 넓은 구이용 화로에 친환경 야자 숯으로 조개와 도루묵을 구어 먹는 축제장을 방문한 사람들은 “예전보다 편하다”고 말했다. ⓒ 정덕수
이쯤 되면 도루묵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학습했다고는 못해도 적어도 부모도 자식들 못지않게 작은 거 하나 소홀함 없이 챙겨본다고는 인정받지 않을까. 더불어 고려와 조선, 그리고 해방 이후 남한만의 반쪽 정부를 만들어 일부에서 건국의 아버지라 주장하는 이승만까지, 국민보다 자신의 안위부터 챙긴 모자란 역사까지 도루묵이란 생선 하나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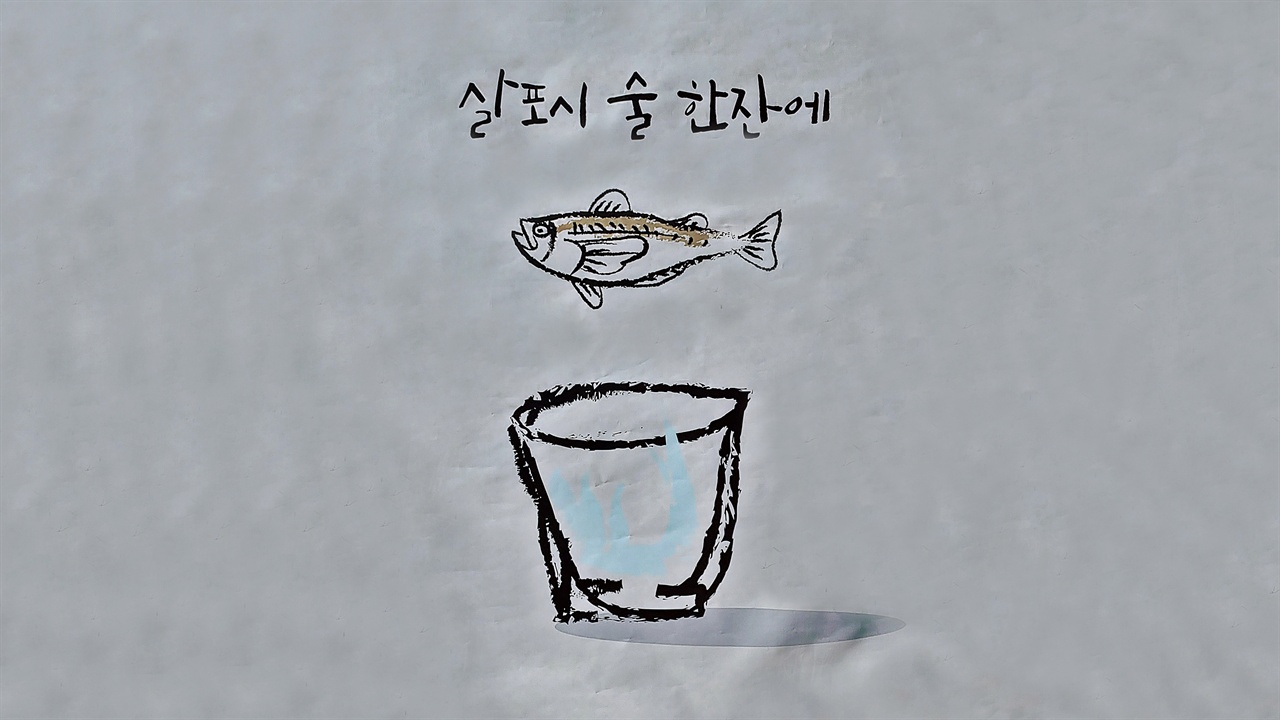
▲도루묵축제물치항 도루묵축제장에 이와 같은 내용의 그림이 걸렸다. 운전하는 이들에겐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이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 정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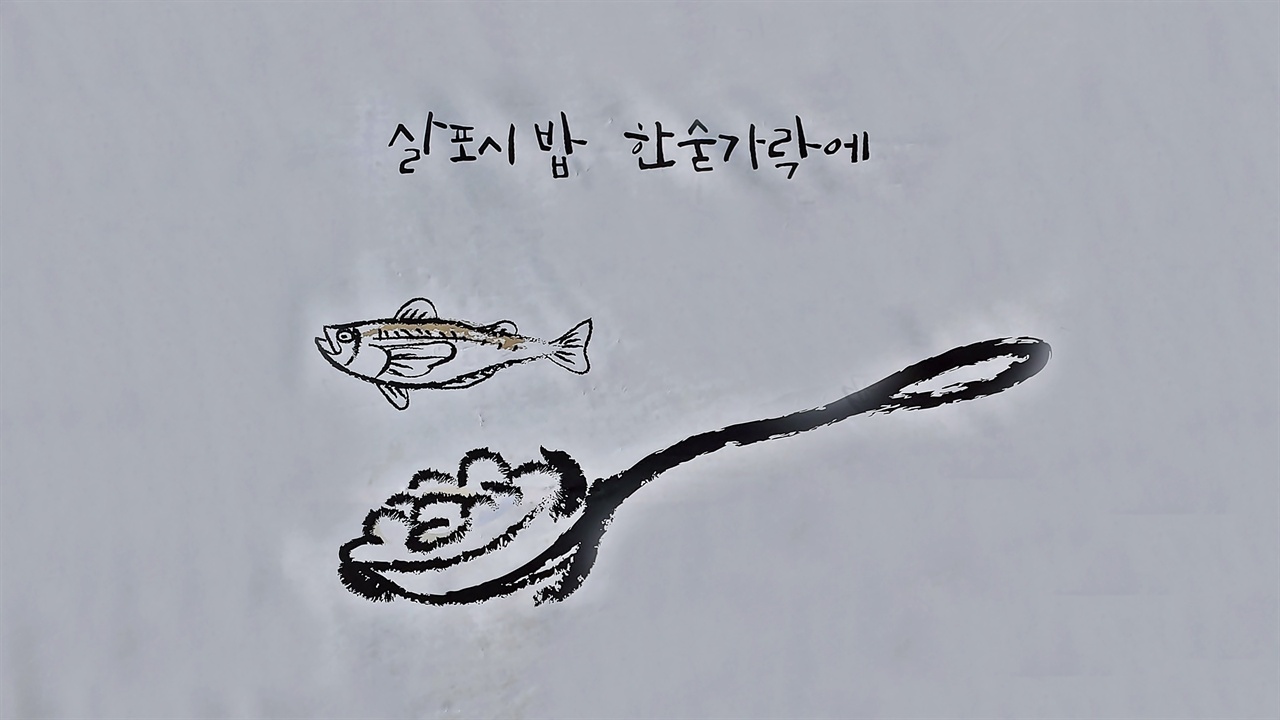
▲도루묵축제물치항 도루묵축제장의 또 다른 이미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잘 익은 살 점 하나 자식의 밥숟가락에 얹어주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진다. ⓒ 정덕수
아버님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았다고는 못 하겠다. 그렇다고 자식을 내팽개치고 자신만 살고자 하시진 않으셨으니 국민을 버리고 저 혼자 살겠다고 줄행랑을 놓은 저들보다 위대하지 않다 할 것이며, 어찌 고맙지 않겠는가.
쌀이 있으면 반찬이 떨어지고, 반찬이 있으면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던 가난한 시절 아버지께서는 마을에 함지 가득 생선을 이고 팔러온 아주머니를 통해 큰맘 먹고 남은 도루묵이나 임연수어를 떨이로 구입하셨다.
그렇게 구입한 임연수어(세치)는 배를 갈라 펼친 뒤 소금을 솔솔 뿌려 켜켜로 쌓아 저장하고, 도루묵은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 지느러미를 가위로 잘라낸 뒤 소금을 쳐 항아리에 담아두고 겨우내 반찬으로 구워 먹었다.
가난한 시절 다른 방도 없이 먹던 값싼 생선들이 귀한 대접을 받는 걸 보니 세상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일이다. 노릇하게 구운 임연수어 한 젓가락, 도루묵 살 한 점이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모습만으로 서글펐을 아버님이 이 계절 그립지 않다면 그게 불효 아닐까.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정덕수의 블로그 ‘한사의 문화마을’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