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에서 사는 곤충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방개. 물속에서 죽은 동물의 시체를 뜯어 먹고 살아 '물속의 청소부'라는 별명이 붙은 이 방개는 우리들이 흔히 물방개라고 부르는 곤충이다.
모양이 딱정벌레와 비슷한 방개는 원래 육지에 살던 딱정벌레 무리 곤충이었는데, 물속으로 들어가 적응하게 된 거라고 한다. 어렸을 때 냇가에서 송사리를 잡고 놀면서 물방개를 만나면 딱정벌레 같은데 물속에서 헤엄을 잘 쳐서 무척 신기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다.
물방개의 호흡법에서 힌트를 얻은 산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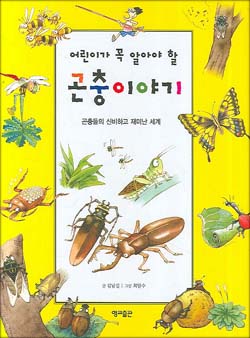 |  | | | ▲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곤충 이야기>겉 그림 | | | ⓒ 영교출판 | 방개의 딱정벌레보다 길어진 다리에는 헤엄치기에 알맞게 솜털이 잔득 달렸다. 물을 모아 뒤로 차기에 훨씬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숨을 쉴 때는 꽁지로 바깥 공기를 들이 마신 후, 날개 옆에 기포 상태로 모아 두고 조금씩 사용한다. 즉 방개가 숨을 쉴 때마다 기포 속의 공기는 줄어들고 공기의 찌꺼기인 이산화탄소는 꽁지 밖으로 뽀글뽀글 빠져 나가게 되는 것이다.
모아둔 공기가 모두 떨어지면 방개는 물위로 올라와 신선한 공기를 보충한 다음 물 속으로 다시 들어가 먹이 활동 등을 한다. 그러다가 공기가 떨어지면 다시 물 밖으로 나와 호흡하여 공기를 몸속에 저장한 다음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생활을 한다. 그러고 보니 방개의 몸 자체가 하나의 산소통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방개의 호흡법에서 힌트를 얻어 수중탐사 등 인간들이 바다 속에서 활동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산소통을 개발했다는 사실이다. 산소통은 자연을 유심히 관찰한 사람에게 주어진 자연의 특혜인 셈이다.
물속의 청소부인 방개는 새끼를 어떻게 낳을까? 방개는 물풀의 줄기에 구멍을 뚫은 다음 알을 낳는데, 개구리와 올챙이가 전혀 다른 것처럼 물방개 역시 어미와 새끼는 전혀 다르다. 집게벌레처럼 생긴 방개의 새끼, 애벌레는 하얀색, 어미의 식성을 닮아 육식을 하는데 올챙이나 작은 곤충의 새끼를 잡아 체액을 빨아 먹고 성장한다고 한다.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몇 차례의 허물을 벗은 다음 물 밖으로 뛰쳐나가 진흙 속에 숨어들어 번데기가 된다. 하지만 진흙 속에서 어미처럼 공기호흡을 하기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일은 없다. 방개가 육지를 버리고 물을 선택한 비밀이 번데기 과정에 숨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른이 된 방개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어미처럼 물속의 청소부로 일생을 살아간다. 하지만 가뭄 등으로 연못이 마르거나 물속의 환경이 나빠지면 방개는 힘차게 날아올라 다른 물을 찾아 나선단다.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곤충이야기>에서 만난 물방개. 어렸을 때 냇가에서 송사리를 잡고 놀며 소금쟁이와 함께 가장 쉽게 보았던 헤엄 잘 치던 물방개의 추억을 떠올리며 재미있게 읽은 책이다. 물방개 못지않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잠자리의 고향은 물속입니다. 애벌레일 때는 물속에서 살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하늘에서 살지요. 잠자리는 바깥세상보다 물속에서 자손을 키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잠자리 애벌레는 긴 턱으로 송사리나 올챙이를 사냥하여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다가 물장군 같은 천적을 만나면 로켓처럼 도망칩니다. 이 녀석은 꽁지로 물을 빨아들인 후 산소를 걸러서 숨을 쉰답니다. 그렇게 빨아들인 물을 급히 쏘아 내면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지요. 잠자리 애벌레의 이 재주는 로켓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헬리콥터를 개발하는데 좋은 모델이 되었던 잠자리를 꼭 닮았지요" - 책 속에서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곤충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곤충의 탄생부터 곤충의 성장과정과 특징, 위장과 방어, 겹눈과 더듬이처럼 곤충을 관찰하는데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들, 익충과 해충, 사회생활을 하는 곤충들 등, 곤충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을 21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설명한 책이다.
책은 전체적으로 물방개나 잠자리처럼 아이들이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곤충의 꼭 필요한 이야기를 과학적 활용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물방개의 호흡에서 산소통을 개발했다거나, 잠자리 애벌레가 천적을 물리치는 방법과 로켓의 원리를 연결 지어 들려주는 것처럼.
아이들의 곤충에 대한 관찰과 호기심, 과학에 대한 쉬운 이해와 접근 등이 훨씬 쉬울 듯하다.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2억만년 전에 진화를 끝낸, 금메달감 곤충들
이로운 곤충과 해로운 곤충, 집안의 해충들 이야기는 자연 생물들에 대한 인간의 시각과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더듬이와 겹눈, 사회를 이루는 곤충 이야기는 교과서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곤충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식상함이 없다.
제 몸의 200배나 점프할 수 있는 벼룩, 뒷다리의 힘만으로 1미터를 뛸 수 있는 메뚜기, 자기 몸의 300배에 달하는 무게를 끌 수 있는 딱정벌레들, 자기 몸의 800배가 넘는 무게를 끌 수 있는 소똥구리, 발바닥에 기름칠이 되어 있어 물 위를 미끄러져 다닐 수 있는 소금쟁이, 하루에 120km까지로 날아 이동할 수 있는 모나크나비.
벼룩의 능력을 사람의 몸을 기준 삼아 비교하면 70층짜리 건물 높이만큼 점프하는 것과 같고, 메뚜기의 뒷다리 힘은 사람이 한 발로 100미터를 뛰는 것과 같단다. 그리고 소똥구리의 능력은 사람이 맨손으로 5~6톤의 자동차를 맨손으로 끄는 것에 해당, 모나크나비의 능력은 헬리콥터를 타고 부산을 6번 정도 왕복하는 것과 같다니 놀랍다.
이 책을 통하여 알게 된 의외의 사실. 곤충들은 이미 2억만 년 전에 일찌감치 진화를 끝내버리고 지금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2억 만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습은 거의 같단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단순하게 살아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곤충들의 존재 이유가 새삼스럽게 여겨진다.
곤충들은 저만의 존재 이유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들처럼. 한 지역의 환경 색이 어떤가에 따라 곤충의 색이 민감하게 변한다고 한다. 공해가 나무를 덮어 칙칙하면 곤충들 역시 칙칙해진다고 한다. 익충과 해충의 기준은 무엇일까? 100% 사람의 생활만으로 그 기준을 삼아야 하는 걸까?
포행이란 것이 있다. 스님들은 강원이나 선방에서 공부를 하는 틈틈이 포행, 즉 산책을 한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책이 아니다. 내 발에 밟혀 죽는 생명이 없도록 발밑을 살펴 걷는 산책이 곧 포행이다. 우리의 삶도 포행 같으면, 자연과 자연의 또 다른 생명을 대하는 마음이 포행의 마음이라면 훨씬 관대한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덧붙이는 글 |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곤충이야기>(김남길 글, 최달수 그림/영교출판. 2007.4.20/7,000원)를 쓴 저자 김남길은 동물과 곤충을 좋아하여 자연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써왔고, 지은책으로 <까르르 과학 동화>, <어린이 자연학교>, <가짜 똥>, <오두막 일기>,<쓰레기를 먹는 공룡>, <15분짜리 형>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