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내포땅 깊숙한 곳에 자리한 수덕사. 1천4백 년 고찰 수덕사는 조계종 제7교구의 본사(本寺)로 충남 지방의 말사 36개를 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나라 4대 총림의 하나인 덕숭총림(德崇叢林)이 있다. | | | ⓒ 권기봉 | | 이중환이 <택리지(擇里志)>를 통해 충청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꼽은 내포땅을 찾는 길은 곧 여유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예부터 가야산(伽倻山)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예산과 서산, 태안 등 열 고을을 '내포(內浦)땅'으로 불러왔는데, 개심사(開心寺)나 해미읍성(海美邑城) 등이 점점이 있어 답사하다가 지칠 때면 쉽게 들러 좋은 공기를 마실 수도 있고 아직도 넉넉한 충청도 인심이 항상 길손을 반겨주기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이다.
내포땅 남쪽에 개심사 버금가는 정겨운 사찰이 있기에 길을 나선다. 가야산 남쪽의 덕숭산(德崇山)에 둥지를 틀고 있는 수덕사(修德寺)가 목적지로, 그저 한적하기만 한 개심사보다 사찰 규모도 훨씬 크고, 조계종 제7교구의 본사(本寺)로 충남 지방의 말사 36개를 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4대 총림의 하나인 덕숭총림(德崇叢林)이 있기에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사찰이다. 그러나 이미 물신이 지배하는 사회 분위기 탓인지, 수덕사를 오르는 길도 생각만큼 유쾌하진 않은 듯 하다. 내포땅의 여유를 바라고 왔지만, 곧 그릇된 생각이었음을 깨닫는 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 | | ▲ 만공에 의해 중수가 진행되던 1937년 당시, 벽 안에서 1308년에 세웠다는 묵서명(墨書名)이 나와, 지금까지 창건 연대가 알려져 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판명된 대웅전이다. 젊은이들처럼 요란한 색조화장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담담한 외벽과 깊게 패인 나뭇결, 불룩한 배흘림기둥은 마치 옆집 아주머니를 보는 듯 하다. | | | ⓒ 권기봉 | |
성역(聖域)으로 가는 길에 공짜는 없다!
차에서 내린 길손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하는 것은 환영의 말 한 마디 없는 주차료다. 불법 주차와 너도나도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세태도 막고 사찰 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어딘지 모르게 이런 산중 고찰에까지 물신(物神)의 손이 뻗친다는 생각에 씁쓸할 따름이다. 그래도 어쩌랴, 사찰 대문이라 할 수 있는 일주문을 향해 걷자. 역시 아직은 속(俗)의 영역을 걷고 있는 지라, 길 양옆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의 웬만한 관광지라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효자손과 핸드폰줄 등 각종 물품을 파는 상점들이 즐비하다. 물론 빈대떡과 탁주를 파는 온갖 식당들이 빠질 리가 없다.
이런저런 상념에 젖은 채 길을 오르면 이내 성(聖)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일주문 앞에 서게 된다. 이제는 좀 나아질까 싶지만 여기서 또 지갑을 열어야 한다. 사찰 입장료 2천원씩을 내라는 것인데, 성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공짜는 없는 모양이다. 수덕사 측에서는 주차료와 상점·식당 임대료 등을 거둬들이는데도 또 입장료를 내라 하니, '충남 예산군 덕산면(德山面) 덕숭산(德崇山) 수덕사(修德寺)'에서 보이는 세 번의 '덕(德)'은 날씨가 매서워 잠시 어디로 간 것일까.
 | | | ▲ 수덕사는 뭐니뭐니해도 대웅전이요, 대웅전의 매력은 곧 측면의 면 분할이다. 11개나 되는 보의 수에 비해 그리 복잡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단순성의 미가 느껴지기까지 한다. 또 그 사이로 드러난 누런 벽면과의 조화를 몬드리안이 보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 | | ⓒ 권기봉 | | 누구는 울며 겨자도 먹는다는데 돈 2천원이 아깝다고 돌아갈 수는 없는 일, '성역으로 가는 입장료'를 내고 경내로 들어선다. 손재형(孫在馨)이 쓴 '덕숭산(德崇山) 수덕사(修德寺)'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 일주문을 지나 다시 길을 오르자. 여기서부터는 명명백백한 수덕사 경내, 그래서인지 상점이나 식당들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번엔 지난 95년부터 해온 중창 불사의 결과가 눈을 불편하게 한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늘 그렇듯 그저 크고 번듯하게 짓는 게 중창 불사의 단일 모토였는지, 지금의 수덕사는 영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듯 하다. 아쉽게도 중창 불사를 하기 전에 수덕사를 찾은 경험이 없기에 그때의 상황은 그저 책이나 머리 속의 상상으로 유추해 볼 뿐이나, 분명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수덕사 터는 우리나라 불교가 처음 시작된 곳 중의 하나라고 하기도 한다. 즉 서기 383년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수한 자리에 절이 세워졌다는 것인데, 확실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또한 당(唐)의 도선(道宣)이 찬(撰)한 <속고승전(續高僧傳)>을 근거로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인 백제 위덕왕 때 세워졌다는 설과 백제 법왕 원년(599년)에 지명법사(智命法師)가 창건했다는 설, 숭제법사(崇濟法師)가 창건했다는 설 등이 있으나 확실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다. 다만 확실한 것은 고려 충렬왕 34년인 1308년에 수덕사 중심 건물인 대웅전을 세우는 등 지금의 가람 배치가 어느 정도 정해진 뒤, 조선 중종 23년인 1528년, 영조 27년인 1751년과 46년인 1770년, 순조 3년인 1803년에 각각 중수한 기록이 확인되었고, 일제 지배를 받던 1936년에서 1940년에 걸쳐 만공(滿空) 스님이 해체 수리한 역사가 있다.
 | | | ▲ 목조 건물은 많은 부재를 통해 못 없이 연결되는데, 사진에서 보이는 곡선의 '우미량'은 기능적 의미뿐만 아니라 곡선의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 우미량은 지붕을 가로 방향으로 떠받치는 도리들을 연결해 무게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 | | ⓒ 권기봉 | |
1400여년 전의 도량에서 만난 세 명의 스님
한편 수덕사 이야기를 할 때 빼놓기 힘든 스님으로 세 명을 들 수 있는데, 먼저 한말에 수덕사에 있었던 경허 성우(鏡虛 惺牛; 1849~1912) 스님과 그의 제자 만공 월면(滿空 月面; 1871~1946) 스님이 있다. 9세에 과천 청계사에서 출가한 경허는 개심사와 부석사 등에서 선풍을 일으켰고, 만취한 상태에서 법당에 들어 파계승 소리를 듣기도 했다. 말년(1904년)에는 결국 사찰을 떠나 이름을 박란주(朴蘭州)로 고치고 서당 훈장을 하다 1912년 4월 25일 입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해야 할까. 젊은 여자의 맨 허벅지를 베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 일곱 여자의 허벅지를 베고 잤다고 해서 '칠선녀와선(七仙女臥禪)'이라는 말을 낳기도 했고, 밭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던 아낙을 갑자기 와락 끌어안는 등 경허처럼 호방한 기질이 다분했던 만공. 그는 이런 엽기적(?)인 일화 말고도 마곡사 주지로 있던 1937년, 조선 불교를 일본 불교화 하려는 조선 총독 데라우치에게 강하게 반발하는 등 기개를 보여주기도 했고, 조선 31본산 주지 중 유일하게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엽(一葉; 1896~1971)을 들 수 있다. 본명이 김원주(金元周)인 일엽은 목사의 딸로 태어나 서울 이화학당에서 수학하고 일본 동경영화학교(東京英和學校)를 다니는 등 당시 남자들도 힘들다는 고등 교육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영화학교를 다니다 귀국, 우리 나라 최초의 여성 잡지인 <신여자(新女子)>를 창간하고 화가 나혜석과 함께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일조했다. 아버지의 영향 탓이 크겠지만 20세까지는 기독교 신자였던 일엽은 1933년, 38세의 나이에 수덕사에 올라 불교에 귀의한다. 일엽은 속세에 있을 때 수상록 <청춘을 불사르고>를 내기도 하는 등 이름을 떨쳤다.
몬드리안이 수덕사를 보았다면…
 |  | | | ▲ 대웅전은 맞배지붕에 주심포 기둥을 하고 있는, 단순하면서도 장중한 느낌을 준다. 주심포는 기둥 위에만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해주는 장치인 공포장치를 두는 형식으로, 여러 개를 두는 다포계보다 단촐한 맛이 있다. 특히 단청이 벗겨져 속이 드러나 보이는 깊이 패인 나뭇결은 대웅전의 내력을 말없이 보여주는 듯 하다. | | | ⓒ 수덕사 | 수덕사와 함께 했던 고승들을 되새기며 일주문을 지나 계속 발길을 재촉하면 중창 불사로 들어선 으리으리한 계단들이 나타나는데, 조금이라도 호젓한 느낌을 원한다면 어서 여길 벗어나야 할 것이다. 길손은 대웅전을 본떠 지은 듯한 황하루와 값비싼 돌로 치장한 돌계단을 발걸음을 재촉해 오른다. 이내 선방이 앞을 막고 이것을 돌아 높은 축대를 오르면 수덕사의 중심 건물, 대웅전이다.
수덕사의 시작이자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한 대웅전은, 만공에 의해 중수가 진행되던 1937년 당시 벽 안에서 1308년에 세웠다는 묵서명(墨書名)이 나온 것을 보면 지금까지 창건 연대가 알려져 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에 해당한다. 즉 내년이면 696살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일까. 젊은이들처럼 요란한 색조화장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담담하기만 한 누런 외벽 사이로 보이는 깊게 패인 나뭇결은 마치 옆집 아주머니의 주름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뿐만 아니라 기둥과 들보, 창방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공포 역시 화려한 다포보다는 주심포 양식을 취함으로써 간결하게 표현했고, 지붕 역시 안정감 있는 배흘림 기둥 위에 맞배지붕을 올려 단순하면서도 장중한 느낌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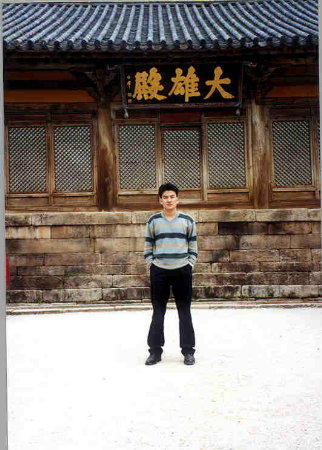 |  | | | ▲ 수덕사에는 유달리 높다란 석축이 많은데, 중심 건물인 대웅전도 기단 부분이 매우 높게 구조되어 있어, 평균 남성 키를 기준으로 거의 가슴 높이에 해당하는 기단부를 가졌다. 그래서 그런지 아래서 높이 올려다보아야 대웅전이 무리 없이 시야에 들어온다. | | | ⓒ 권기봉 | 특히 대웅전에서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측면의 면 분할이 아닐까 싶다.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대웅전 앞에만 서면 사람들이 어디서 알고 왔는지 건물의 옆으로 오르기 위해 축대를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사람들은 단순함이 주는 자연스런 아름다움에 목말라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대웅전 벽이 주는 아름다움은 아무래도 면의 분할에 있고 그 색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러움에 있는 듯 하다. 즉 건물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둥을 수직으로 가르며 지붕을 떠받치는 기능을 하는 구조물, 즉 보를 11개나 볼 수 있는데, 많은 수의 보에 비해 그리 복잡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아름답게 보일 뿐만 아니라 단순성의 미가 느껴지기까지 한다. 게다가 다른 건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우미량이라고 하는 부재가 보이는데, 그 곡선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생생한 율동미가 느껴진다. 그러나 아무리 구조가 훌륭하다 해도 누런 색의 벽이라는 평면이 없었다면 좀 심심해 보였을 수도 있었을 텐데, 기둥과 보 사이의 한지처럼 편안한 느낌의 누런 벽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 무언가가 있는 듯 하다. 몬드리안이 수덕사 대웅전을 보았다면 깜짝 놀랐을 법한 아름다운 예술품이라 할 수 있겠다.
 | | | ▲ 수덕사는 지난 95년부터 벌여온 중창 불사로 인해 고색 창연한 모습을 많이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웅전이나 그 앞의 삼층석탑과는 달리 사진 앞쪽의 두 탑은 아직 세월의 이끼가 끼지 않아서인 지 공업적으로 보인다. | | | ⓒ 수덕사 | | 한편 대웅전에는 적지 않은 수의 벽화(壁畵)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바로 얼마 전 한국전쟁 때까지만 해도 존재했었다고 하니 그저 아쉬울 따름이다. 지금 대웅전 내부에는 어떤 벽화도 남아 있지 않지만, 1937년 대웅전 해체 수리를 할 때까지만 해도 벽화가 있었다. 특히 그려져 있던 벽화들 안쪽에서 원래의 벽화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작은 부처와 나한, 꽃이 꽂혀진 화병, 악기를 타는 비천을 그린 주악비천도(奏樂飛天圖) 등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친 벽화들이 그것이다. 물론 공사를 하면서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 벽 자체를 분리해 보관을 하고 있었지만 해체 수리 공사가 일제 강점기에 진행된 만큼 모사화의 일부는 일본인들에 의해 현해탄을 건너갔고, 떼어낸 벽체들은 한국전쟁 때 부서져 버려 지금은 임천(林泉) 선생이 모사한 작품 몇 점만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을 뿐이다.
 | | | ▲ 한 장인이 법고에 단청을 칠하고 있다. 세월이 지나 색이 바래면 다시 옷을 입혀야 하고 건물이 오래되었으면 응당 보수를 해야하지만, 새로 건물을 짓거나 가람배치를 완전히 바꾸는 등의 대대적인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유재산이기에 앞서 모두의 '문화유산'이라는 점도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 | | ⓒ 권기봉 | |
도솔천이 따로 있나…
연세 지긋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수덕사가 많이 변했다고들 한다.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직접 본 적이 없으니 뭐라 확신은 못하지만,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접하는 수덕사와 요즈음의 수덕사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나서서 뭐라 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수덕사도 엄연한 문화유산이지만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인 만큼 궁궐이나 성곽을 유지·보수하는 문제와는 다소 차원이 다르니 말이다. 어쩌면 여기서 불교계의 고심이 더욱 아쉬워지는 지도 모른다.
그래도 이 길손에게 다행인 것은 아무리 가람 배치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등 부산을 떨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대웅전을 보기 위한 답사, 자연을 느끼기 위한 답사가 아닌가 싶은 수덕사 답사, 유달리 높은 석축 여러 개를 지나 지친 걸음을 재촉해 다다른 대웅전은 그저 말없이 길손을 맞는다. 황하루가 아무리 앞을 턱 하니 가로막고 가파른 돌계단이 다리를 지치게 해도, 명성으로 아무리 사람이 미어터져도, 그저 대웅전 앞에 서면 마음이 편안해 지고 돌아서서 저 아래 내포땅을 바라다보면 그 동안 답답했던 가슴마저 확 트이는 느낌이다. 도솔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 | | ▲ 수덕사 중창 불사의 극치를 보여주는 황하정루.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이런 건물과 딱딱하기만 한 돌계단은 수덕사를 찾는 길손들을 불안하게 한다. 그나마 세월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까. | | | ⓒ 수덕사 | |  | | | ▲ 그래도 수덕사를 찾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엄숙하지만 일견 친숙해 보이는 대웅전과 그 앞에서 내려다보는 시원한 전경이 있기에, 실망을 하면서도 내포땅 수덕사를 찾는가 보다. 우리들의 옹졸함이 우습지만 여길 내려가면 나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기에 더더욱 미련이 남는다. | | | ⓒ 권기봉 | |
| | 예산 수덕사 가는 길 | | | |
내포땅 수덕사를 찾아가는 길은 그다지 힘들지 않다. 충남의 덕산이나 예산으로 가기만 하면 수덕사로 가는 버스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예산에는 추사 김정희 고택과 상하이 홍구 공원에서 일본군 대장 등에게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윤봉길 의사 사적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지였던 임존성 등이 있어 시간이 있으면 함께 돌아봐도 좋을 듯 하다.
/ 권기봉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