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게임회사에서 여성직원이 한국여성민우회의 SNS를 팔로우했다는 이유로 회사대표와 면담을 하고 그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직원은 본인이 왜 여성단체를 팔로우했는지, 페미니즘과 젠더이슈에 관심이 없음을 구구절절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게임업계의 '페미사냥'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 만연한 여성혐오 광풍 속에서 게임업계 직원들, 특히 여성직원들은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오마이뉴스>가 들어봤습니다. [편집자말] |
여성 게임 기획자 A씨는 2015년 당시 다니던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월급까지 밀리는 상황을 견디다가 퇴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회사 일을 도와주며 개인 SNS에 게임 홍보를 해줬다. 그러던 어느날, A씨가 '게임 내 성상품화가 심하다'는 글을 SNS에 공유한 것을 보고 게임 유저들이 "이 사람 메갈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다. 유저들은 "이런(A씨가 참여한) 게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강력하게 회사 측에 항의했다.
A씨는 회사 소속이 아니었으나, 당시 담당 PD는 문제를 제기한 게임 유저들에게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법적 대응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A씨가 SNS를 삭제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이 일로 충격을 받아 약 2년 동안 게임업계를 떠나야만 했다.
무력감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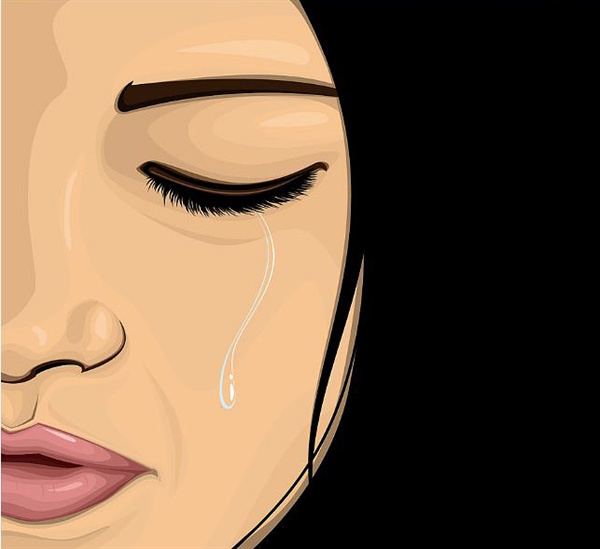
|
| ▲ 게임업계 여성직원들은 '메갈 색출'을 한다며 SNS를 터는 게임유저들로 인해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
| ⓒ pixabay |
관련사진보기 |
복수의 게임 회사 직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게임 회사는 게임에 대한 여론을 좌우하는 남초 커뮤니티의 여론을 의식하다 보니 여성 직원들의 SNS를 자제시키거나 검열까지 하는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 '페미니즘 마녀사냥'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더욱 공론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임 회사에서 그래픽 업무를 맡은 B씨는 회사로부터 "SNS 이용에 주의해달라"는 지침을 받았다. 회사는 앞으로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외주 작업도 기피할 거라고 했다. B씨는 SNS 상에서 개인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글과 사진을 모두 지웠다. 그럼에도 두렵다.
"요즘에는 트위터를 하는 여자만 봐도 그냥 '메갈'이라고 한다더라고요. 저는 출퇴근길에 트위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누군가 저를 보고 '제보'를 하는 것은 아닐지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C씨는 개인 SNS에 최근 연이어 벌어진 게임 업계의 '메갈 색출' 움직임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경우다. 페미니즘 이슈에 관련해 "쓰지말라"고 지시하던 회사에 대한 작은 반발이었다. 그런데 내부에서 바로 C씨의 글을 신고해 다음날 상사들과 면담을 해야했다. 이후에도 회사는 "회사 명예 실추시키지 말고 중립을 유지하라"는 내용으로 직원들에게 경고를 했다.
"(SNS에서)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병원 갔더니 무기력감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조직 내에도 팽배한 반 페미 분위기
큰사진보기

|
| ▲ 게임 유저들은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하는 여성들을 모두 '메갈'로 규정하고, 이들을 게임에서 배제하라고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
| ⓒ 오마이뉴스 |
관련사진보기 |
여성 직원들은 게임 회사가 사상 검증(IMC 게임즈)이나 SNS 활동을 거리낌 없이 막을 수 있는 이유는 게임 회사 내에도 '반 페미니즘 정서'가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메갈리아 사이트가 2016년에 이미 없어졌음에도, 여전히 '메갈'이라는 말이 페미니즘 운동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게임회사 서비스팀에서 일하고 있는 D씨는 여성 상사에게도 "'메갈'이나 뭐 그런 것을 하는 건 아니죠?"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면 결국 '메갈'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수렴되고, "잘못 이야기하면 불똥 튀니 조심하라"는 상사의 말을 듣고 D씨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에선 미투나 그밖의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다녔던 회사마다 "여성혐오가 만연했다"는 4년 차 게임업계 종사자인 E씨는 지난 직장에서 회사 임원과의 대화 도중 '데이트폭력'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를 나눴다. E씨의 이야기를 듣던 임원은 대뜸 이렇게 물었다.
"메갈 하세요? 여시(여성시대) 하세요? 네이트 판 하세요?"이 임원은 "우리 팀에 메갈이 있다면 퇴사시킬 것이다, 여성 단체는 돈을 벌려고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E씨는 이후에도 그에게 "여자는 몸 팔면 되니까 돈 벌기가 쉽다", "페미니스트는 선택적 인권 지지를 하는데 뭐가 평등을 지지한다는 건가" 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여성 종사자들은 직접적인 공격이나 압박이 없더라도 게임업계와 회사를 둘러싼 분위기,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 올라오는 여성혐오 글들을 보면서 공포감까지 느끼고 있었다. 이런 심리적 무력감 혹은 공포감은 여성민우회나 민주노총 등 외부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전혀 상황 개선 조짐이 없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공포F씨는 지금까지도 회사 '블라인드' (익명 게시판)의 여성혐오 글들을 볼 때마다 불안하다. 사내에서는 페미니즘 마녀사냥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등장했는데, 이것을 블라인드에서는 "저런 사람들은 퇴사해야 한다", "블랙리스트다"라며 오히려 조롱하는 상황이라는 것. 심지어 F씨는 '메갈리아'가 한창 논란이 될 때 회사 앞에서 "페미나치들 설쳐댄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돈을 지불하는 건 남성 유저가 대다수다, 남성 유저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게임 망치지 말고 그냥 잘라라"는 식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동료들이 한다는 사실이 여성이자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F씨에게는 큰 압박과 부담이다. 페미니즘이 터부시되는 환경 속에서 '메갈'로 찍힌 직원이 보호받을 수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혹시나 누가 신상을 털까 하는 걱정에 F씨를 포함한 회사 여성 직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성유저들이 게임에 페미니즘 성향을 넣은 것도 아니고, '누구를 회사에서 잘라볼까' 개인의 SNS 공간을 사찰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음을 검증하기 위해 일부러 더 찾아다니는 것 같다고 느꼈던 직원 분들이 많아요. 저도 유저들이 회사에 '이 사람을 잘라야 한다'라는 식의 항의를 할까 매우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