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모스가을꽃의 대명사가 된 코스모스, 신이 처음으로 만든 꽃이라고 전해진다. 신이 마지막으로 만든 꽃은 '국화'라고 한다. 코스모스가 국화과에 속해있으니, 마지막 순간에 다시 처음을 상기하는 적절한 행위였을 터이다. 제주도 김녕 도로변에 피어있던 코스모스다. ⓒ 김민수

▲코스모스그들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린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어디 있으랴! 우리의 삶도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건만, 그 바람이 내개 불어올때는 차마 감당하기 힘들어 회피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바람에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 없듯이 우리네 인생도 그러하지 않을까? ⓒ 김민수

▲노랑코스모스노랑코스모스가 핀 꽃밭, 가을 햇살 한 줄기가 드리워져 있다. 빛에 따라 꽃의 색깔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다. 빛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다루는가에 달려있다. ⓒ 김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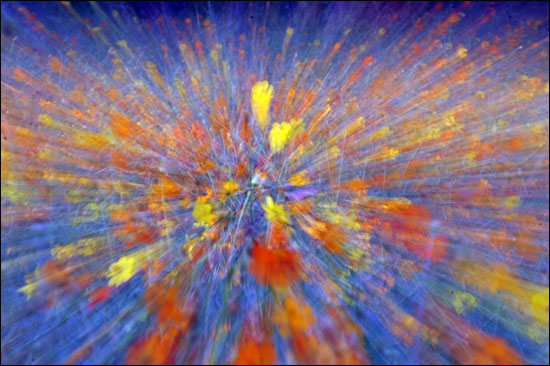
▲노랑코스모스어떤 대상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하는 고민은 사진의 다양성을 가져온다. 사진을 진지하게 담는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고민을 시도하는 것이 아닐까? ⓒ 김민수

▲코스모스강원도에서 담은 코스모스, 기온차가 큰 탓인지 꽃 색깔이 더 진한듯했다. 코스모스는 엄밀하게 말하면 여름꽃임에도 불구하고, 가을꽃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꽃은 자기가 피어난 때가 제철이 아닐까 싶다. ⓒ 김민수
바야흐로 코스모스의 계절이다.
어릴적 신작로마다 피어나 학교 오가는 길에 꽃을 따 공중으로 날리면 빙그르르 돌며 떨어지던 꽃, 까맣게 익은 씨를 따서 아무곳에나 흩뿌리면 이듬해 가을이면 어김없이 피어나 한들거리던 코스모스였다.
'코스모스'라는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까닭에 외래종이면서도 우리 이름을 얻은 '달맞이꽃'처럼 이름으로는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는 꽃이기도 하다. '코스모스'라는 이름, 그 자체가 이국적인 꽃인 것이다. 아마도 그 이름을 바꿨더라면, 더 친근한 꽃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코스모스는 무리지어 피어 있어야 예쁘고, 몇 가지 색깔이 섞여 있어야 맛이다. 그리고 바람에 산들거리고 흔들려야 맛이다. 이제 이 꽃도 공원이나 가야 볼 수 있고, 서울을 벗어나야 길가에서 드문드문 볼 수 있는 꽃이 되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이 어디 코스모스뿐일까? 모든 꽃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피어난다. 그 바람의 상징은 '고난'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하다. 고난과 아픔을 통해 연단되고, 그로인해 더 튼실한 꽃을 피워낸다. 인생과 닮은 것인지 아니면 인생이 닮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담지만, 때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담아내기도 하는 것이 사진이다. 셔터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아무리 저속이라도 몇초 만에 한 장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은 나같이 그림을 그리고 싶지만, 그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너무도 고마운 일이다.
보이는 것을 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담아 현실로 가져오는 일도 의미있는 작업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