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불꺼지지 않는 학교. 기숙형 공립학교는 기숙사 괴담만을 양산할 뿐이다. |
| ⓒ 박상규 |
관련사진보기 |
예전에 양계장의 실태를 고발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빽빽한 공간에 셀 수도 없이 많은 닭들이 있었는데 좁은 공간에서 겨우 숨만 쉬고 있다. 오로지 알을 낳는 기계가 되는 것, 그것이 닭들의 숙명이었다.
난 그 닭들을 보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다. 남들은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지만 나는 절대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의 고교 시절, 그 가운데에는 '기숙사'가 있었다. 나는 기숙형 공립학교를 다녔다. 한 방에 12명이 생활하던 빽빽한 공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침대 한 칸, 옷장 한 칸, 책상 한 칸뿐이었다. 그 시절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먹고 자고 공부하는 것뿐이었다.
얼마 전 기숙형 공립학교가 서울에도 3곳 지어진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목적이 '공교육 틀 내에서 질 높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여건 마련'이라고 한다. 당연히 벌써부터 그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숙형 공립학교를 다녔던 나로선 서울 같은 대도시에 기숙학교가 필요한 이유를 솔직히 납득할 수가 없다. 차라리 '입시에 올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면 더 솔직하지 않을까?
"하루 야자 2번·24시간 경쟁"... 기숙사 괴담은 그만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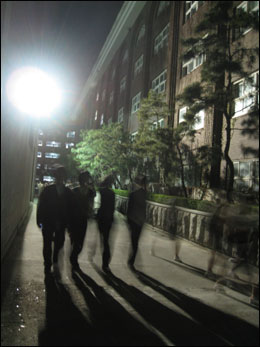
|
| ▲ 고등학교 3년 내내 우리는 양계장의 닭처럼 교실과 기숙사에서 사육당해야 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24시간 우리를 조여오던 '무한경쟁'이었다. |
| ⓒ 박상규 |
관련사진보기 |
내가 다니던 안동의 A여고는 '기숙형 공립학교'였다. '나름'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라 안동 시내 학생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공부깨나 한다는 아이들은 그 학교를 다녔다.
안동이 아닌 봉화에서 자란 나도 처음 유학이라는 걸 하게 됐다. 하지만 그 기숙사 유학 생활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다.
한 학년에 9반, 한 반에 40명 남짓한 학생들 중에서 1/3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했다. 대부분 나처럼 안동 유학을 온 경우였지만 성적 우수자에 한해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기숙사에 들어올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지기도 했다.
한 방에 12명이 함께 작는 기숙사. 방은 잠만 자는 곳이었기 때문에 침대와 옷장 서랍 한 칸이 전부였다. 공부는 따로 독서실에서 했다.
우리의 모든 일과표는 오로지 '입시'에 맞춰졌다. 당시는 야간자율학습이 10시까지였는데 끝나고 돌아오면 씻을 틈도 없이 다시 밤 11시 반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면 기상해 밤 11시 반까지 기숙사 의무학습을 했다. 하지만 대부분 자정을 넘겨야 잠자리에 들었다.
모두 중학교에서 공부 '좀' 했던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 초반부터 경쟁이 치열했다.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친구가 자지 않으면 나도 자지 않았다. 시험 기간이 되면 이런 경쟁은 극에 달했다. 시험 때가 되면 기숙사 전체가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는 '24시간 경쟁체제'에 들어갔다.
누가 마지막으로 독서실 불을 끄고 가는가!우리는 오래 앉아있기 경쟁이라도 하듯이 독서실에 남아 있었다. 나중엔 잠이 와도 책상에서 자야 마음이 편한, 기이한 상태가 됐다. 당연히 잠은 늘 모자랐다. 수업시간에 자는 친구들을 보면 열에 아홉은 기숙사 친구들이었다.
당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치라곤 2주에 한 번씩 집에 갈 수 있는 자유뿐이었다. 2명의 사감 선생님이 돌아가며 감시하며 24시간 경쟁 체제가 갖춰진 기숙사는 그야말로 완벽한 '사육의 공간'이었던 셈이다.
스카이방과 가위방, 고교시절 잔혹한 기억
큰사진보기

|
| ▲ 낭만과 추억이 아닌 괴담의 진원지로 학교를 그린 영화 <여고괴담>. 내가 다닌 기숙사형 학교에도 수많은 괴담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
| ⓒ Cine2000 |
관련사진보기 |
우리 기숙사에는 아주 특별한 방이 있었다. 여기에는 1~3학년까지 유학생뿐만 아니라 시내 학생들을 포함해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을 모아뒀는데, 일명 '스카이(SKY)방'이라 불렸다.
스카이방은 자리 싸움이 치열한 독서실에서 자리 우선권이 부여되는 등 혜택이 있었고 "스카이방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심지어 스카이 방과는 말도 섞지 않는 아이들도 생겨났다.
우리는 기숙사 생활을 통해 협동보다 '경쟁'이 무엇인지를 더 빨리 체득한 셈이다.
'스카이방'뿐만 아니라 '가위방'도 있었다. 시험 때는 다들 밤샘 공부를 하느라 방이 텅텅 비기 일쑤였다. 아이들은 혼자 자는 게 무서워서라도 그냥 독서실에서 틈틈이 자며 공부했다.
그런데 어떤 기숙생이 피곤을 참지 못하고 혼자 침실방으로 갔단다. 혼자서 잠을 자는데 침대 옆에서 귀신이 서서 목을 누르더란다. 그리고 그 방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가위에 눌렸다고 한다.
그 방은 '가위방'이라고 불렸고, 덕분에 한동안 기숙사에선 귀신 괴담이 유행하기도 했다. 몇몇은 귀신 특공대를 조직해 잡아보자고 용기있게 나섰지만 해프닝으로 끝났다. 가위방은 극도의 스트레스가 만들어 낸 창조물이었다.
집에서 있다면 나만의 공간이나 이를 받아줄 가족이라도 있건만 모두들 경쟁자인 상태에서 더욱 신경이 날카로와진다. 이럴 땐 조그만 일이라도 싸움이 나기 십상이라 몸을 사리는게 최선이었다.
기숙사에는 2명의 사감 선생님이 있었다. 교대로 돌아다니며 방 청소부터 옷차림까지 시시콜콜 간섭했는데, 규정에 어긋나면 벌점을 매겼다. 규정 항목은 청소부터 시간 지키기, 독서실 자습 참여뿐만 아니라 불량한 태도 같이 애매한 것도 포함됐다. 당연히 외출과 외박은 허락을 받아야 했고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퇴출됐다. 기숙사 퇴출은 학교 퇴학이나 다름없이 여겨졌기 때문에 다들 벌점을 받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했다. 밤 12시면 현관문이 잠기고, 아침 5시에 열리는 공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공부' 뿐이었다.
스트레스는 쌓이고 풀 길은 없다 보니 탈선으로 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고 2 때 우리방 친구들 몇 명은 베란다에 숨어 술을 먹다가 걸려 퇴출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간신히 퇴출은 면했지만, 불량학생으로 사감 선생님께 찍혀 졸업 때까지 감시 대상 1순위였다. 몰래 개구멍을 만들어 밤마다 빠져나가 놀다오는 친구도 있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면, 수준 높은 인재교육의 대미를 '수능시험'이 장식한다. 어느 대학을 지원했느냐로 지난 고등학교 3년이 실패냐 성공이냐로 갈린다.
기숙형 공립고 괴담, 우린 양계장 닭이 아니다일부 언론은 의지가 약하거나 단기간 성적을 올리려는 학생들에게 기숙학원을 추천한다. 외부와 단절된 채 24시간 꽉 짜여진 시간표대로 행동한다면 성적이 오를 수는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 시장에선 단기간 성적 올리는 방법으로 이미 기숙학원이 성행하고 있다.
이제는 공교육까지 기숙형 공립학교로 확대되고 있다. 성적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도시까지 뛰어들어 기숙형 공립학교를 만든다면 이는 결국 입시교육을 위한 또 하나의 특목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오로지 알을 낳기 위해 사육되는 닭이나 '좋은 대학'을 위해 기숙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나 다를 게 무엇인가?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기숙형 공립학교를 짓겠다는 높은 분들께 묻고 싶다.
기숙사형 공립학교를 더 만들면, 우린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