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근한 벗과 질퍽하게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새벽길에, 오래되어 보이는 문방구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굉장히 낯익은 물건들이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먼지가 뿌옇게 내리앉은 가운데 낡은 조립식 완구 박스들이 나름대로 질서있게 쌓여 있었고, 옆으로는 나이가 녹녹지 않아 보이는 서적이 진열되어 있었다. 천천히 녀석들의 자태를 훑고 있던 나의 시선은 기어코 어떤 책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쓰인 제목. 형용할 수 없이 촌스러운 외모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단해보이는 그 책은 바로 '다아니믹콩콩코믹스'가 출간한 <괴수대백과> 였다. 그 순간 갑자기 주위의 시간과 공간이 흐트러지는 기묘한 경험이 시작되었다.
 | | | ▲ :다이나믹콩콩코믹스>의 대표작들 | | | ⓒ 허지웅 | | 80년 5월 광주의 망각을 담보로 한 전두환의 이른바 '문화정책'은 프로 스포츠 시대와 더불어 만화의 르네상스를 불러왔고, 곧 수많은 만화책들과 그에 관련된 문화가 여기저기서 창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회 시장을 노리고 등장한 다이나믹콩콩코믹스는 <대백과 시리즈>와 <용소야> <권법소년> <쿤타맨>과 같은 복사물들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최초 500원, 후기에 1000원, 1500원식으로 대중 물가에 적절히 영합한 시장정책 역시 성공이었다.
'콩콩미니북스' 혹은 '다이나믹콩콩코믹스'로 기억하는 일련의 도서들은 80년대 아이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일러주던 동무자, 지구상의 모든 음모이론과 그 이면에 숨은 진실을 폭로해 주는 '진리의 대백과사전'이었다.
멀쩡히 <스타에이스>라는 제목으로 방영하는 공중파 방송의 만화영화를 대부분 아이들이 <당가도A>라고 부른 것은 <로봇대백과>와 같은 도서의 영향 탓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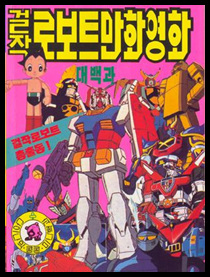 |  | | | ▲ <걸작로보트만화영화대백과> | | | ⓒ 허지웅 | <대백과시리즈>는 콩콩코믹스의 정수와도 같았다. 로봇대백과, 괴수대백과, 건담대백과, 철인28호대백과, 라이딘대백과, 강시대백과….
백과시리즈는 끝도 없이 나왔으며 아이들의 상상력 또한 그토록 확장해 갔다. 대백과 시리즈에 나온 로봇 해부도는 소년들의 습작 1호가 되었고, 로봇들의 스펙을 줄줄 외우는 마니아가 양산되기도 하였다.
각각의 에피소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기동전사건담백과>와 <기동전사Z건담백과>의 가슴 아린 이야기들은 어찌 그리도 드라마틱 하던지.
또 <괴수대백과>안의 특촬물(특수촬영물을 뜻함) 괴수들은 얼마나 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가! 순식간에 '국산 용가리'가 된 '일제 고지라'는 아이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
책 속의 괴수들은 쥬라기 공원 이전에 공륭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등장한 괴수들을 상상하면서 소년들은 땀을 흠뻑 뺄 정도로 흥분, 또 흥분했다. 그들의 꿈 속에서는 입에서 광자력 빔을 뿜는 공룡과 머리가 셋 달린 용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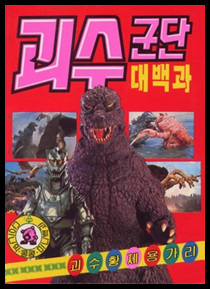 | | | ▲ <괴수군단대백과> | | | ⓒ 허지웅 | 콩콩코믹스의 유일하고도 대표적인 작가였던 '성운아'와 '전성기'는 이론의 여지없이 현존하는 최고 만화가로 손꼽혔다. 그 수많은 시리즈들마다 그림체가 완연히 다르고, 내용마다 전혀 다른 호흡이 등장하는 기상천외함을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특히 성운아의 <용소야>(친미), <쿤타맨>(고따마-긴따만)의 인기는 가공할 만했다. 소년들은 '용소야'를 위시한 패거리와 '권법소년'을 따르는 다른 패거리로 양분되었고, 나는 전자에 속해 있었다.
왕년에 용소야의 '통배권'을 시험해 보지 않은 이가 과연 몇이나 되었으랴. 한 여름에 냉장고에서 잠자고 있던 애꿎은 수박에 '경사기도권'과 '통배권'을 실험하다가 산산조각을 냈던 나에게는 다소 아픈 추억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이후, 만능스포츠맨 용소야는 시공간을 초월한 '황제' 시리즈로 활약하기도 한다.
인기의 또 다른 축이던 쿤타맨은 마사루 이전의 마사루였으며, 이나중 이전의 이나중이었다. 당시 일본의 트렌드로 군림했던 건담과 울트라맨, 가면라이더와 같은 작품들을 절묘하게 패러디한 이 작품은 많은 소년들에게 낯설지만 중독성 있는 웃음을 선사했다. 어느 벗은 소시적에 쿤타맨처럼 바닥에서 30cm 떠서 날아다니는 꿈을 꾼 적이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  | | | ▲ <쿤타맨> | | | ⓒ 허지웅 | 하지만 영광은 오래 가지 않았다. 빛나던 한때를 지나 쇠퇴 일로를 걷던 콩콩코믹스는 일본에서 한참 유행하던 '게임북' 개념을 도입하여 야심찬 시리즈물을 선보이며 또 한번 도약을 꿈꾼다.
홈즈나 람보같은 소설과 영화속 영웅들이 등장하는 이 시리즈물 역시 일본의 출판물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정 깊숙히 파고든 총 천연색 16비트 비디오 게임을 이겨내기란 버거운 것이었다.
결국 서점에서도 이 아담한 사이즈의 추억들은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일본 만화책들에 순순히 자리를 내주기에 이르렀다. 콩콩코믹스 책들로 빽빽히 차 있던 서가는 곧 <드래곤볼> 과 <드래곤퀘스트> <북두신권>과 같은 만화책으로 대체되었고, 약삭빠른 소년들의 기억 또한 그러했다. 그렇게 다이나믹콩콩은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다.
물론 콩콩코믹스는 기본적으로 해적판 도서였다. 성운아와 전성기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 현실이었고, 이러저러한 일본의 출판물들에서 베껴온 그림과 글들이 그들의 전부였다. 이들의 뻔뻔함은 그것이 해적 작가들에 의한 표절의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1:1 인쇄식 복사의 차원이었다는 데 있었다. 여기에 그들만의 고유한 영역은 오직 '쿤타킨테' 같은 특유의 절묘한 작명법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년기 소년들에게 선사했던 감동은 정확하게 한 세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었고, 그러한 이면의 사실들은 당시로선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
단돈 천원이면, 당시로선 감히 접하기 힘들던 만화와 영화의 주인공들과 그들의 에피소드를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었던 게다. P2P나 DVD와 같은 시장이 전무했던 당시, 콩콩코믹스는 '보고자'하는 욕구의 유일한 해우소였다. 문자와 사진은 영상을 대체하고 나머지 간극은 우리들의 상상이 대신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월의 흐름은 개인에게 어느 정도 냉정함을 주기 마련이지만, 추억에 대한 아련함만큼은 상쇄하기 힘들다. 콩콩코믹스가 모두의 꿈이고 진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은 아닐지언정, 당시의 순수함이 그리운 것은 사실이다.
용가리와 쿤타맨의 꿈을 꾸고, 용소야의 권법을 흉내내다 호된 꾸중을 듣던 코흘리개 소년이 보고 싶다. 그 녀석을 만난다면, 그럴수만 있다면, 녀석을 힘껏 응원해주리라. 더 힘껏, 있는 힘껏 즐거워하라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