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김수정 - 쩔그렁 쩔그렁 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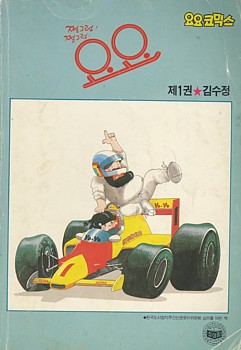
▲겉그림판이 끊어진 김수정 님 만화 <쩔그렁 쩔그렁 요요> ⓒ 최종규
아침에 기저귀 빨래를 마치고 옥상마당 빨랫줄에 널려고 하는데, 고추잠자리 한 마리 빨랫줄에 앉아 쉽니다. 빨래를 살포시 얹으면 괜찮으려나 싶지만 그만둡니다. 빨랫줄이 한들거리면 놀랄까 싶어서. 조금 뒤에 말리자 생각하며 마루에 이어 놓은 빨랫줄에 넙니다.
이십 분쯤 지나서 내다보는데, 잠자리는 아직 앉아 있습니다. 또 이십 분 뒤에 내다보아도 그대로. 이 녀석이 꽤 오래 쉬네. 기저귀를 햇볕에 말리고픈 꿈을 꺾어야 할까? 아주 살며시 널면 어떨까? 살금살금 나가서 빨랫줄을 잡습니다.
잠자리가 확 날더니 휙 떠납니다. 날아가는 잠자리를 멍하니 올려다봅니다. 그래도 우리 동네에는 마당이나 골목길 한켠에 줄을 드리워 빨래 너는 집이 많으니, 네가 쉬었다 갈 곳은 많겠지. 무쪼록 다른 데에서라도 느긋하게 쉬어 보렴.
한낮, 옆지기가 젖을 물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가 똥을 뿌지직뿌지직. 고놈 참 시원하게 누네. 기저귀 한 장 흥건히 적십니다. 더 눌까 싶어 잠깐 기다린 다음 똥기저귀를 걷습니다. 뒷간에서 똥기를 빼내고 물에 담가 목초액을 뿌립니다. 조금 뒤, 날이 더워 머리를 감을 때 함께 빱니다. 다 빤 똥기저귀도 옥상마당 빨랫줄에 넙니다. 아침에 널어 놓은 기저귀 빨래는 벌써 다 마릅니다.
꺼칠꺼칠한 손으로 마른세수를 한 다음 만화책을 펼칩니다. 밤잠도 낮잠도 제대로 이루기 어려운 요즈음, 글로 된 책을 보기는 쉽지 않고, 그림으로 된 책은 그럭저럭 읽어냅니다. 집에서 아이 키우는 사람들 누구나 책 한 권 느긋하게 손에 쥐기 어려울 테지요. 새삼, 책읽기란 여느 사람들이 쉬 하기 어려운 일이 되겠구나 싶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짬을 내고 틈을 쪼개어 마음밭을 일구어야 한 사람으로서 내 매무새를 추스를 수 있다고 느낍니다.
김수정 님이 1983년에 그린 《쩔그렁 쩔그렁 요요》를 넘깁니다. 이 만화가 처음 그려지던 때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이고, 《아기공룡 둘리》와 함께 무척 좋아하면서 눈물과 웃음을 함께 짜내었습니다. 문득 그 어린 날이 떠오릅니다.
“시끄럽다! 이 녀석아, 요요는 고철이 아냐!” “참 형님도, 아, 고철을 고철이라고 부르는데 누가 뭐래요, 더 자랑스럽지.” “입 안 다물래?” (1권 139쪽)홀로 늙던 아저씨는 온삶을 바친 꿈이었던 ‘딸아이’를 사람으로가 아닌 로봇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 아저씨한테는 로봇이 아닌 ‘사람 딸’일 뿐이고, 둘레에서 이 아이를 놓고 ‘돈으로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꿍꿍이’를 키우거나, ‘일부러 못살게 굴거나 괴롭히는 짓’을 일삼거나 해도, 끝까지 아이를 지키고 감싸고 돌봅니다.
로봇아이 ‘요요’는 거칠고 팍팍한 세상에서 늘 생채기를 받습니다만, 자기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들을 믿고 따르며 조금씩 따뜻하고 큰 아이로 커 갑니다. “요요의 몸속에는 찌그러진 깡통과 못 쓰는 고철만 가득 들어 있대요.(144쪽)” 같은 말을 들어도, “바보 로봇이라니까, 그래서 괜찮아. 또 던져 봐.(145쪽)” 같은 말을 들어도, 이웃이나 동무 어느 누구도 못살게 굴지 않습니다. 앙갚음도 없습니다. 홀로 눈물을 흘리다가는, 자기 눈물을 조용히 닦아 주는 너른 손길을 잡으며 시나브로 ‘너른 마음길’을 배웁니다.
ㄴ. 김수정 - 미스터 제로

▲겉그림판이 끊어진 김수정 님 만화 <미스터 제로>. ⓒ 최종규
밤새 아기와 씨름하면서 잠이 들기 어려웠는지, 한낮쯤 되니 졸음이 확 밀려들면서 한 시간 남짓 까무룩 잠이 듭니다. 그동안 옆지기는 밀린 기저귀를 빱니다. 햇볕이 따사로운 때를 그냥 넘기기 아깝다면서. 이제 쉰 날 가까이 되고 보니 옆지기도 어느 만큼 집안일을 거들 수 있습니다.
옆지기가 빨래하는 사이 아기는 똥을 왕창 눕니다. 물을 뎁혀서 엉덩이와 잠지를 씻고, 아기 바람씻이(풍욕)를 합니다. 아기한테 젖을 물리고 눕히니 어느새 두 시가 넘는 때. 날마다 똑같이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하루가 짧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무거워지고 무럭무럭 자라는 아기를 보면서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하고 느끼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이 느슨해지면 하루 내내 무엇을 했는지 종잡지 못하는 가운데 저녁을 맞이하게 됩니다.
차분하게 마음 추스를 새 없는 가운데, 김수정 님 만화 《미스터 점보》를 봅니다. 1984년 4월부터 1985년 12월까지 〈학생과학〉에 싣던 작품으로, 학교성적은 ‘0’이지만 끊임없이 새 발명품을 만들어 내려고 머리를 쓰는 아이가 나옵니다. 어느 날, 어머니를 도와 마늘을 빻으면서 묻습니다.
“김치 담그는 데 몇 분 정도 걸려요?” “몇 분이라니? 한나절이다.” “한나절이나요? 에이, 그럴 바에야 차라리 김치회사에서 사다 먹죠?”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왜 비싼 걸 사서 먹니? 값도 값이지만, 집집마다 특색있는 김치맛이 있지 않느냐.”(141쪽)아기가 불러서 만화책을 집던 손을 자주자주 놓습니다. 만화책 한 권을 다 읽어내기까지 꽤 여러 시간이 걸립니다. 아기 돌보기도 해야 하지만 우리 두 식구 밥도 먹어야 하고, 어질러 놓은 채 엄두도 못 내지만 방바닥이라도 훔쳐야 하고, 뭐도 하고 뭣도 하며 내처 돌아치게 됩니다.
다시 만화책을 펼칩니다. 학교 공부에는 젬병일 뿐 아니라 도무지 재미가 붙지 않아 시험을 코앞에 두고도 책상맡에서 쿨쿨 자기만 하는 ‘제로’. 수학과 과학은 늘 ‘0점’을 받으면서도 수학과 과학을 써서 이웃들한테 도움이 되는 발명을 하려고 애쓰는 제로. 좋은 생각으로 온몸을 바쳐 여러 날 동안 잠과 밥을 잊으면서 발명에 빠지는 제로한테, 둘레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일이란 없습니다. 제로가 무언가 한 군데 잘못을 해서 영 글러먹게 될 때에도 그 모자람을 알려주는 이가 없습니다.
책을 덮으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발명소년 제로한테 학교교육이란 무엇일까 하고. 학교는 제로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고. 학교를 다니는 모든 아이한테 다 다른 가르침을 베풀기란 어려울 수 있을 테지만, 다 다른 아이가 다 다른 자기 길을 찾으면서 다 다른 자기 배움을 꾸려 나가도록 이끌거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고.
세상 모든 일은 ‘0’부터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세상을 헤쳐 나가려는 제로한테, 우리들은 “넌 참 엉뚱하다”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 네 길을 가려면 이렇게 하면 더 낫겠구나” 하는 도움말을 들려주어야지 싶은데, 모두들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몹시 바쁩니다.

▲아기와 아이이웃 할머님네 돌잔치에 나들이를 갔더니, 함께 돌잔치에 나들이온 동네 꼬마가 우리 집 아기를 들여다봅니다. 아이 키우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쩌면 쉽지 않은 아이 키우기이기 때문에 훨씬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새록새록 피어나지 않으랴 싶습니다. ⓒ 최종규
덧붙이는 글 | <시민사회신문>에 함께 싣는 글입니다.
글쓴이 인터넷방이 있습니다.
[우리 말과 헌책방 이야기] http://hbooks.cyworld.com
[인천 골목길 사진 찍기] http://cafe.naver.com/ing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