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코 밸리의 행잉 코핀스
솔 향기 머금은 부드러운 바람이 볼을 스친다. 청아한 새 소리는 내 마음을 어루만진다. 진솔이와 나는 에코 밸리로 가고 있다. 숙소를 나와서 세인트 메어리 성당을 지나 20여분을 걸으니 수십 길 낭떠러지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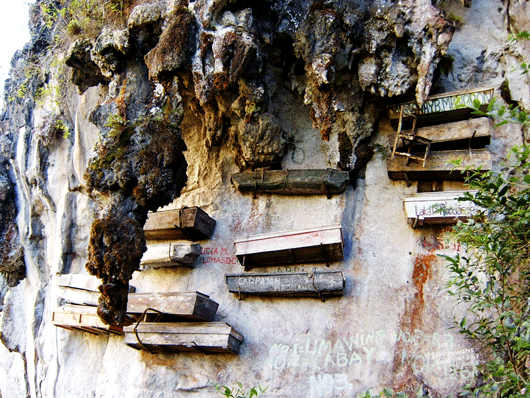 | | | ▲ 에코 밸리의 행잉코핀스 | | | ⓒ 최진호 | | 미끄러질까봐 조심조심 한참을 내려가니 양쪽에 온갖 기암괴석들이 늘어서 있고 가운데에는 울창한 숲 사이로 작은 내가 흐르는 계곡이 나왔다. 여기가 에코 밸리인가? 이제 아침 식사 때를 갓 넘긴 이른 시각이라 계곡 안에는 안개도 채 걷히지 않았다. 사람도 우리 밖에 찾는 이 없이 사위가 고요하기만 했다. 간간이 새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절벽들을 자세히 둘러봤다. "아빠 맞아요, 맞아. 저기 보이잖아요." 절벽에 매달려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물체들을 가리키며 진솔이가 소리친다.
우리가 찾은 것은 오래된 관들이었다. 여기가 행잉 코핀스(Hanging Coffins), 즉 절벽에 매달린 관으로 이름난 에코 밸리이다.
이 진기한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데 위쪽에서 왁자지껄한 말 소리와 경쾌한 웃음소리가 들려 온다. 울창한 숲과 안개에 가려져 빛조차 잘 들지 않은 음습한 골짜기에서 시체가 들어 있을 관들을 마주하는 으스스한 분위기에 짓눌려 있던 차라 안도감과 반가움이 솟는다.
 |  | | | ▲ 에코 밸리의 기암괴석 | | | ⓒ 최진호 | 그들은 가이드를 앞세우고 에코 밸리를 찾아 온 여행자들이었다. 모두 여덟명이었다. 마닐라와 그 인근 도시에 사는 중국인 두 커플, 중국인 남편과 필리핀인 아내로 이루어진 한 커플, 그리고 혼자 여행 왔다가 이들과 합류한 필리핀 아가씨 한 사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울렸다. 가이드인 파비안은 행잉 코핀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시신을 넣은 관을 밧줄을 이용해 절벽에 매달아 놓거나 동굴에 안치하는 것은 사가다 지역의 이고롯족에게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풍습이다. 이런 풍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무슨 연유에서 비롯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이는 없다. 다만, 이고롯족이 바람도 없고 햇빛도 들지 않은 음습한 땅 속을 싫어했거나, 시체를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으리라고 추측할 뿐이다.
이고롯족들은 이 기묘하고도 이채로운 풍습을 수백, 수천년간 지켜 왔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고롯족 노인들은 죽은 뒤 자기 시신을 관에 넣어 절벽에 매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화장을 선호한다고 한다.
 | | | ▲ 폭포가는 길에서 본 라이스 테라스. 팔레트같다. | | | ⓒ 최진호 | | 우리는 에코 밸리를 따라 내려갔다. 땅 밑으로 강이 흐른다는 라탕 지하강 어귀를 지나 찻길로 올라섰다. 길 옆 구멍가게에서 빵으로 주전부리를 한 다음, 중국인 일행을 따라 예정에도 없던 보콩 폭포로 향한다.
 | | | ▲ 폭포에서 중국인, 필리핀인 일행과 함께 | | | ⓒ 최진호 | | 수마깅 동굴
수탉이 우렁찬 목소리로 아침을 알린다. 암탉은 나지막한 꼬꼬댁 소리로 화음을 맞춘다. 새 날이 축복처럼 내려 왔다. 베란다로 나가 눈을 들어 사가다를 성처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바라본다. 끝간 데 없이 산허리를 휘감고 있는 하얀 구름들의 신비함이란.
 | | | ▲ 사가다의 아침 | | | ⓒ 최진호 | | 오늘은 사가다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수마깅 동굴(Sumaging Cave)에 가기로 한 날이다. 우리 일행은 다섯이었다. 나와 진솔이, 가이드인 에디, 그리고 리와 태비이다. 리와 태비는 필리핀대학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여학생이다.
사가다 시내를 벗어나서 드망 부락을 지나니 소나무 숲이 나타나고 들이 펼쳐진다. 아직 해가 쨍쨍 내리쬐기 전이다. 부드러운 햇살에 볼을 간질이는 미풍, 길 가에 앉아 있는 촉촉한 이슬 머금은 키 작은 들꽃처럼 우리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났다. 덩달아 발걸음도 경쾌해졌다.
3,40분 쯤 걸어 가니 동굴 안내판이 나온다. 돌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저 아래 동굴이 입을 쩌억 벌리고 있다. 입구에서 에디가 가스 램프에 불을 당겼다. 가스등을 높이 든 에디의 인도 따라 우리는 손으로 돌들을 더듬어가며 조심조심 아래로 내려갔다. 깜깜한 동굴 천장에서는 소란스러운 박쥐들의 날갯짓 소리가 들려왔고, 돌길에는 박쥐의 배설물이 쌓여 있어 미끄럽기 그지없었다.
 | | | ▲ 수마깅 동굴에서. 신이 난 진솔과 두 필리핀 대학원생. | | | ⓒ 최진호 | | 10여분을 내려가니 평평한 바위가 나온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발을 벗고 물에 젖어도 좋을 옷으로 갈아 입었다.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인 동굴 투어가 시작되는 것이다.
앞장 선 에디를 따라 조심조심 걸어갔다. 에디의 손에 들린 가스등 불빛에 동굴 속 비경이 드러난다. 바닥에는 차갑고 맑은 물이 흐르고 군데군데 천연 수영장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색조에 검은색, 회색 바위가 섞인 석회암 암석들은 온갖 진기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초콜릿 케이크 모양, 커튼 모양, 라이스 테라스(계단식 논) 모양, 남녀의 성기 모양, 그리고 여왕의 욕조라고 이름 붙인 수영장 등등.
기기묘묘한 동굴 속 풍경을 나름대로 카메라에 담으려고 애썼지만 역부족이다. 외장 스트로보를 준비하지 못했고 희미한 가스등도 하나뿐이니 조명이 받쳐 주지를 않는다. 한숨만 나올 뿐이다.
진솔이는 신이 났다. 천연 수영장에서 물장구를 치다가 타잔처럼 밧줄을 타고 바위를 오르내린다. 카메라가 물에 젖을새라 전전긍긍하며 조심조심 움직이는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서 동굴 속을 뛰어다닌다.
 | | | ▲ 수마깅 동굴 속 커튼 모양의 석회암 | | | ⓒ 최진호 | | 처음 동굴 속에는 우리들밖에 없었다. 그 상황에 나는 두려움이 일었다. 에디가 램프라도 떨어뜨리면 낭떠러지 투성이인 암흑의 동굴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어찌한담. 하지만 웬 걱정? 계속 걸어가다 보니 동굴 속에는 여러 팀들이 있었다. 수학여행 온 대학생들, 네덜란드인 커플 등으로 동굴 속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1시간 30분쯤 동굴 속을 돌아다니다 보니 처음에 옷을 갈아 입었던 곳이 나왔다. 박쥐들의 소란스러운 날갯짓 소리를 뒤로한 채 우리는 동굴 밖으로 나왔다.
 | | | ▲ 암바싱 초등학교 아이들과 축구하는 진솔 | | | ⓒ 최진호 | | 진솔이와 나는 사가다에서 열흘 동안 머물렀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여러 부락들을 돌아 다녔고, 크고 작은 여러 폭포까지 트래킹을 했다. 그리고 학교를 찾아가 만난 아이들과 축구와 농구를 했고 2000m 넘는 암파카오 산에도 올랐다.
사실 사가다에서는 적어도 한 달은 머물러야 한다. 그래야 사가다를 좀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가다에 여행 온 사람 중에는 사가다의 풍광과 인심에 반해 아예 자리 잡고 사는 외국인들도 많았다.
 | | | ▲ 사가다 초등학교에서 만난 아이들 | | | ⓒ 최진호 | | 그동안 현지인과 외국인 여러 사람과 친교를 맺었다. 그 중에서도 영국인 데이비드 포울러와 한국인 존 킴씨, 그리고 현지인 아우구스토는 오래 기억될 것이다.
내일은 라이스 테라스로 이름난 바나우에(Banaue)로 떠난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