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영국의 한 네티즌이 런던의 한 카페에서 구글 홈페이지를 보고 있다. 구글 돌풍은 유럽에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가 도전장을 던졌다. | | | ⓒ 로이터/연합뉴스 | |
프랑스와 IT는 궁합이 잘 맞지 않는 것일까?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프랑스의 구애는 끊임없이 계속됐지만 일방적인 짝사랑에 그쳐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TGV와 라팔을 자랑하는 기술대국 프랑스지만 인터넷에 관한 한 미국, 한국 등과 비교해 그 위상이 초라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프랑스가 두 손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앞서 오늘날 인터넷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펼친 곳이 프랑스다. '미니텔'이 바로 그것.
1982년 공기업인 프랑스 텔레콤의 주도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집집마다 텍스트 검색이 되는 무료단말기를 보급해 전화번호 검색, 기차표 예약, 날씨 조회 등 간단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했다. 미니텔은 프랑스에서만큼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한 때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이 국내 도입을 고려했을 만큼 당시만 해도 매력적인 기술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이 등장하고 포털의 전성기를 지나 네트워크의 열린 구조에 편승해 큰 성공을 거둔 구글이 인터넷 세계를 평정하는 동안 프랑스는 IT 세계의 변방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지금은 프랑스에서조차 미니텔을 사용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프랑스는 또 미국의 IBM에 대적할 IT기업을 만든다며 '불(Bull)'이라는 회사를 만들기도 했지만, 수십억 유로를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으며, 깐느 인근에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본따 '소피아 앙티폴리스'라는 IT 단지를 조성하기도 했지만 성과는 미지수다.
절치부심 프랑스, 다시 한번 칼 뽑다
 | | | ▲ 프랑스는 범 정부적 차원에서 멀티미디어 검색을 무기로 EU판 구글 개발을 추진중이다. 그리고 '검색엔진 돌풍'을 일으키며 세계 검색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구글. 둘 간의 문화적 패권다툼은 현재로선 불가피할 듯 보인다. | | | | 절치부심하던 프랑스가 다시 한번 칼을 뽑아 들었다. 지난주 연례 국정연설에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구글에 맞설 유럽판 검색엔진 '콰에로(Quaero)'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공동개발 파트너인 독일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모두 배제하고 라틴어에서 찾아낸 이 말(콰에로Quaero)은 "찾다" 는 뜻을 지니고 있다.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있는 프랑스 측은 콰에로가 구글이 갖지 못한 3가지 장점을 갖출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①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컨텐츠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②전문가용 검색기능을 갖추며 ③유럽의 문화 및 역사에 대한 검색능력을 보완한다는 것.
프랑스 측에서는 산업혁신청(AII)과 전자회사 톰슨이 비용을 분담하고 독일에서는 독일정부와 도이치텔레콤 등이 참여하는 이 민관 합작 프로젝트는, 마치 유럽의 에어버스가 미국의 보잉을 밀어내고 민간여객기 부문에서 왕좌를 차지한 것처럼 검색엔진 시장에서도 구글을 밀어내겠다는 포부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내부에서조차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프랑스의 한 블로거는 "프랑스는 이미 훌륭한 검색엔진을 보유하고 있다, 그건 바로 구글 프랑스판"이라며 조롱했고, 프랑스 일간지 <르 카나드>는 "연수익 300억 유로인 마이크로소프트나 시가총액 1천억 유로인 구글에 비추어 볼 때 시라크의 이번 발표로 실리콘밸리가 정말로 공포에 빠질 것"이라며 풍자하기도 했다.
'콰에로 프로젝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구글이 상대적으로 약한 멀티미디어 검색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우겠다고 한 것이다. 구글의 이미지검색은 사진에 붙은 설명을 참고해 작동하는 결국 언어기반 검색이지만, 프랑스의 LTU 테크놀러지 사가 개발한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설명문 없이도 이미지의 형태만으로 원하는 그림을 찾아내겠다는 것. 또 오디오 파일 또한 내부를 읽어내 원하는 검색어가 포함된 파일 역시 찾아내는 획기적인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프랑스 측의 설명이다.
심지어 엄청난 투자비를 쏟아부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야후조차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구글을 과연 멀티미디어 검색이라는 경쟁 우위만으로 콰에로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구글 역시 최근 동영상 서비스를 개시하고 위성사진, 책 검색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두 손을 놓고 있지 않고 있다.
야심은 만만하나.... 잘될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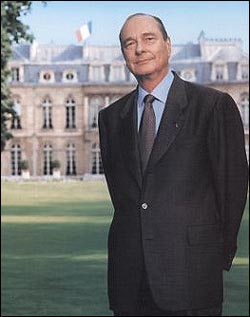 | | | ▲ 콰에로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 | | ⓒ 프랑스 대통령 홈페이지 | 콰에로 프로젝트에 대한 세계 언론의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시선은 대부분 회의적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것이 'IT사업'이라기보다 앵글로색슨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유럽의 '문화영토회복 운동'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콰에로의 한 관계자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역시 미국의 군사프로젝트의 하나로 시작된 것 아니냐"며 프랑스 정부의 개입을 합리화 하고 있다. 또 산업혁신청 설립을 주도한 장 루이 베파는 "미국은 군대를 포함해 여러 정부기구를 통해 R&D에 돈을 대고 있으며 이런 투자가 결국 민간에서 중요한 결실로 나타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독-불 양국은 콰에로가 검색엔진의 에어버스가 되기를 바라지만 B2B 사업인 여객기와 B2C 사업인 검색엔진의 성격은 천양지차다. 여객기를 사는 것은 항공사지 승객이 아니지만 검색엔진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가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유럽은 B2C 사업에서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의 기업에 번번히 패한 전력을 지니고 있다.
콰에로는 우선 라틴어로 된 이름부터가 일반 사용자들이 따라 부르기에는 괴상하고 발음이 너무 어렵다며 조롱을 받고 있다. 성공하는 B2C 사업이 되기에는 첫 걸음부터 어긋나고 있다는 것.
납세자들의 돈에 기대어 앵글로색슨에 빼앗긴 문화패권을 되찾아오겠다는 프랑스의 의도는 '유럽판 CNN'이 되겠다며 야심차게 준비 중인 24시간 뉴스채널 CFII 에서도 드러난다. CFII는 내년 중에 출범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프랑스어와 영어뉴스 방송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유럽판 CNN이 되겠다는 CFII조차 영어방송을 하겠다는 것은 콰에로 프로젝트가 왜 구글을 쉽게 이기지 못할 지 웅변해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다. 구글이 오늘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은 검색기술의 힘도 있지만 무엇보다 웹 상에 존재하는 유용한 컨텐츠의 태반이 바로 영어로 되어있었기 때문.
현존하는 웹 컨텐츠의 약 80% 가량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다. 웹이 풍부해질수록 검색성능 역시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구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주로 유럽의 컨텐츠에 의지해야 할 콰에로가 과연 구글의 상대가 될 수 있을 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프랑스가 정말 고민해야 할 문제는 영어가 더이상 앵글로색슨의 언어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가 발행하는 해외 홍보물이나 웹사이트는 거의 예외 없이 영어로 제일 먼저 만들어진다. 심지어 프랑스 대사관이 배포하는 프랑스 홍보책자 '라벨(Label)'조차도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로 발행된다.
검색엔진의 외피를 쓴 프랑스의 21세기 판 문화전쟁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지 세계의 네티즌과 IT업계가 지금 흥미로운 눈으로 프랑스를 지켜보고 있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