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출신 친일파가 있었다. 깡패를 거쳐 기업인이 되고 친일파로 활약하더니 나중에는 일본 중의원 의원으로 변신했다. 이 비상한 이력의 주인공은 박춘금이다.
서울시청과 광화문광장 중간쯤에 서울시의회 청사가 있다. 이 건물 옆에 비석이 하나 놓여 있다. '부민관 폭파 의거 터'라고 적힌 비석이다. 네이버 지도에서는 '경성 부민관 폭탄 의거지'로 검색된다.

▲ 본문에 소개된 비석. ⓒ 김종성
부민관 폭파 의거
부민관(府民館)은 일제강점기 경성부가 1935년에 건립한 종합 공연시설이다. 훗날 미군정 건물, 국립극장, 국회의사당을 거쳐 1970년대에 시민회관으로 바뀌었다가 세종문화회관 건립 뒤 그 별관이 됐다.
바로 그 부민관에서 발생한 폭탄 의거를 기념하는 비석에 박춘금이 등장한다. "1945년 7월 24일 애국청년 조문기, 류만수, 강윤국이 친일파 박춘금 일당의 친일연설 도중 연단을 폭파했던 사건"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훗날 역사학자 임종국(1929~1989)의 뜻을 계승해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뛰어들 독립투사 조문기(1927~2008)가 부민관에서 박춘금을 처단하려 했던 것이다.
1973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 4면 좌상단 기사는 "해방되기 20여 일 전인 1945년 7월 24일 지금 국회의사당인 경성부민관에서는 일-중-만-조선(-몽골)의 오족협화를 표방한 아시아민족분격대회가 있었다"라며 "이 대회는 몇 달 전에 일본에서 죽은 친일파의 거물 박춘금이 이끄는 대의당(大義黨)이 주최한 친일파들의 발악 경연장이었다"며 부민관 폭파 사건의 배경을 설명한다.
"몇 달 전에 일본에서 죽은"이란 표현은 1945년 당시가 아니라 1973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1973년 3월 31일에 박춘금이 죽은 일을 가리킨다. 위 기사는 조문기 등이 부민관에 진입해 폭탄을 터트린 시각이 "밤 9시 10분께"였다고 말한다. 폭탄은 터졌지만 박춘금은 죽지 않았다. "당초 인명살상에 목적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사는 말한다.
청년 조문기는 이날 박춘금의 목숨을 거두지 않았지만, 조문기가 함께 참여해 만든 <친일인명사전>에는 박춘금의 이름이 들어갔다. 4페이지 분량으로 빽빽하게 친일 이력이 고발되고 역사적 의미의 사형선고가 내려졌으니, 결과적으로 조문기가 박춘금을 처단한 것과 진배없다.
조직폭력배 박춘금
박춘금은 동학혁명 및 청일전쟁 발발 3년 전인 1891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났다. 성장한 곳은 밀양이다. 독립운동가들이 유독 많이 배출된 밀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898년에 태어난 약산 김원봉을 비롯해 이 시기에 출생한 밀양인들이 독립운동에 대거 투신했으니, 어린 시절 박춘금이 거리를 오가며 스쳤던 동년배들 중에 훗날의 독립운동가들도 있었을 수 있다.

▲ 2002년 밀양에 있는 친일파 박춘금 묘 앞에서 송덕비 철거 시위가 벌어졌다. ⓒ 김동탁
박춘금은 14세 때인 1905년에 대구 병영 급사로 취직했다. 이 해는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이 있었던 해다. 훗날 그의 삶을 바꾸게 될 일이 2년 뒤 일어난다. 1907년 8월경 일본으로 가게 된 일이다.
일본에서 처음에는 육체노동에 종사했다. 도쿄에서도 일하고 고베에서도 일했다. 토목 현장, 자동차 공장, 탄광 등을 찾아다녔다. 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직업들에 종사했던 그는 얼마 뒤 땀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쪽으로 인생을 전환한다. <친일인명사전> 제2권은 "이후 폭력배로 성장"했다고 말한다.
박춘금은 폭력과 돈의 상관관계를 활용했다. 폭력배 생활을 하면서 기업 활동에도 뛰어들고 교포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확보했다. "나고야에서 조선인삼 판매업에 종사하다가 1917년 5월 나고야조선인회 회장에 취임했다"고 위 사전은 설명한다. 이 시기의 그는 일본 극우단체인 흑룡회와도 친분을 맺고 있었다.
친일행각의 시작
친일 행각이 본격화된 것은 1919년 3·1운동 이후였다. 그는 일본인들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한국인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했다.
그는 1920년에 한국인 친목단체로 결성한 노동상구회(勞動相救會)와 이를 계승한 상애회(相愛會) 조직을 한·일 양쪽으로 확산시키면서 10만 이상의 회원을 확보했다. 이를 발판으로 전개한 것이 일종의 청부폭력이다. 위 사전은 "조선과 일본을 오가며 반일운동과 농민운동·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고 말한다. 일본 자본과 국가권력의 이익을 위해 조직폭력 활동을 했던 것이다.
상애회의 설립 목표는 '민족적 차별관념 철폐와 일선융화의 철저화'였다. 민족적 차별을 철폐하는 게 아니라 차별 관념을 철폐하는 게 목표였다. 차별받고 있다는 관념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표방했던 것이다. 그런 목표를 내세우며 조폭 활동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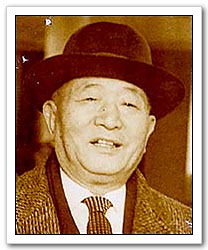
▲ 관동대지진 당시 일제와 함께 조선인 색출에 앞장섰던 박춘금. 일본 중의원까지 지냈으며, ‘대화동맹’에 이어 ‘대의당’이라는 친일 단체를 조직했다. 이광수나 김동환, 주요한 등도 이 단체의 회원이었다.
<김대중 자서전> 제1권은 "내가 자랄 때 하의도는 섬 전체가 일본인의 소작지였다"고 말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1월 6일 전남 무안군 하의면에서 출생한 1924년에 문제의 박춘금이 이 섬을 공격했다.
이곳에서 발생한 하의도 농민운동을 탄압할 목적에서였다 <친일인명사전>은 "같은 해 7월 전라남도 하의도에서 소작쟁의가 발생하자 상애회원들을 동원하여 청년회를 습격"했다면서 "1928년 2월에도 지주인 도쿠다의 요청으로 하의농민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고 설명한다.
그는 일본 지배세력의 하수인이 되어 동족들을 짓밟는 방법으로 살았다. 이것이 그에게는 돈벌이가 됐다. 삶 자체가 친일이고, 가진 것 자체가 친일재산이었던 것이다.
그가 주먹으로만 친일을 한 것은 아니다. 강연 등의 방법도 동원됐다. 강연을 통해 한국인들의 지원병·학도병 가담을 권유하기도 했다. 부민관에서 조문기 등의 폭탄 세례를 받은 것도 '주먹으로 하는 친일'뿐 아니라 '말로 하는 친일'에도 가담한 결과였다.
1943년 11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주최로 부민관에서 거행된 '학병 격려 대강연회'에서는 한국인이 가야 할 길은 오로지 황민화뿐이라며 "4천이나 5천이 죽어 2천 5백만 민중이 잘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또 있겠는가"라며 한국 청년들에게 그 '4천이나 5천' 중 하나가 될 것을 독려했다.
일본 국회의원이 되다
박춘금은 폭력과 돈에 이어 이것들과 권력의 상관관계도 몸소 증명했다. 친일 폭력으로 자산을 축적한 그는 그 돈을 지원병훈련소 등에 기부하는 데도 썼지만, 일본 중의원 선거판에도 적지 않게 뿌렸다. 1932년에는 당선되고 1936년에는 낙선하고 1년 뒤 치러진 1937년 선거에서는 다시 당선되고 5년 만에 치러진 1942년 선거에서는 낙선했다.
2017년 <일본어교육> 제81집에 실린 원지연 전남대 교수의 논문 <근대 일본의 식민지 동화주의의 실패 - 박춘금의 경우>는 박춘금이 도쿄에서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조선과 일본에서 축적한 자산을 포함한 거액을 사용하였다"라고 말한다. 친일 주먹질로 모은 돈을 도쿄 선거판에 뿌려댔던 것이다.
위 논문은 한국인인 그가 도쿄에서 중의원이 된 것은 내선일체 성공 사례를 만들어 홍보하려는 일본 정부의 이해관계, 식민지 조선에서 기반을 잡은 일본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한다. 조선 무대에서 활동하는 일본인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국의회에 반영시키고자 박춘금을 지지했다.
부민관 폭파 의거가 8·15 직전에 있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해방 당시 그는 한국에 있었다. 해방 뒤엔 일본으로 도피했다. 1949년에 국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맥아더 사령관에게 박춘금 송환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후에도 그는 재일동포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이어갔다. 재일본거류민단 중앙본부 고문이 됐다. 민족통일을 위한 활동에도 개입했다. 1955년 6월 조국통일촉진협의회를 조직했다. 한·일 문화교류에도 힘썼다. 1957년, 일한문화협회 상임고문이 됐다. 1973년 3월 31일, 82세 나이로 '그의 조국'에서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