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을 위한 수업>(인터뷰·글 마르쿠스 베른센, 기획·편역 오연호)을 읽은 독자들이 '행복한 배움', '행복한 우리'를 만들어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차례로 연재합니다. 이 글은 독후감 대회 우수상 수상작입니다.[편집자말] |

▲ 나는 세상이 학교, 학원, 집이 전부인줄 알았다. ⓒ pixabay
불과 10년 전, 그러니까 내가 9살 때 나는 세상이 학교, 학원, 집이 전부인줄 알았다. 집에서 등교하고, 하교 후 학원을 간 뒤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학교를 다니기 전인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이어져 왔다.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시키니까, 중학교 때는 다른 아이들도 다니니까, 고 1때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수학 성적이 떨어질까 봐, 안 그러면 엄마랑 멀어질까 봐. 이것이 내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 책 <삶을 위한 수업>을 읽으면서 느꼈다. 나는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의 속도가 아니라 남이 만들어준 속도에 질질 끌려다녔던 것이다.
10년 동안 다닌 학교는 전쟁터이고 교실은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었다. 시험이라는 전쟁에서 서로를 짓밟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1등이라는 핵무기를 만드는 느낌이랄까.
아이러니하게도, 학원에 찌들어있던 중학교 생활 내내 분명 수많은 아이들과 떠들고 친구라는 이름으로 친하게도 지냈지만 참 외로웠다. 서로 웃고 함께 떠들었지만 뒤돌아서는 아까 웃고 함께 놀던 아이를 이기기 위해 새벽잠을 포기하는 그런 아이들도 종종 봤다. 학교라는 공동체 뒤에서 사실은 각자 개인플레이를 하는 중이었다.
고1 딸의 선전포고, 엄마는 '미쳤다'고 말했다
이런 생활에 신물이 났다. 평소처럼 똑같이 학원을 가던 어느 날, 문득 문제집을 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바보 같은 질문이겠지만 정말 궁금했다. 학원 수업 2시간 내내 결국 답을 찾지도, 문제집을 다 풀 수도 없었다. 그냥 내 머릿속에서는 빨리 집에 가서 티비 틀고 아이돌 무대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나는 부모님께 선전포고를 했다.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순간 엄마는 나보고 '미쳤냐'고 그랬다. 수능이 2년 남았고 내신관리도 해야 하는데,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투였다. 4남매 중 첫째이고 똑똑하고 착했던 큰딸이 뒤늦게 하는 반항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학원을 다녀서 수학을 잘하고 싶지도, 1등을 하고 싶지도, 좋은 대학교에 가서 성공을 하는 그런 삶을 원하지도, 하고 싶지도 않았다. 결국 첫 반항의 승자는 그 누구도 아니였다.
학원을 그만두니 성적은 당연히 떨어졌다.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 보는 대로 즉, 나의 관점이나 방법은 하나도 없이 남이 만들어낸 방식과 플랜대로 공부했으니까. 책에서 언급된 앵무새 시험을 무려 10년이나 했는데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당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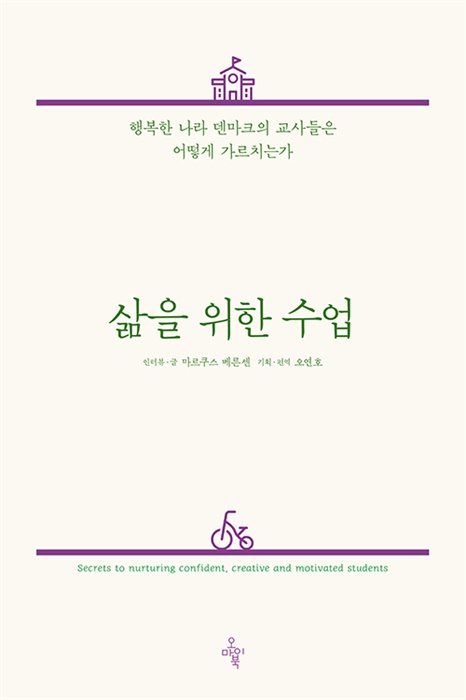
▲ '삶을 위한 수업' 책 표지, 마르쿠스 베른센 (지은이),오연호 (편역) ⓒ 오마이북
펜을 내려놓으니 보이기 시작한 것들
성적은 좋지 않지만 더 이상 외롭지는 않았다. 펜을 잠시 내려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눈에는 수학이나 영어 문제가 아닌 아이들이 들어왔다. 반 아이들이 무얼 좋아하고 무얼 싫어하는지 알게 되었다. 또한 내가 무얼 좋아하고 무얼 싫어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중학교때 내가 외로움을 탔던 건 어쩌면 나 스스로에 대해 몰랐기에 그랬던 게 아닐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날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
작년 11월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문득 가슴 설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 길로 서울에 있는 직업전문학교 항공보안과에 고2 예비 선발 전형으로 원서를 넣었고 올해 4월 합격했다. 내가 합격할 수 있던 것은 이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면접관에게 내 얘기를 내 스스로 전달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삶을 위한 수업>을 읽으면서 덴마크 아이들은 중학교를 졸업한 뒤 안식년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나도 올해 4월부터 안식년을 가지고 있다. 학교에서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도 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그 자체가 내 삶을 활력 있게 해 주었다.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다는 게 아직도 가끔 믿기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속도로 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행복 그 자체다. 이것이 진정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