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편집부로 걸려오는 전화 가운데 가장 '뜨거운' 내용은 뭘까요? 바로 "편집 원칙이 뭐죠?"라는 질문입니다. 창간 10여년 동안 시민기자와 편집기자 사이에서 오간 편집에 대한 원칙을 연재 '땀나는 편집'을 통해 시민기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
"요즘 기사가 좀 는 것 같지?""선배…. 00 대학교 숙제 기간이래요. 아흑. 덕분에 생나무 클리닉도 폭주하고 있어요."모르시겠지만 편집부가 기사편집을 하는 작업창에는 오마이뉴스에 처음 기사를 쓴 것임을 알려주는 표시가 뜹니다. 영문 NEW를 줄인 ⓝ 코드가 그것인데요. 이 표시가 뜨면 '아~ 새로운 기자가 등장했구나' 싶은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그 반가운 기자들이 대거 늘었습니다. 그것도 보기 드문 20대 혈기왕성한 기자들이죠. 왜냐고요? 아흑, 과제때문입니다. "과제라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게 그 연유를 물을 법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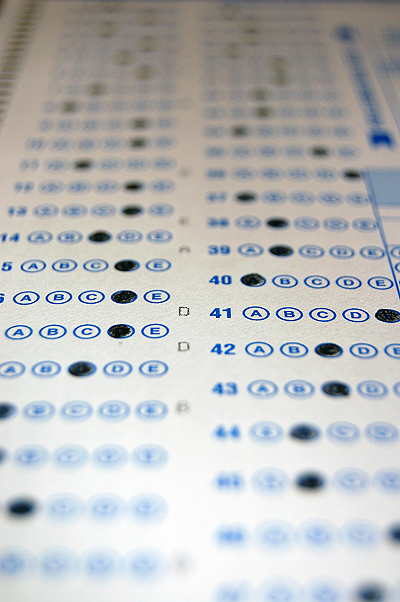
|
| ▲ 피같은 학점을 따기 위해 학생들은 너도나도 시민기자가 되어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뭘' 쓴다? 그들의 고민과 함께 편집부의 즐거운 비명도 시작됩니다. |
| ⓒ sxc |
관련사진보기 |
특별대학 별별학과 나면밀 교수님은 이번 학기 '시민참여저널리즘'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얼마나 잘 들었나 평가도 해볼 겸, 학생들에게 과제를 냅니다.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써볼 것'. 기사를 쓰면 학점을 준다는 조건을 달고요. 피같은 학점을 따기 위해 학생들은 너도나도 시민기자가 되어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뭘' 쓴다? 그들의 고민과 함께 편집부의 즐거운 비명도 시작됩니다.
"아, 이 학생은 기존 매체 보도를 복사해서 기사로 보냈어요.""포털 매체에 검색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기사로는 약해요.""자기가 경험한 걸 쓰지 않고 모르는 내용을 쓰려다보니, 기사가 안 되는데….""분명 뭔가 공부한 걸 토대로 기사로 훈련(?)·실습하는 것일텐데, 학생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 기사는 언제 적 일인지도 모르는 걸 기사로 썼네요.""이 주장성 기사는 근거가 너무 없네요."교수님들과 사전 교감도 없이 기사 폭탄을 맞은 편집부는 대략 난감한 상황에 놓입니다. 우리 손에 아이들 학점이 달려있다니요. 누가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꽤 신경이 쓰입니다. 새싹을 돌보는 심정이랄까요? 게다가 잉걸을 향한 학생들의 집념은 어찌나 강한지요. 생나무 클리닉 두 번 의뢰는 일도 아닙니다.
'반짝' 빛나는 대학생 시민기자들의 기사를 기다립니다
큰사진보기

|
| ▲ <오마이뉴스>도 '찾아가는 글쓰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행동 지침을 내리기 전에 불러주세요. 편집부의 '준비된 강사들'이 출동해 기사쓰기 요령 및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 ⓒ 오마이뉴스 |
관련사진보기 |
'가을이 되면 왜 우울해질까'라는 주제로 첫 기사를 쓴 김유정 시민기자. 호르몬 분비때문이라는 이유를 인터넷 검색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썼습니다만, 문장 그대로 그냥 '검색 내용'이었습니다. 생나무 클리닉을 의뢰했기에 이유를 말해주고, 본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써보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본문에서 '나는 왜 가을이 되면 우울해질까'로 살짝 바꾸었더군요. 다시 생나무 처리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기사를 써야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화를 걸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혹시 아르바이트 한 적 없나요?" 물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아이들 옷을 판매한 적이 있다고 하길래, 그런 이야기가 훨씬 재밌을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실제 들어온 이야기는
'한 달 만에 그만 둔 나의 빵집 알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으로 용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알바를 통해, 부모님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빵집에서의 일을 구체적으로 풀어 써 준 점이 좋았습니다. 본인도 잘 모르는 막연한 이야기보다는 이렇듯 직접 경험한 일을 기사로 쓰는 것이 훨씬 읽기 좋더라구요.
김유정 기자뿐만 아닙니다. 4전 5기. 고시공부도 아닌데 잉걸로 채택됐을 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흥분의 목소리는…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쫌' 귀엽습니다(대학 졸업한 지 언 12년, 결코 제가 나이가 들어서는 아닐 겁니다). 어떻게든 기사로 만들어보려는 양쪽의 힘들었던 기억이 훌훌 털릴 만큼요.
취재부에서 편집부로 온 지 얼마 안 되는 신참 ㅎㅎㅈ 기자도 여러 차례 보완을 요청하는 와중에 한 대학생으로부터 수줍고 예의바른 목소리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해요"라는 말을 들어 뿌듯했다는데요. 사실 이 맛에 편집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새싹들이 '반짝' 등장하고 마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갖고 기사를 쓴다면, 20대들의 많은 고민들을 <오마이뉴스>에서도 자주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바람으로 오늘도 많은 학생들의 '새로운' 기사를 검토합니다. 그 속에 어떤 뉴스가 있을지 궁금해하면서요.
그리고 전국 각지의 신문방송학과 교수님들께 한 마디. 우선, <오마이뉴스>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기사쓰기라는 행동 지침을 학생들에게 내려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어찌보면 <오마이뉴스>가 먼저 나서서 해야할 일인데 말이죠. 그런데 사실 <오마이뉴스>도 '찾아가는 글쓰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행동 지침을 내리기 전에 불러주세요. 편집부의 '준비된 강사들'이 출동해 기사쓰기 요령 및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 문의 :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전략부 02-733-5505(내선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