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한국인지 베트남인지"… 순살 아파트는 누가 짓나
[아파트 철근공 잠입취재①]
목수는 중국, 비계는 몽골, 잡부는 카자흐스탄… 여긴 어디?

"저요? 안 되는데요."
"참나, 여기가 한국인지 베트남인지. 쉿! 쉿! 그냥 시작할게요. 오늘 신입 대부분 철근 직종이니까, 기초 철근 작업하실 때 상부에 깔판 안 깔려있으면 작업하지 마십쇼. 아셨죠? 그리고 사다리 밟고 작업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다 다치면 다 개인 책임인 거예요. 난 분명히 말했어요! 제 말 못 알아먹으면 어쩔 수 없고! 알아듣는 분들은 안전하게 작업하시고요."
9월 1일 오전 7시 대전광역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신입 노동자 30여 명이 현장 내부 함바집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컨테이너로 된 안전교육장에 모여 앉았다. 원청 건설사 A건설에서 나온 중년의 남자 직원은 온통 베트남어로 시끄러운 안전교육장에서 홀로 한국말을 외치고 있었다.
이날 신입 중 철근공은 총 25명. 하지만 그의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나뿐이었다. 나머지 24명은 모두 앳된 얼굴을 한 베트남 노동자들이었다.

현장에 처음 출근하는 모든 노동자는 시공사에서 1회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요식행위 같던 그날의 안전교육은 15분도 안돼 끝났다.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베트남 철근공들은 엎드려 자거나 핸드폰 게임을 했다. 안전교육으로 배정된 한 시간 중 나머지는 모두 현장 출입용 안면인식 등록, 안전모에 붙일 이름표 출력, '안전사항 의무이행 각서'와 '신규채용 안전보건교육 확인서' 따위의 서류에 사인을 하는 데 소모됐다.
나를 비롯해 베트남 노동자들 앞에 놓인 각서와 서류는 한글로만 돼있었다. 종이 뭉치를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던 베트남 노동자들 대신 서명을 하기 시작한 건 A건설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 B사의 직원이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베트남 사람들을 다그치며 각자의 이름을 발음하게 했고, 들리는 대로 음차해 종이에 옮겼다. 과연 저 이름이 맞는 걸까 의문이 들 정도로 빠르고 주먹구구였다. 수안OO, 잔OO, 진반OO, 바O, 후오OO, 탄닫OO, 디엡OO, 반OO, 딘반OO, 팜공OO, 판타OO, 웬디OO, 팜반OO, 반투OO, 웬OO…
이름에 이어 나이를 묻는 질문에 베트남 철근공 대부분이 20대 초반이라고 답했다. 그들이 반강제로 서명한 각서엔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고…', '출퇴근시의 사고는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등 문제적인 문구들이 빼곡했다.


등록 절차가 끝나자 신입 노동자들은 각 작업장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현장은 전체 11개 동 1700세대 규모였다. 공사장 주 출입구에서 반대쪽 펜스까지 걸어가는 데 10분쯤 걸리는 크기. 원청 시공사인 A건설은 2023년 국토부가 공시한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 안에 드는 회사였다. A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 B사는 상시 직원 10여 명 규모로 2022년 기준 매출액 790억 원의 업체였다. 철근공들이 근로계약을 맺는 건 B사였다.
나는 B사에서 나온 안전관리자를 따라 내국인팀이 일하는 8동 쪽으로 갔다. B사는 이 아파트 11개 동 중 절반인 5개 동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았다. 나머지 6개 동은 B사가 아닌 또 다른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가 도급을 받는다고 했다. 같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라도 이렇게 현장을 반으로 쪼개 두 업체에 도급을 나눠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도급 업체끼리 암묵적인 경쟁을 유도해 공사를 빠르게 하려는 원청의 의도였다.
매일 작업량에 따라 들쭉날쭉하긴 했지만, B사에 속한 철근공은 대략 60여 명이었다. 이중 한국인은 내가 속한 팀 18명이 전부였다. 그외 40~50명이 모두 베트남 철근공들로, 전체 70% 이상을 차지했다. '순살 아파트' 사태의 시발점이 된 GS건설 검단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역시 당시 철근공 대부분이 베트남 출신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국팀과 베트남팀은 대개 다른 동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일하는 중엔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공사장 어딜 가도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많았다. 다섯 칸짜리 간이 컨테이너 화장실에서도, 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줄을 섰을 때도 한국말보다 베트남어가 더 많이 들렸다. 퇴근 시간인 오후 5시가 되면 공사장 입구 앞에서 미리 진을 치고 있던 12인승 승합차 대여섯 대가 베트남 청년들을 단체로 태워 떠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철근 작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면대로 철근을 배치하는 일이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철근을 가져다 세우고 눕히고 교차시키고 조립해 건물의 벽, 기둥, 바닥, 보 등의 뼈대를 만든다. 최대 길이 8m에 이르는 두께 10mm, 13mm, 16mm, 19mm, 22mm, 25mm 철근들을 쉴새 없이 나르고, 크기가 맞지 않을 땐 '절단기'라는 기계로 즉석에서 철근을 잘라낸다.
구조물이 튼튼하게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가로·세로·수직·수평 철근 사이에 C자, U자, 직사각형 모양을 한 보강근을 끼운다. 무거운 철근이 허공에 가만히 떠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근들이 만나는 지점마다 350mm, 450mm 길이의 '철근용 결속선'이라는 철사를 단단히 묶어준다. 철근이 도면대로 제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작업인데, 이를 '결속'이라고 한다.
이때 '깔꾸리'라고 불리는 갈고리 형태의 철근 결속기를 사용한다. 철사를 반으로 접어 구멍을 만든 다음, 깔꾸리 끝을 그 구멍에 안에 넣고 철근과 함께 감아 돌려서 매듭을 짓는다. 깔꾸리는 철근공을 상징하는 연장이었다. 고참들은 "철사로 결속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톤 하중을 견딘다"고들 했다.
신입인 내겐 철근 옮기는 일부터 떨어졌다. 현장에선 '철근을 멘다'고 했다. 철근을 어깨에 멘 상태로 이동하기 때문에 생긴 표현 같았다. 길이 5m짜리 두께 22mm 철근 한 개의 무게가 15kg, 7m가 넘는 25mm 철근 한 개의 무게는 28kg나 됐다. 2인 1조로 네다섯 개씩 철근을 멜 때면 앞사람 속도에 맞춰 제대로 허리를 펴는 것조차 벅찼다. 더욱이 바닥 공사를 할 땐 평평한 땅도 아닌 공중에 뜬 철근들 위를 밟고 균형을 잡아가며 무겁고 긴 철근을 옮겨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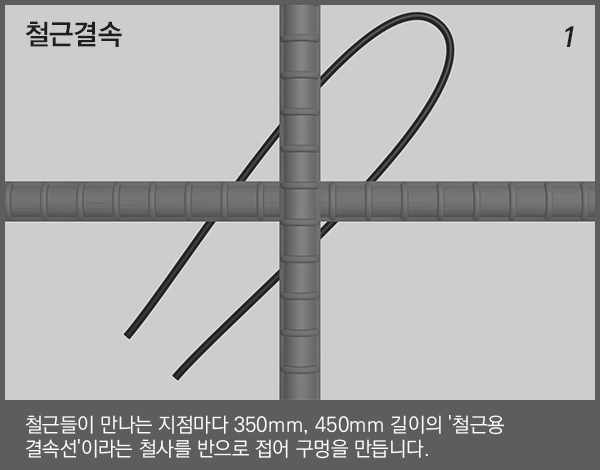

작업 시간에 겨우 허리를 펴고 쉴 수 있는 건 두 시간에 한 번, 7분 정도 주어지는 참 시간이었다. 중국 선양 출신 동포 2세로 15년 전 한국에 귀화해 계속 철근 일을 했다는 윤씨(48)가 건너편 동을 내다보며 땀을 닦았다. 32도를 넘는 땡볕에 베트남 노동자들이 일렬로 쭈그려 앉아 철근을 엮고 있었다. 한국인 철근공들은 베트남 철근공을 '베트콩'이라고 자주 불렀다.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는 듯했다.
윤씨 등에 따르면 철근 직종에 베트남인들이 급증한 건 최근 몇 년 사이라고 했다. 5~6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라면 중국인이 대다수였지만 세월이 지나 중국인들의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인들과 단가 차이가 거의 사라지게 됐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게 젊고 싼 베트남 노동자들이었다. 대전 현장의 내국인 일당은 26만 원이었는데, 오가며 물은 베트남 노동자들의 일당은 15만~20만 원이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베트남 국적의 '체류 외국인'은 23만 명, '불법체류 외국인'은 7만 8천 명에 이른다. 체류 외국인은 중국(85만 명)보다 크게 적은 숫자지만, 불법체류 외국인은 중국(6만 3천 명)보다도 많다.
외국인 초과 현상은 비단 철근 직종만의 얘기는 아니었다. 아파트 공사 순서상 철근 작업이 끝나면 바깥에 거푸집을 댄다. 철근 위로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도록 합판 따위로 철근 주위를 감싸며 틀을 짜는 작업이다. 이 일을 하는 직종이 '형틀목수'인데, 우리팀이 8동 지하층 옹벽 작업을 끝내자 투입된 형틀목수 열댓 명 중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다만 베트남인 일색인 철근공과 달리 형틀목수 국적은 다양한 편이었다. 가장 높은 비율인 중국인이 열 명 정도면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노동자가 서너 명 끼어있었다. 인도 사람도 딱 한 명 있었는데 한국에서 일한 지 7년째라고 했다.
현장 정리나 폐기물 처리 등을 하는 '잡부' 중에도 중국인은 많았지만 한국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간간이 키가 큰 중앙아시아 출신 잡부들도 눈에 띄었다.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맨 먼저 가설 발판과 계단을 놓는 '시스템비계' 직종엔 유독 등 넓은 몽골인들이 많았다. 외국인이 다수라는 점은 다 같았지만, 직종별로 출신 국가들이 어느 정도 나눠져 있는 셈이었다.

팀 내 최고참으로 철근공 경력 50년이라는 이씨(70)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을 이었다. 일이 끊낄까 자주 걱정하던 이씨는 여기도 그나마 공사 초기 지하주차장 작업 중이라 내국인 일자리가 있는 거라고 했다. 지하층 철근 공사는 보통 6~7개월이면 끝나는데, 그 이후 진행되는 지상층 공사에선 지금 있는 내국인팀들이 모두 빠진다는 거였다. 실제 입주자들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지상층 주거동은 사실상 베트남 철근공들이 모두 짓는다는 얘기였다.
지상층과 지하층이 다른 이유는 철근 업체들이 철근의 양을 기준으로 도급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지하층 주차장은 건물의 기초에 해당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철근도 굵고 톤수도 많아 도급비가 높다. 더욱이 지하층은 바닥 지형이 제 각각이라 동별·층별 구조가 모두 달랐고 시공도 복잡했다. 일당은 비싸지만 경험 많은 한국인들을 사용할 유인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반면, 지상의 주거동은 1층이든 30층이든 구조가 다 똑같아 작업이 단순 반복된다. 또 건물 구조상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철근의 두께도 얇아지고 무게도 가벼워지기 때문에 도급비가 낮았다. 결국 돈의 양도 적고 고숙련 노동자를 쓸 유인도 적으니 일당이 싸고 젊은 베트남팀으로 모두 채워진다.

지하층 바닥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점심 시간에 서둘러 식당으로 향하는데 다니던 길목이 사라지고 없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맨바닥이던 곳에 어느새 철근이 놓이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치고 있었다. 기초 바닥 타설 작업이었다.
옆으로 가자니 육중한 펌프카의 길고 빨간 붐대가 콘크리트를 쏟아내고 있었다. 뒤로도 수십 대의 레미콘 차량들이 대형 믹서기를 돌리며 줄지어있었다. 타설 중인 곳을 가로질러 갈 수밖에 없었다. 아직 콘크리트를 붓지 않은 쪽 철근 위를 조심조심 밟으며 걸음을 옮기던 중이었다.

철근 위에선 제대로 서있기조차 힘들었는데 팀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이씨(66)는 뒷짐을 지고도 철근 위를 통통 뛰어다녔다. 30년 이상 경력인 그는 "타설은 위험 작업인데 이동 통로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냐"면서 관리자들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큰소리로 욕을 해댔다. 그는 발 밑 철근 결속 상태를 보고 또 한번 혀를 찼다. 베트남 철근팀이 공사한 구간이었다. 결속이 4분의 1도 안돼 있다는 거였다.
깔꾸리를 사용한다 해도 결속은 결국 수작업이다. 결속을 건너뛸수록 배근 속도가 빨라지고 물량은 나오지만, 콘크리트를 붓거나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철근이 제자리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인지 그날 밟고 지나가야 했던 바닥 철근들은 발바닥이 닿을 때마다 침대 매트처럼 푹푹 아래로 꺼졌다.
그러나 위에 콘크리트를 한번 붓고 나면, 속에 철근이 어떻게 돼있는지는 알 수 없게 된다.
나는 이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후에 알고 보니 '데나우시'는 시공이 잘못돼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을 일컫는 현장의 은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