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칠기삼(運七技三)'이란 말이 있습니다. 단순 풀이하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운이 7할 재주가 3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의역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운에 강조점을 찍으면, 아무리 노력한들 어차피 운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결과로 끝맺음 된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애쓸 필요가 없는 세상처럼 여겨지고, 나아가 자기 일에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나 자신의 기량이 고작 이만큼 밖에 되지 않는구나 싶어 낙심하다, 자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후회를 남기지 않을 만큼 진심을 다하되, 내 모든 기운을 다 쏟았으니 더는 미련이 없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억울한 감정이 덜 생깁니다. 또 때마침 운이 따라주면 감사한 마음마저 듭니다. 그러니 매사 '기칠운삼'이란 생각으로 내 앞의 일을 대하는 편이 이롭습니다. 뜻밖의 행운도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니까요.
복권 당첨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희박한 확률일 뿐, 아예 불가능한 일만도 아니지요. 그런데 더러 복권을 사지도 않았으면서 1등에 당첨되면 참 좋겠다고 헛된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걸어보려면, 구입한 이후여야 마땅합니다. 간혹 애쓰지 않았는데도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날이 있지만, 그런 운수 좋은 날이 언제까지 반복될 리 없습니다.
3년 전 겨울 오마이뉴스에 첫 글을 써보냈습니다. 다소 말랑말랑한 내 글이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오마이뉴스의 모토를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사라기보단 만년필을 화두로 한 수필에 가깝고, 또 기사문 작성 시 통상 쓰이는 평어체가 아닌 경어체로 된 글이어서 조심스러웠습니다(관련 기사: 제 만년필 좀 살려주시겠습니까? https://omn.kr/1rdmw ). 그런데 송고 후 며칠 뒤, 편집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운칠기삼보다는 '기칠운삼'... "기자님의 글은 여운이 있어요"

▲ 2019년 12월 24일, 오마이뉴스에 처음 송고했던 글에 나온 파카75 스털링 실버 만년필 ⓒ 김덕래
"저는 기자님의 글이 참 반가웠어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 기자들도 비슷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꼭 시의성이 강조된 글만 기사로 분류하진 않아요. 그에 못지않게 다양성도 가치 있는 기사의 요건 중 하나라 생각해요. 기자님의 글은 편하게 잘 읽히면서도, 읽은 후에 남는 여운이 있어요. 시의성만 강조된 글은 자칫 읽는 재미가 덜할 수 있는데, 기자님 글엔 온기가 있어 뒷맛이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기자님만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어 한 편 한 편 이어가게 되었고, 그러다 제 이름을 단 연재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필기구 유통회사인 펜샵코리아에서 차장으로 근무했었는데, 국내외에서 펜수리를 의뢰해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만년필 관련 강연 요청이 들어오는데다, 당신의 글을 책으로 엮어보자는 출판사가 몇 생겨 부득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매년 연봉협상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은 대우를 해주던 회사를 그만두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펜수리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면, 글쓰기는 30년 넘게 미뤄온 제 오랜 꿈이었어요. 그렇게 오마이뉴스에 3년간 연재해온 33편의 글을 엮어, 지난해 12월 책 <제 만년필 좀 살려주시겠습니까?>을 냈습니다(관련 기사: 김덕래의 만년필 이야기 https://omn.kr/1pu5t ).
오마이뉴스와의 인연이 아니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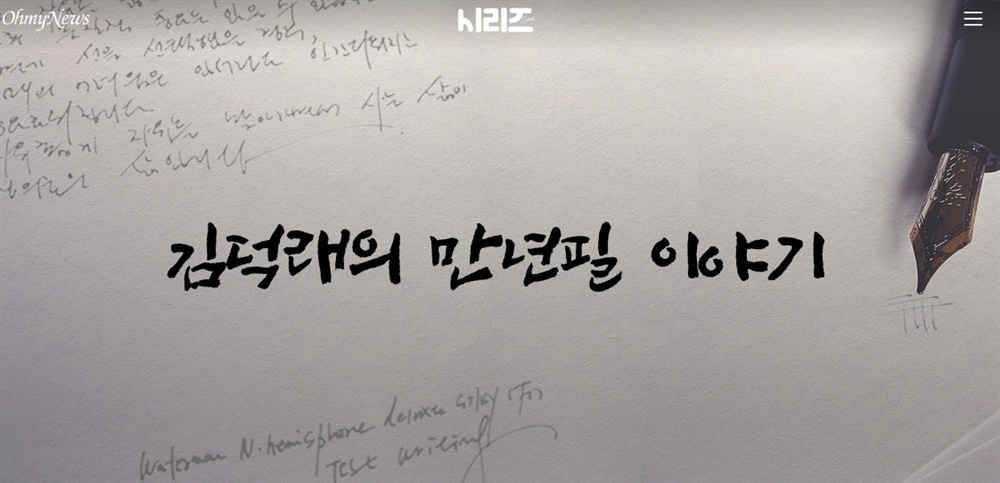
▲ 3년여 전에 긴가민가하며 오마이뉴스에 보낸 글 한편이 연재로 이어졌습니다. '김덕래의 만년필 이야기' 연재 화면 갈무리(https://omn.kr/1pu5t). ⓒ 화면갈무리
제가 처음 써보냈던 글에 오마이뉴스가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저는 아직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겠지요. 회사에서 맡은 업무에 나름의 보람을 느끼며 평온하게 지냈을 겁니다. 저는 기꺼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오마이뉴스가 참 고맙습니다.
여전히 좋은 관계인 펜샵코리아가 나를 이만큼 키운 옥토라면, 오마이뉴스는 훨훨 날수 있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오마이뉴스 연재를 계기로 '섬마을인생학교 프로그램'에도 두 차례 교사로 참여할 수 있었어요. '섬에서의 디지털 디톡스'라는 주제로 참여자들과 함께했던 도초도에서의 2박 3일은 두고두고 못 잊을 추억입니다.

▲ 시필용 만년필을 가져가 손편지 쓰는 시간을 가졌던 섬마을인생학교 프로그램 ⓒ 김덕래
60여 명의 도초고 학생들과 함께한 수학여행은 또 어땠고요. 한번 시작한 강연은 다음, 또 그다음 강연으로 이어졌습니다. 디지털 시대와 맞지 않을 것만 같은 만년필이란 도구가, '노모포비아('No Mobile Phone Phobia'의 줄임말, 휴대폰 중독현상)'를 이겨내는 수단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묘한 쾌감이 들기도 합니다. 만년필 수리가 업이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만년필을 늘 만나게 됩니다. 몸은 한 평 공간 작업실에 있지만, 마음은 만년필이란 매개체를 통해 늘 세계여행 중입니다.
출간 이후, 일상이 더 드라마틱해졌습니다. 유수 일간지에 서평이 실린 것을 시작으로, 지상파 아침뉴스에 제 책과 작업실이 소개되더니, 몇몇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와 놀랐어요. 기업체 사외보 제작팀에서 칼럼 요청이 들어오고, 이른 봄 북토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모 독서학교 연수 강사 제의도 있어 시간을 더 잘게 쪼개어 쓰는 요즘입니다.
'지인이 권해줘 당신 책을 봤다'는 사람. '날로 첨단화 되어가는 세상에서, 아직도 만년필 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고, 또 그걸 고치는 당신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게 참 흥미롭다'는 이야기. 제가 작업실에서 펜을 매만지고 그걸 글로 풀어내는 일상을 영상에 담고, 세계 각국의 유명 제조사들을 직접 찾아가 실제 만년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탐방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보자는 감독님도 있어 설레는 나날입니다.
그렇다보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정대로 진행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이맘때쯤 만년필과 관련된 영상물 한 편이 만들어질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생겨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것 뿐이에요.
작은 일은 귀한 일의 시작점... 보다 많은 시민이 기자 되는 세상을 꿈꾸며

▲ 안방 드레스룸을 활용한 한 평짜리 작업실, 나만의 퀘렌시아 ⓒ 김덕래
시간 그 자체가 돈으로 환산되는 세상입니다. 시간을 들인 만큼의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가치 없는 행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이 아날로그인데, 오직 빠름 그 자체가 정답일 수는 없겠지요.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지도 열등하지도 않으니, 둘의 장점만을 취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그 둘을 융화시키는 도구 중 하나로 만년필이 쓰일 수 있다는 건, 참 짜릿한 즐거움입니다.
작은 일은 하찮은 일의 전부가 아니라 귀한 일의 시작점이며, 공을 들이면 빛이 나기 마련이고, 그 빛이 점점 커지면 나를 감싸는 보호막이 된다는 말을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참이었습니다. 3년 전 오마이뉴스에 두어 장 내외의 짧은 글 한 편을 써보냈던 것이, 마치 눈송이가 구르고 굴러 큼지막한 눈덩이가 된 것처럼 커졌습니다.
고장난 만년필 손보는 일을 하다 보니 남들이 '펜닥터'라 부릅니다만, 저는 만년필 수리공이란 말이 더 정겹습니다. 어쩐지 아날로그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것만 같아, 나름의 소명감이 들기도 합니다. 긴 호흡으로, 내가 가치있게 생각하는 일에 정진하려 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글 써보낸 3년 전의 나를 칭찬합니다. 또 내민 손잡아 주는 걸 넘어, 힘있게 끌어당겨준 그때의 오마이뉴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격려와 응원만큼 사람을 기운 나게 하는 영약이 또 있으려고요. 이왕 길 위에 올라선 셈이니, 기세 좋게 뻗은 펜촉처럼 앞으로 나아가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23주년을 넘어 50주년 100주년에 다다르기까지, 보다 많은 시민들이 기자가 되는 세상을 같이 꿈꿔봅니다.

▲ 힘있게 뻗은 몽블랑 마이스터스튁 144 M촉 ⓒ 김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