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목까지 숨이 탁 막힙니다. 김보일의 <황혼은 어디서 그렇게 아름다운 상처를 얻어 오는가>를 읽는 내내 그랬습니다. 어디서 이런 곱살스럽고 감칠맛 나는 글 솜씨가 나오는 걸까, 아니 별것도 아닌 이야기 같은데 이리 웃게 만들어도 되는 거야,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가며 그의 글 놀림에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글 쫌 쓴다고요? 그 앞에는 명함도 못 내밀겠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뒤를 돌아보니 아뿔싸, 보자기에서 풀려난 어머니의 부라자(맞춤법 무시, 아래에도 그의 표현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가 저만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가던 길을 되돌려 떨어진 부라자를 줍고 보니 예닐곱 발자국 뒤에 이번엔 어머니의 빤스가 떨어져 있었다. 그 빤스를 줍고 보니 저쪽에 또 하나의 빤스가 떨어져 있었다. 가던 길을 되돌려 빤스를 챙겨 바짝 고개를 수그리고 술집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짙은 화장을 한 작부들이 내 모습을 보며 요란하게 웃어대는 것이었다. 아, 구겨질 대로 구겨진 내 스무 살의 붉은 뺨이여." - 24,25쪽
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의 옷을 챙겨가다 생긴 불상사를 이리 맛깔스럽게 늘어놓습니다. 더 재밌는 건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려주었더니, "이런 덜 떨어진 놈 같으니라구" 하시다가 방구를 풍풍풍 뀌고는 방구소리에 더 크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어머니가 하늘 한구석을 풍풍풍 쿠릿쿠릿하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글을 이리 마무리합니다.
"어머니, 저승은 청정 구역이라구욧..... 어머니, 그곳에서도 풍풍풍 잘 계시죠?"
추억이 유머가 된다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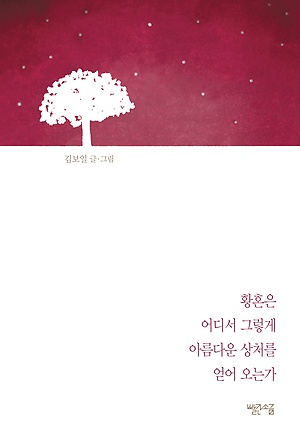
|
| ▲ <황혼은 어디서 그렇게 아름다운 상처를 얻어 오는가> (김보일 글·그림 | 빨간소금 펴냄 | 2017. 10 | 311쪽 | 1만3000 원) |
| ⓒ 빨간소금 |
관련사진보기 |
이처럼 책은 저자의 옛 경험을 이야기 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에 '황혼'이란 단어를 넣은 것이겠지요. 황혼까지 걸어 온 일생이 상처이긴 하지만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저자의 매무새 좋은 글과 그림으로 옛 이야기가 승화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60세 넘은 제 또래의 사람들이 읽으며 추억에 젖을 만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저자는 '보일샘의 포스트카드'라는 이름으로 2016년부터 직접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 <머니투데이>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문학, 철학, 그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권의 책을 낸 작가입니다. 유명 인사죠. 그런 그가 이 책에서 황혼녘에 창가에 앉아 지나 온 상처들을 아름다운 그림을 곁들여 맛있는 글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손때 묻은 물건들, 특히 나무와 동물 등에 대한 고찰이 눈부실 정도입니다. 연필에 대한 글을 읽으며 연필을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인 저도 참 많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책 읽기와 서평 쓰기에 연필을 애용한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관련 기사 :
'서평 쓰는 기자'의 독서법을 공개합니다). 저자는 연필(낙타표)을 '아름다운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후박나무의 여름이 느릿느릿 걸어 칠월의 문턱에 닿던, 낙타표 문화연필의 시절, 연필심 하나 부러져 가슴의 지붕이 내려앉았다. (중략) 부러진 연필은 연필이 아니다. 연필은 나무의 겨드랑이를 거쳐 손목에서 뻗어나간 손끝이고 구름의 눈가에 우겨진 눈썹이고 오월의 가슴에서 뻗어나간 두 개의 지붕이고 너에게서 나에게로 오는 천 개의 유리창이다. (중략) 연필이란 이름을 빌어 내게 온 어떤 짐승의 아름다운 얼굴이고 죽음이다. 낙타들의 비명소리가 그곳에서 들렸다면, 네가 부러진 연필의 이름이다." - 71,72쪽
부러진 연필을 아쉬워하는 장탄식치고는 너무 짠하지 않습니까. 연필이 부러지면 낙타 한 마리가 죽음을 맞네요. 그래요. 낙타표 문화연필의 시대가 있었죠. 글에서 연필에 대한 진한 사랑과 그때 그 시절에 대한 아릿한 향수가 그대로 읽힙니다.
"나무에 기대어 잠드는 것은 아주 오래된 지구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로 시작하는 '나무들의 시간'이란 글은 실존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입니다. 저자는 나무가 뿌리를 두고 몇 백 년이란 시간을 "그냥 견디고 막무가내로 살아낸다"고 말합니다. 쓰다달다 말 한 마디 없이, 우비도 양산도 없이, 적막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에 기댄다는 것이 바로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림과 글이 철학이 된다저자의 표현인 '과묵한 나무들의 똘기'와는 대조적인 인생의 경망함이란. 생각이 여기 미치면 쥐구멍이라도 찾게 만듭니다. 그의 글은 이렇게 우리네를 다그칩니다. 때론 추억이 유머가 되고, 때론 지난 기억들의 파편이 인생론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김보일에게선 그림이 되고 시가 되고 언어가 되어 철학으로 피어납니다.
저자의 글은 쉽게 웃으며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속에 가시를 품은 것 같아서 혹시 라이너 마리아 릴케처럼 되지나 않을까 혼자 조바심을 해 봅니다. 물론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장미 가시에 찔려 패혈증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사실(백혈병으로 죽음)과 다르지만 말입니다. 장미의 화려함 속에 숨은 가시, 화려하고 감칠맛 나는 글 속에 숨은 일침이 알알이 배어 있습니다.
"나무들은 밤에도 고단하게 팔을 벌려 제 겨드랑이에 어둠을 스미게 하고, 결국은 자신을 뿌리까지 게워내며 검은 숲의 연대를 이룬다. 밤의 숲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사랑의 풍경이다. 지워져가며 하나 되는 서러운 몸뚱이들의 연대다. 주둥이가 작은 새들이 새벽의 숲에서 나와 제 어미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죽은 새들은 나무들의 뿌리로 내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감으로 태어날 것이다." - 105,106쪽
숙명일까요. 나무가 내어주는 주검이 결국 죽은 새의 죽음으로 가고, 이후에 그 주검은 물감으로 태어나 다시 나무를 그리겠지요. 저자가 순환의 철학을 담고자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자는 글과 그림으로 엮은 이 멋들어진 인생의 회고를 통하여 다른 인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는 데 성공한 듯 보입니다.
큰사진보기

|
| ▲ 구석의 고양이 구석이란 말보다 착한 단어도 드물다.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는 부유하는 먼지들이 피곤한 몸을 안착할 수 있는 곳, ... 내면으로 스며들 수 있는 곳이 구석이다. |
| ⓒ 빨간소금 |
관련사진보기 |
저자의 '구석'에 대한 사고가 가히 천재적입니다. '모서리, 모퉁이'에 오도카니 앉아 쉬는 고양이를 그리워합니다. '개고생'이란 단어는 있어도 '고양이고생'이란 단어는 없다며 고양이를 한껏 치켜세웁니다. 이런 '구석'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의 구석찬가로 글을 가름합니다.
"구석이란 말보다 착한 단어도 드물다.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는 부유하는 먼지들이 피곤한 몸을 안착할 수 있는 곳, 심약한 자들의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 책의 갈피 속으로, 혹은 저의 내면으로 스며들 수 있는 곳이 구석이다. 구석은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추구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 159쪽
덧붙이는 글 | <황혼은 어디서 그렇게 아름다운 상처를 얻어 오는가> (김보일 글·그림 | 빨간소금 펴냄 | 2017. 10 | 311쪽 | 1만3000 원)
※뒤안길은 뒤쪽으로 나 있는 오롯한 오솔길입니다.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생각의 오솔길을 걷고 싶습니다. 함께 걸어 보지 않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