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입사 시험을 잘 볼 자신이 없다볼 일이 있어 은행에 들렀다.
"어, 여기 직장 다니세요?"담당 은행원이 내가 적어서 제출한 정보를 보다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묻는다.
"네... 저 거기 다녀요."
"저 여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그 분의 말에 의하면, 내가 다니는 직장의 신입사원이 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했지만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2014년 공채 면접이어서 내가 입사한 해와 같은 해였다. 물론 나는 계약직이라 공채 면접을 보지 않았고 당연히 면접 대기실에서 그 남자분과 한 공간에 있었던 적도 없다. 게다가 당시 계약 만료로 막 퇴사한 상태라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도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었으니까.
다니고 있다는 말 한 마디만 한 채, 입을 꾹 닫고 그 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떨어졌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어찌나 쓸쓸해 하던지 보는 내가 미안할 정도였다. 그 남자 은행원은 잠시 그때의 안타까움이 되살아났나 보다. 말 한 마디 없이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그렇게 대화가 뚝 끊겼고, 몇 분 후에 은행에서 나왔다.
'내가 다녔던 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었나?'좋은 직장을 인생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실제로 다니는 동안 나도 정규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월급도 월급이지만, 복지제도 중에서 사택제도가 그렇게 부러웠다. 게다가 고졸 정규직원이 사내 사택제도를 이용하면서 직장인 전형으로 서울에서 이름 있는 대학의 야간 학부에 입학한 걸 보았을 때, 나도 그 남자 은행원처럼 복잡 미묘한 심정이었다.
어린 나이에 정규직이고, 서울에서 집 걱정 안 하는 데다가, 야간 학부여도 어차피 탄탄한 직장이 있는 그 고졸 직원은 대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된다며 좋아했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덕분에 남들보다 인생을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손바닥 만한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내 일'을 하고 싶어 했던 나도 공채를 준비했다. 하지만 포기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입사 시험을 잘 볼 자신이 없었다. 평생 직장인으로 살 자신도 없었다.
사장과 직원, 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큰사진보기

|
| ▲ 사장은 바쁘게 일하면서도 어떻게 그 모든 상황을 아는 걸까? 직원은 왜 수동적으로 일하기만 하는 걸까? |
| ⓒ Pixabay |
관련사진보기 |
엄마와 함께 미용실에 간 적이 있다. 엄마가 염색을 하고 머리 드라이까지 끝난 후 혼자서 가운을 벗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장이 직원 분에게 한 마디 했다.
"가운 벗는 거 도와주세요!"그 말을 듣고서야 직원은 엄마가 가운 벗는 걸 도와드렸다. 결제를 하던 중에, 다른 손님이 미용실 안으로 들어왔다. 사장님이 그 손님을 향해 안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저번에 머리했던 건 마음에 드셨어요?"갑자기 궁금했다. 사장은 바쁘게 일하면서도 어떻게 그 모든 상황을 아는 걸까? 직원은 왜 수동적으로 일하기만 하는 걸까? 사장은 어떻게든 손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집중했다. 반대로 직원은 본인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할 뿐이었다.
사장은 몇 달 만에 방문한 손님도 단번에 알아봤다. 기억 속에 그 손님을 저장해두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직원은 알아보지 못했다.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이 아니므로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사장과 직원의 차이였다. 주인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이 미묘한 차이 하나로 사장이 되기도 하고, 사장에게 부림을 받는 직원이 되기도 한다. 내 삶의 반전을 찾던 중에 만난 모습이었다. 나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사장의 모습에 크게 감명 받았다.
그 순간 나는 성공의 비결을 발견했던 것 같다. 어느 곳에 속해 일하더라도 '내가 바로 사장'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일한다면, 직원 마인드를 갖고 일하는 사람들보다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게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을. 그 깨달음 이후로 더 이상 시험과 취업에 매달리지 않았다. 나에게 맞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다.
30대 신입사원보다는 30대 사장님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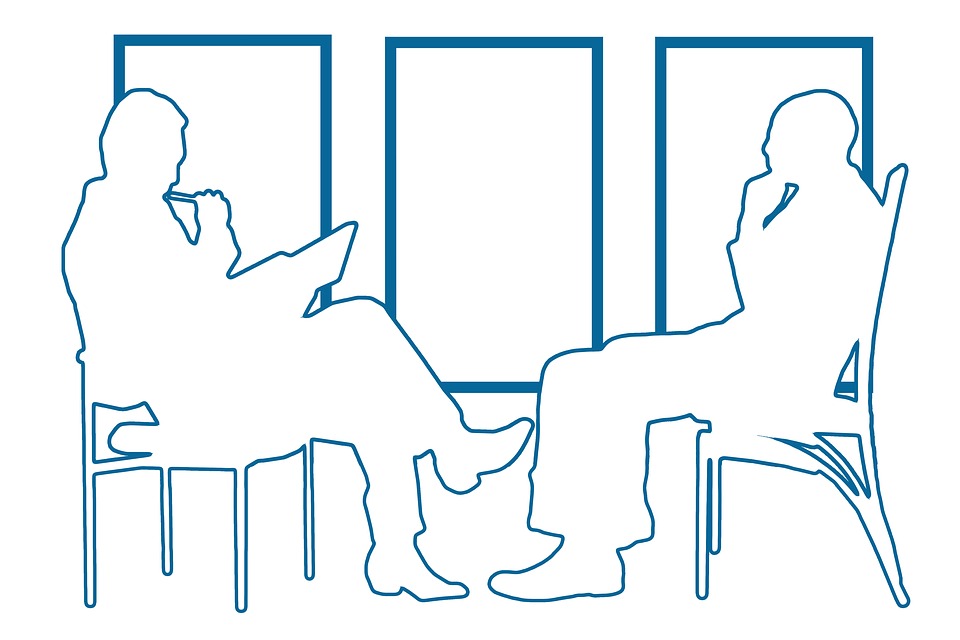
|
| ▲ 더 이상 시험과 취업에 매달리지 않았다. 나에게 맞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다. |
| ⓒ Pixabay |
관련사진보기 |
직장 면접을 보다 보면 단골로 나오는 질문이 있다.
"계약 끝난 후에는 뭐 할지 계획 있으세요?"계약직 면접이기에 나오는 질문이다. 애초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나는 너를 고용하고 싶은데, 네가 다른 계획이 있어서 중간에 그만둘까 봐 걱정돼. 너 다른 계획이 있니?'라는 의도를 품고 있다. 계약직이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다.
"아니요, 저는 이 기간 동안 직장에 충실할 계획입니다. 계약이 끝난 후에 뭘 할지는 추후에 그때 가서 생각해보려 합니다."철저하게 나를 숨긴다. 가끔 옆에 앉은 지원자가 본인이 면접보고 있는 회사 말고 다른 회사명을 친절하게 직접 언급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말할 때는 안타깝다. 회사는 다른 데에 마음 있는 지원자를 고용해서 월급을 줄 정도로 인정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를 숨기면서도 그런 나 자신에 회의감이 들었던 순간이다.
모든 사람이 공채를 준비한다. 그중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객관적으로 나는 공부를 잘 하지 못한다. 공채라는 시합에 나가지 않아도 내 결과를 알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 시합에 관심도 없는데 단순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이유로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거라면, 그 도전은 안 하는 게 낫다는 점이다.
그래서 미용실에서 멋진 사장님 마인드를 본 이후로 결심했다. 직장을 다니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알아봤던, 창업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32살 신입사원이 될 바에야 32살 사장이 되겠다. 많이 이룬 사람들조차도 인생의 여러 갈래 길 중에서 못 가본 길을 열망하지 않던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해서 실패하면 후회하지는 않을 테니 그걸로 된 거다. 누군가의 말처럼 내가 한 선택에 후회하지 말고 그 선택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면 될 일이다. 답은 나왔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 내가 한 선택이 정답이 되도록 만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