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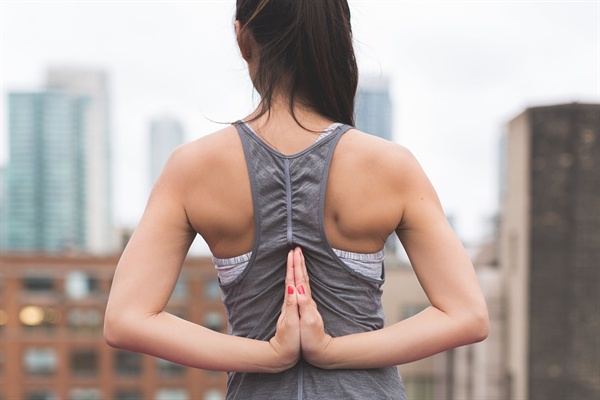
|
| ▲ 요가를 시작했다. 처음 간 수업에서 한 수강생은 10분마다 화장실을 갔다. |
| ⓒ pixabay |
관련사진보기 |
요가를 시작했다. 처음 간 수업에서 한 수강생은 10분마다 화장실을 갔다. 배탈이 났을 거라 짐작했는데 수업이 끝난 후에 강사가 조용히 말해줬다.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분이라 수업 중에 약간 산만할 수 있으니, 불편하다면 다른 시간으로 옮겨도 좋다"고.
많이 놀랐다. 호주 멜버른의 일상은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논리와 어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비로운 곳이었다. 장애 학생의 부모가 무릎 꿇고 하소연해야 살 수 있는 나라인 한국이라면 수업을 방해하는 당사자에게 나가라고 했을 거다. 갖다 붙일 논리도 뻔했다. '학원의 이미지'를 위해, 또는 '비싼 수강료를 내고 피해 보는 다수의 수강생을 위해' 나가라고 했을 터였다.
실제 비슷한 이유로 한국의 장애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분리됐다. 10여 년 넘게 근무했던 중·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라는 공간이 있었다. 장애 학생을 비장애인 학생과 함께 교육한다고 하여 붙인 '통합교육'이라는 이름은 말 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용어를 붙이기도 민망했다. 장애 학생들은 온종일 그들만의 공간인 특수학급에 머물다 한정된 과목에 한해서 가끔 비장애인과 같은 수업을 들었다. 한 공간 두 집 살림이었다.
담당 교사들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는 데다, 장애 학생들이 어쩌다 수업에 들어오기 때문에 낯설어했다. 당사자인 아이의 눈빛은 불안했고, 주변 아이들은 쳇바퀴 돌듯 지루하던 일상에 생기가 돌았다. 특수학급에서 온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심심찮게 놀리며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에서는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썼다. 장애 학생에게 도우미 학생을 붙여 놓고, 봉사점수도 주고 봉사상도 수여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매년 학기 초 많은 교사들이 기피하는 것 중 하나가 담임 배정을 받는 일이다. 그런데 임신과 출산, 이어지는 육아로 3년 만에 학교로 돌아갔더니 분위기가 확 바뀌어 있었다. 심지어 부장들이 통합학급(특수학급 학생의 적을 일반학급에 둔 경우)을 맡겠다는 일이 속출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알아보니, 통합학급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해 그 반의 담임을 맡으면 승진 가산 점수를 준다고 했다.
친구를 돕는 일이 점수로 환산되고, 특별한 요구(special needs, 호주에서 장애인을 일컫는 또다른 표현)를 가진 학생의 담임에게 승진 가산점이란 미끼를 던지고, 교사는 덥석 무는 반교육적인 행태는 천연덕스럽게 자행됐다. 한국이란 사회가 약자를 대하는 상상력은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춘 듯했다.
수많은 장애인들과의 만남, 멜버른의 너른 상상력
큰사진보기

|
| ▲ 수영장 가는 길 학생, 학부모 봉사자, 교사가 함께 수영장을 가고 있다 |
| ⓒ 이혜정 |
관련사진보기 |
아이가 다니는 멜버른의 공립초등학교에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온종일 한 교실에서 놀고, 먹고, 공부한다. '특수학급'이란 분리된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통합교육이 진행되는 환경이다.
이곳의 학교들은 통합학급 여부를 떠나, 일손이 필요할 때 수시로 학교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놀라운 건 학부모들이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닌 활동을 이끄는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아침마다 한 시간씩 교사와 분담해서 아이들의 읽기 정도를 확인해 주기, 체육시간에 맡은 그룹의 활동을 이끌기... 체육대회날에는 학부모들이 달리기 심판을 하고, 멀리뛰기 모래를 고르고, 공을 줍기도 한다. 동물원에 체험학습을 가면 학부모 봉사자들에게 4명 정도의 학생을 배정해 그룹별 탐색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때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학생들을 챙기며 전체 일정을 조율한다.
오늘도 아들이 속한 학년의 수영 수업에 일손을 보태고 왔다. 학교에서 수영장까지 도보로 15분 이동하는데, 채 30명이 안 되는 학생과 어른 8명이 함께 걸었다. 담임 교사 두 명,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도우미 교사 한 명, 나머지는 학부모 봉사자들이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참여하는 아빠들을 만나는 일도 흔하다.
봉사를 몇 번 하다 보면 옆 반 아이들의 이름과 특성까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결국에는 부모들도 통성명을 하게 된다. '내 아이'만 보이다가 '우리 아이들'이 눈 앞에 펼쳐지는 경험은 부모들에게도 소중하다. 한국에서 허상에 지나지 않던, 학생-교사-학부모의 강한 연대와 신뢰가 학교를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유다.
장애학생의 교육과 책임을 교사나 학교에 전적으로 떠넘기지 않으니 교사는 통합학급을 기피하지 않게 된다. 비장애 학생들은 장애 학생을 매일 만나서 생활하다 보니 '다름'에 친숙해진다. 학부모는 학교 활동에 자주 참여하다 보니 교사와 장애를 지닌 또래 아이의 처지를 이해하게 된다.
1년 동안 멜버른에 살면서 만난 장애인의 수가 한국에서 40여 년 동안 만난 장애인의 수보다 많았다. 일상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연스러운 스침이 일어나는 사회엔 편견이 설 자리가 없었다.
*다음 기사 : '장애인과 같은 반 싫다" 호주에선 안 통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블로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