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그리고 참여연대가 '나는 자영업자다' 공모를 띄웠습니다. 자영업자의 절절한 속사정,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오마이뉴스>에 보내주세요. [편집자말] |
자식 많던 시절에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다. 다 옛말이다. 요즘은 자식이 한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내리 사랑의 집중도가 높아졌다. 게다가 맞벌이라면 자식에게는 늘 모든 게 미안하다. 그러다 보면 어느 새 아이가 집안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감투'를 쓰고 호령한다. 우리 집이 그렇다. 내 평생 가장 많이 머리를 조아린 상대는 단연코 우리 아이다.
내가 배꼽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존재가 또 있다. 손님이다. 자식과 손님,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 생활을 쥐고 흔드는 존재. 그 둘에 관한 이야기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나만 그런가? 이따금 우리 아이에가 럭비공 같다. 시시각각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방긋방긋 웃다가도 뭔지 알 수 없는 이유로 토라진다. 그러다가 아이스크림 사다 물리면 금방 "아빠 사랑해" 하면서 하트를 날려준다. 그 말에 감격해서 방심하고 있으면 아이는 입을 앙당 물고 내 가슴팍이 샌드백인양 주먹을 날린다. 이런 갈팡질팡을 몇 번 반복하면 정말 돌아버린다.
이런 손님도 많다. 제 뜻대로 흥정이 되지 않는다고 웃통을 까고 배를 득득 긁으면서 조폭 흉내를 내지 않나, 왜 이렇게 먼 데서 장사를 하느냐고 화를 내질 않나(누가 오라고 했나…). 그중에서 압권은 스토커 손님이다. 전화로 상품 문의를 하면서 내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반말 찍찍'에 왕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에 그 번호를 차단해버렸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온다. 이상한 건 나에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다. 어이없게도 처음 전화 거는 사람인 척한다. 아닌 척해도 내가 그 목소리를 모를까. 열 번쯤 통화를 하고 수십 번 고민하다 번호까지 차단했다.
등골이 서늘했다. 번호를 바꾸는 걸 보면 내가 자신을 차단한 줄 아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지? 단순히 골탕을 먹이려는 건가, 작정하고 해코지를 하려는 전 단계인가? 세 번째 번호를 차단하고 나니 덜컥 겁이 났다. 혹시나 해서 SNS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던 아이 사진을 삭제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에 문의를 해 봤지만 이 정도로는 영업방해죄를 묻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행히 네 번째 스토킹은 없었다. 시간이 지나니 내가 먼저 술안주로 꺼내놓는 해프닝이 됐지만, 당시에는 착잡했다.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의 과녁이 돼 일방적으로 당할지도 몰라 억울했다.
매일 '존엄'을 만난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면서 내 도시락은 자주 까먹지만 우리 아이 어린이집 식판은 매일매일 뽀도독뽀도독 닦아 놓는다. 다음에 이사 가려는 이유는 아이가 이 집에서 기침을 자주 했기 때문이다. 난 화장실 변기 위에서도 나만의 시간을 누리기 어렵지만 아이는 전용 소파까지 있다. 외식 메뉴? 물어서 뭐할까. 우리 집에서 가장 미천한 계급은? 엄마 그 다음에 아빠다.
그리고 우리 가게의 '존엄'은 손님이다. 손님이 오시겠다고 하면 기다려야 한다. 얼마짜리 물건을 살 거냐, 정말 사기는 할 거냐 확답하라고 묻는 건 가당치 않은 일이다. 왕은 아니더라도 상전은 분명한 존엄이다. 그러니 약속 시각에 맞추기 위해 (이게 뭔 짓인가 싶지만) 아이를 다그쳐서라도 어린이집에 맡기고 급하게 차를 몰아야 한다. 설사 '노쇼(no show)'가 된다한들 손님에게 싫은 내색을 비춰서는 안 된다. 혹시 다음에라도 올 길을 터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뭐,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나도 성수기에는 손님한테 딱딱거리기도 한다. 특히 앞뒤 자르고 이거 얼마까지 깎아줄 거냐고 흥정부터 하는 손님에게는 말이다. 그 외에는 앉으나 서나 손님 생각이다. 어서 뵙기를 소원한다. 손님 앞에서는 있는 지식 없는 경험 다 쥐어짜서 손님을 분석한다.
지갑이 얇은 손님에게 고가의 제품만 소개해봐야 허탕이니 지갑 두께도 가늠해 본다. 문제는 대부분의 손님이 제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다. 이제 다 됐어. 결제만 하면 돼. 그런데 손님은 지갑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자꾸 먼 산만 쳐다본다. 카드를 받으려고 내민 내 손이 오그라들면서 얼굴이 화끈거린다. 차라리 눈을 감고 싶다.
늘 궁금하다. 언제, 어떻게 손님의 지갑이 열리는지. 그러나 늘 안개 속이다. 손님을 중심에 세우면 뭐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데. 오죽했으면 관상을 다 공부했을까. 자영업자들이 점괘를 본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그 속 터지는 마음 백 번 공감한다.
그래도 원칙을 세워야 살아 간다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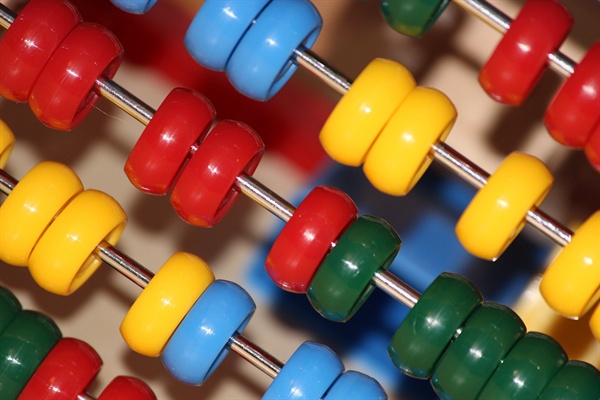
|
| ▲ "업자"라는 말에 화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원칙을 갖고 손님을 맞는다. 냉탕과 열탕을 오가게 하는 존재, 바로 손님이다. |
| ⓒ pixabay |
관련사진보기 |
나는 아이에게 휘둘리는 아빠다. 감정과 시간, 돈, 세계관, 습관까지. 내 가진 모든 것을 녀석에게 맞춘다. 내리 사랑이기에 가능한 일이겠으나 내리 사랑이기게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줄도 안다.
손님을 대하는 자영업자의 자세에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사실 자존심, 가치관, 사생활 등등 가진 거 다 퍼주고서라도 손님의 지갑을 열고는 싶다. 그게 가능하면 한다. 하지만 불가능하다. 그러다가 내가 먼저 망가진다.
자영업자, 특히 1인 사업자의 가장 큰 자산은 몸뚱이다. 내가 아프면 모든 게 멈춘다. 누구도 나를 대신 해주지 않는다. 아파도 쉬지 못한다. 그나마 발이라도 부러진다면 다행이다. 깁스를 하고 절뚝거리면서 동정심을 유발해서라도 하루벌이를 할 수 있다. 반면 마음을 다치면 생활을 꾸려갈 의지가 발가락 끝까지 쑥 빠져 나간다. 돈이 내 눈 앞에서 뚝뚝 떨어진다 해도 멍청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은 홧술을 먹었을 때는 "나는 업자가 아닙니다"라고 나 자신을 부정한 날이었다. 일의 성격상 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중고 상품을 매입한다. 개인 대 개인 거래도 활발하다. 조건이 좋으면 나 말고도 만인이 그 물건을 노린다. 그날 거래하기로 한 사람이 대뜸 이렇게 말했다.
"업자는 아니시죠? 전 업자랑은 거래하기 싫어서요."업자. 사업자나 자영업자를 깔보는 저 표현이 내 귀에 꽂힐 때면 나는 본분을 잃고 화를 낸다. 상대는 감정 없이 말했더라도 내 자격지심에 속이 끓는다. 다행히 그 날은 잘 참았다. 그리고 업자가 아니니 나한테 팔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냈다. 어찌나 한심하던지 그날 저녁 원 없이 소주를 마셨다. 나 뭐하는 거냐 지금. 누가 따뜻한 손으로 등이라도 쓸어주었으면 속절없이 울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자식과 손님. 내 의지대로 몰아가고 싶지만 결코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미꾸라지 같은 고약한 상대. 나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데 대거리 한 번 제대로 못해 보는 '넘사벽'. 많으면 귀찮지만 없이는 못 살겠는 애증의 존재.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냉탕과 열탕을 오가게 만드는 위대한 마법사. 그리고 내 생활의 활력소.
"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나는 자영업자'다 응모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