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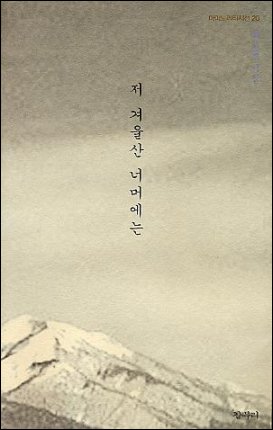 | | | ▲ 시인 표성배 <저 겨울산 너머에는> | | | ⓒ 갈무리 | 우린 이름이 다릅니다
우린 작업복이 다릅니다
우린 월급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린 한 공장에 다닙니다
우린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우린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그러나
우린 자부심이 없습니다
우린 노조가입도 못합니다
우린 파업도 못합니다
우린 그들과 똑 같지만
똑 같지 않습니다
똑 같지 않지만
똑 같습니다
-61쪽, '우린 똑 같지만' 모두
지금, 창원공단 <두산기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시인 표성배는 "공장과 함께 키가 자랐고 / 공장과 함께 사랑도 익었다" 며 "남 모르는 그리움에 / 가슴 태울 때는 / 공장이 나를 위로해 주었고 / 밤새도록 벌건 눈으로 서 있는 / 가로등의 마음도 / 공장에서 엿볼 수 있었다"(공장)고 말한다.
이어 "공장을 / 더욱 잊을 수 없는 까닭은 / 겉옷처럼 걸친 / 공장의 긴 그림자를 / 내가 밟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그래서였을까. 시인은 창원공단과 창원시를 가로지르는 "창원대로를 달리다 보면 / 쌩쌩 스쳐가는 차소리 대신 / 쿵쿵거리는 / 기계소리"(창원대로를 달리다 보면)가 들린다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처럼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창원대로에서는 "평생 막일에 / 굽은 등이 안쓰러운 / 아버지가 보이고 // 마산수출지역 / 고무신 공장에서 / 어느 날, /고무신처럼 천대받아 쫓겨난 / 누이"(창원대로를 달리다 보면)의 얼굴도 떠오른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짐작도 못했다. / 부족한 것이 노력만이 아니라는 것을. 길을 나서서는 지는 해만 걱정했지 정작, 밤 내내 견뎌야 하는 외로움 같은 것은 생각도 못했다. / 늦었지만 꼭,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내 몸 구석구석 박혀 툭툭 불거지는 투박한 목소리부터 낮추어야겠다." -'시인의 말' 몇 토막
지난 2001년 첫 시집 <아침 햇살이 그립다>를 펴낸 노동자 시인 표성배(38)가 현장 노동자들의 불안한 현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두운 미래를 낱낱히 드러낸 두 번째 시집 <저 겨울산 너머에는>(갈무리)을 펴냈다.
이번 시집은 '복사꽃이 피었다', '공장', '창원대로를 달리다 보면', '깃발', '첫 출근', '겨울 공단', '공장이 낯설다', '볼트와 너트', '우리에겐 바다가 없다', '저 새벽별 뚝뚝 떼어', '어질어질하다', '적금', '호루라기'를 포함, 모두 4부에 62편의 시가 현장 노동자들의 고된 나날처럼 흐느적거리고 있다.
하지만 시인은 그동안 걸어온 노동자의 길에 대해 "뭐 크게 이룬 것이야 있나 / 떵떵거리며 사는 재주도 없으니 / 몸뚱이 굴려 배 채우고 / 가슴 맞대어 술잔 나눌 동지가 있고 / 아이들 가방"(잘 왔다 싶다)이라도 들게 했으니, 노동자의 길을 잘 걸어왔다고 여긴다. 그동안, 아니 지금도 그 길은 살얼음판처럼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주민등록증만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언젠가부터
공장은
내 얼굴이 되어
나를 대신하고 있었다
입혀주는 옷에 따라
누구는 정규직으로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계급의 선을 명확히 그어주는
공장은
아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아이들 얼굴에
그늘을 지게 할 수도 있다
공장이라는 상표는
판사보다 더 명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준다
-42쪽, '상표' 모두
시인에게 있어서 공장은 주민등록증보다 더 자신의 신분을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일종의 상표다. 공장에서 붙혀주는 그 상표는 사람에 따라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이라는 등급까지도 정확하게 매겨진다. 또한 그 등급에 따라 하루아침에 멀쩡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다.
그런 까닭에 비정규직이란 상표가 붙은 노동자들은 공장 담벼락 아래 "말라비틀어진 국화잎"처럼 늘 움츠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같은 공장에서 / 같은 일을 하지만 / 정규직 노동자가 부러운 우리는 / 늘 주눅"이 든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의 / 무거운 시간 앞에 떨고 지내다"(겨울 공단) 순식간에 공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 | 시인 표성배는 누구인가? | | | 창원공단 <두산기계> 현장노동자 | | | |
 | | | ▲ 시인 표성배 | | ⓒ갈무리 |  | "그의 시집 <저 겨울산 너머에는> 복사꽃을 시작으로 민들레, 토끼풀꽃이 피어나 있다. 또한 그 봄은 바라봄도 마주봄도 아니면서 바람도 일을 하고 꽃과 사람도 일을 한다. 들꽃들이 피어나는 접점에 노동이 공존하고 있어 그것이 시로 담긴 탓이리라." -박영희(시인)
노동자 시인 표성배는 1966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나 1995년 제6회 <마창노련문학상>을 받으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아침 햇살이 그립다>(도서출판 갈무리)가 있으며, 노동자 시인 모임인 <객토>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 창원공단 <두산기계>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 이종찬 기자 | | | | |
그런 어느날, 시인은 "허물어진 공장 축대 아래 / 웅크리고 있는 / 선인장 한 포기를 바라본다. 그 선인장은 "무성하게 돋아나는 / 쇠뜨기들 속에서 / 단단히 / 뿌리 내리지 못한 채 / 하루하루"(선인장)를 힘겹게 견뎌내고 있다. 마치 금세 구조조정으로 식의주의 뿌리가 깡그리 뽑혀버릴 것만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정신없이 일하다가도
퍼뜩 정신이 들 때가 있다
이럴 땐 꼭,
씨발
해 놓고 본다
나도 모르게 버릇이 되었다
창문 너머 달이 떠도
바람이 다정하게
어깨를 쓰다듬으며 지나도
공장 화단에 감꽃이 만발해도
씨발
한다
-54쪽, '이곳에선' 몇 토막
늘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씨발'이란 말은 "빨리빨리 뒤에 / 접미사처럼 따라 붙는 욕" 그 욕은 "이제, / 다정하게 들릴 정도다".(이곳에선)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씨발', 궂은 일이 생겨도 '씨발'이란 말부터 우선 내뱉고 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씨발'하면서 몸부림을 쳐 보아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은 갈수록 구겨져 / 딱딱한 벽"(벽)이 되어가기 시작한다. "몇 번 잠그고 풀고 하는 사이, 머리가 뭉개지고 나사산이 망가진 볼트와 너트"처럼.
어쩌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 볼트와 너트 같은 존재인지도 모른다. 적당히 머리가 뭉개지고 나사산이 망가지면 이내 새 것으로 바꾸어야만 하는. 그래서 시인은 그 망가진 볼트와 너트를 "새 것으로 바꾸다 허리 다쳐 병원에 누워 아이들 걱정하며 허탈해하던," 그 덕수 형을 떠올리며, "함부로 버리지 못한다".(볼트와 너트)
바다를 향해 흐르고 싶은 것이
어찌 강물뿐이랴
하얀 햇살 받아
꽃봉오리 터뜨리고 싶은 것이
어찌 장미뿐이랴
한 점 빛 새벽별 뚝뚝 떼어 짓밟고
저 겨울 산을 넘고 싶다
-87쪽, '저 새벽별 뚝뚝 떼어' 모두
누군들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꼬리표가 붙었다고 해서 늘 노예처럼 억눌리고 짓밟히며 살아갈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한 점 빛 새벽별 뚝뚝 떼어 짓밟고"서라도 비정규직이란 서럽디 서러운 이 겨울산을 기어코 넘어서야만 되지 않겠는가.
시인 표성배의 두 번째 시집 <저 겨울산 너머에는>은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현장노동자들의 처절한 몸부림과 노동의 봄을 기다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희망으로 가득하다. "무엇이든 / 들고 / 내리고 / 옮기는 / 지칠 줄 모르는 / 저 크레인"에 "내, 무거운 하루를 / 매달고 싶다"(하루)고 할 정도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