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사우스 다코다주는 인디언 부족 중 하나인 ‘수’족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영화 <늑대와 춤을>이 이곳에서 촬영되었고, 아메리카 인디언의 멸망사를 생생하게 기록한 책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오’의 고장이기도 하다. 이 영화나 책에 등장하는 인디언 종족이 바로 ‘수’(Sioux)족이다.
사우스 다코다의 끝없이 막막한 프레리 대초원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세인트 프란시스(St. Francis)라는 작은 인디언 마을이었다. 인디언보호구역은 겉으로 봐서는 인디언들이 사는지, 미국인들이 사는지 남미사람이 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다만 건물들이 많이 낡았고, 마을의 분위기가 좀 을씨년스러운 것을 제외하면 적어도 겉모습은 똑같다. 역으로 얘기하면 인디언들의 전통문화는 그 동안 그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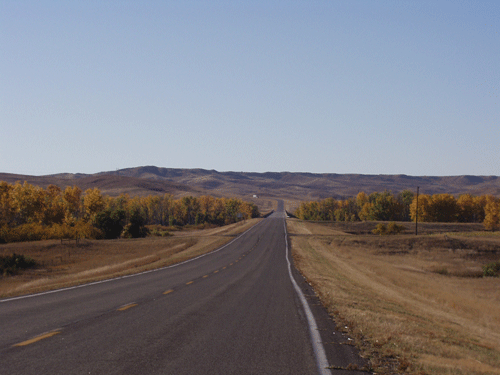 | | | ▲ 세인트 프랜시스로 가는 길, 미국, 사우스 다코다 | | | ⓒ 하정필 | | 이런 인디언 보호구역의 마을들은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끝없는 모래가 펼쳐진 거대한 사막의 군데 군데 존재하는 오아시스처럼, 이곳의 인디언 마을들은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끝없는 초원과 들판 또는 사막(아리조나주의 경우)안에 군데군데 놓여져 있다.
이곳에서는 마을에서 좀 떨어져 사람들의 인적이 없는 곳에서 간혹 인디언들을 만나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쉬운 여정이 아니며 설사 그런 곳을 찾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인디언들의 전통적인 모습은 아니다.
그들 문화의 스러져가는 흔적은 얼핏 볼 수 있지만, 이곳에서 자연을 경배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디언들이 전통적 가치나, 그들의 세계관, 인생관이 내재된 그들의 주거지, 의복, 장신구 등을 보며, 그들의 생활방식을 통한 인상적인 메시지 등은 섣불리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인트 프란시스에 간 이유는 그곳에 있는 작은 인디언박물관을 보기 위해서였다. 이곳의 인디언 박물관은 내가 가 본 박물관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에게해의 크레타에 있는 니코스 카잔차키스 박물관과 매우 닮아 있었다.
작고 소담했으며, 사람들이 사는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멈춘듯한 분위기, 모두들 낮잠이라도 자는 시간에 그곳을 방문한 듯 나 스스로가 영원히 정지된 시간속을 유유자적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크레타의 그 박물관도 그런 느낌이었다. 무엇보다 이들의 절대적인 공통점은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은 나 혼자, 안내하는 사람도 혼자라는 것이었다.
모두들 박제가 되어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인디언들의 흔적들이었지만, 안내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대상물들은 하나 둘씩 살아 숨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의 설명이 유창해서도 아니고, 박물관에 보관된 물품들이 대단해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물관이라는 작은 공간에 보관된 인디언 문화의 흔적들을 매개로 하여 그와 내가 만나서 인디언들의 역사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며 교감을 했기 때문이리라. 이것은 이렇게 한적한 박물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혜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곳의 많지 않은 인디언들의 유물들 중에 기억에 나는 것은 버팔로를 이용한 생활용품, 장식품 같은 것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뼈와 털을 이용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인류의 어느 문화든 산업화가 진행되기 전에는 다들 이와 같이 짐승들의 부산물을 이용해 이렇게 일상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문득, 이들을 보며 한가지 의문이 생겼다.
인디언들은 짐승을 직접 사냥하고, 죽이고, 해체하고, 먹고, 남은 부산물들을 직접 가공하고, 또 그렇게 가공하거나 남은 짐승의 흔적과 같이 살았다. 허면 현대인들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소 엉뚱한 상상이다.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 그곳이 자연의 들판이든, 공장식 축사든, 그곳에 가서 소 한 마리를 정하고, 직접 죽이고 피를 빼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들어내고 고기와 뼈를 해체할 수 있을까?
그러다 허기가 지면 일부는 먹고, 나머지는 저장을 하고, 대퇴부 뼈는 잘 닦아서 망치나, 절구와 같은 연장으로 이용하고, 잔뼈는 가늘게 가공을 하여 바늘로, 어떤 부위는 젓가락으로 머리뼈는 뒤집어서 작은 물건을 보관하고, 힘줄은 끈으로, 눈알은 장신품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말이다.
과연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현대인들 중에 몇 명이나 될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잘 나타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 대부분은 힘들고 무섭고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들은 지저귀는 새들은 좋아하지만, 길을 가다가 자신의 발 밑에서 죽은 참새라도 발견하게 되면 놀라서 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대량도살한 재료를 가공한 KFC의 핫윙, 맥도날드의 소고기 버거는 맛있게 잘 먹는다. 현대인들의 태도가 진지하거나 일관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아가 더욱 궁금한 것은 인디언들이나 예전의 사람들은 사냥을 하고, 그 육체를 해체하고 먹고, 부산물들을 사용할 때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대했는지 알고 싶다.
인디언들에 대해서는 조금 알 것도 같다. 인디언들은 자연의 모든 존재를 그들과 동일시 했다고 들었다. 사냥을 할 때도 사냥의 대상물에게 그들을 잡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시체도 함부로 다루지 않았단다. 또 그들의 영혼을 달래는 의식을 갖기도 했다. 인디언들은 그들을 한 핏줄을 가진 형제와 같이 여기고 충만한 사랑과 존경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어떤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길러지고 가공되는 과정이 철저히 우리의 일상과 유리된 결과, 우리가 먹고,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전에 생명을 가진 어떤 존재였는지조차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작은 박물관을 빠져 나와 이글버튼이라는 인디언마을로 가는 중에 작은 호수를 지나쳤다. 그런데 왠지 끌리는 느낌이 있어 차를 다시 호수로 돌렸다. 호수의 이름은 '이글고스트 레이크'(Eagle Ghost Lake)였다. 물론 인디언들이 명명한 이름을 영문 표기한 것이다.
호수는 국도변에 위치했는데 역시 아무런 인적도 주위에 사람이 산 흔적도 볼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지판에는 호수의 이름이 또렷이 기록되어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예전에 독수리는 비교적 흔한 존재였다는 생각이 들면서 호수의 이름을 ‘독수리 정령’이라고 붙인 것이 퍽 인상적이었다.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물론 주위에 알만한 사람들은 없으니 물어볼 사람도 없다.
 | | | ▲ Eagle Ghost Lake, 미국, 사우스다코다 | | | ⓒ 하정필 | | 이 호수의 사연을 아는 사람은 이미 학살되었거나, 보호구역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수의 이름은 아직까지도 남아있었다. 그리고 고맙게도 호수는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독수리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믿으며, 그 영혼을 기리기 위해 호수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던 인디언들의 문화가 조류독감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만 마리의 오리와 닭들을 생매장하는 현대 문명 앞에서 새삼 다시 보인다.
|
|